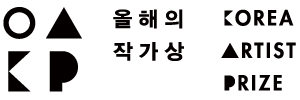#12 아트게임
현대미술 작품을 볼 때면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아름답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작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기성 제품을 그대로 활용하는 등 우리가 보통 미술작품을 감상할 때 기대하는 것들이 현대미술엔 없다. 그래서인지 관객과 현대미술의 거리두기는 끝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올해의 작가상’은 대중과 현대미술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매해 열려왔다. 하지만 이 작품들도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방정아 작가의 전시실에는 9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그림, 그리고 작품인지 관객의 편의를 위해 준비된 것인지 헷갈리는 의자들이 놓여있다. 30분이 넘는 최찬숙 작가의 영상작품에는 칠레 광산에서 발굴된 미라와 다양한 형태, 여러 지역의 땅 이야기가 나온다. 김상진 작가는 비어있는 교실 풍경 주변으로 서로를 마주보는 네 개의 스마트 워치 등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을 설치해 두었다. 오민 작가는 커다란 다섯 개의 화면에 영상을 틀어 두고 헤테로포니란 음악용어를 붙여 전시 중이다. 같은 순간을 다른 앵글로 찍은 화면들, 그리고 숫자만 깜박이는 까만 화면까지 이게 제목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이해하기란 어렵다. 그런데, 작가들은 현대미술이 재미없고 어려운 이유가 게임의 룰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예술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알고 나면 오히려 재미있을 수 있는 게임이라는 것이다.
사진의 발명 이후 대상을 재현하는 것에 치중하던 예술가들에게 위기가 닥친다. 아름다움으로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 상상력을 동원해 이제까지 없던 창조적인 세상을 선보이는 게 중요해진 것이다. 그렇게 탄생하고 발전해온 현대미술에는 당연히 전통적인 미술작품을 볼 때와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해졌다.
현대미술을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작가와 관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리그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SBS 아트멘터리 ‘아트게임’은 난해하지만 알고나면 재미있는 현대미술의 접근법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