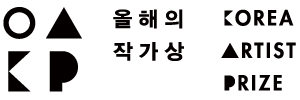제인 진 카이젠

제인 진 카이젠은 강렬한 시각성을 동반하는 시적이고 수행적이며 다성적인 영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작업은 살아 있는 경험과 정치적 역사의 교차점에서 기억, 이주, 국경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그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주제는 자연과 섬, 우주론,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된 신화, 제의적이고 영적인 실천에 대한 참여다.
Interview
CV
코펜하겐에서 거주하고 활동
janejinkaisen.com
학력
2021
코펜하겐대학교 문화예술학 박사, 코펜하겐, 덴마크
2010
덴마크 왕립 미술 아카데미 미술이론 및 커뮤니케이션/미디어아트학 석사, 코펜하겐, 덴마크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학제간 스튜디오 아트 석사, 로스앤젤레스, 미국
2008
휘트니 미술관 독립 연구 프로그램 이수, 뉴욕, 미국
주요 개인전
2024
《Burial of This Order》, TPW 갤러리, 토론토, 캐나다
《Halmang》, 이씨 컨템포러리, 맨체스터, 영국
《Halmang》, 마틴 아스베크 갤러리, 코펜하겐, 덴마크
2023
《거듭되는 항거》, 제주 4·3평화기념관, 제주
《Braiding and Mending》, 이미지 센터, 토론토, 캐나다
《Of Specters or Returns》, 덴마크문화원 르 비콜로르, 파리, 프랑스
《Currents》, 포토그라피스크 센터, 코펜하겐, 덴마크
2021
《Parallax Conjunctures》, 디트로이트 현대미술관, 디트로이트, 미국
《이별의 공동체》, 아트선재센터, 서울
2020
《Community of Parting》, 쿤스트할샤를로텐부르크, 코펜하겐, 덴마크
2015
《Of Specters – or Returns》, 인터아트센터, 말뫼, 스웨덴
《Loving Belinda》, 갤러리 이미지, 오르후스, 덴마크
2013
《제인 진 카이젠》, 아트스페이스⋅C, 제주
2011
《Dissident Translations》, 쿤스트할오르후스, 오르후스, 덴마크
주요 단체전 및 스크리닝
2024
《올해의 작가상 2024》,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Forms of the Shadow》, 제체시온, 비엔나, 오스트리아
《모든 섬은 산이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특별전시, 몰타기사단 수도원, 베니스, 이탈리아
《After the Sun / Forecasts from the North》, 버팔로 AKG 미술관, 버팔로, 미국
《A Moment in Extended Crisis》, UTS 갤러리, 시드니, 호주
2023
《Living Togetherness – 2023 Taiwan International Video Art Exhibition》, 홍가 미술관, 타이베이, 대만
《Language beyond Language. Language inspite of language》, 비디오날레.스코프, 투리스타라마, 쾰른, 독일
《Rencontres Internationales》, 유럽사진미술관, 파리, 프랑스
《Between Waves》, 브루클린 레일, 뉴욕, 미국
《경계 협상》, SAW, 오타와, 캐나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고양
《Forest of Being Time》, 타이베이시립미술관, 타이베이, 대만
《디스로케이션 블루스: 제인 진 카이젠》, 테이트 모던, 런던, 영국
《A Place of Memory: Contexts of Existence》, 졸리에트미술관, 졸리에트, 캐나다
코펜하겐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코펜하겐, 덴마크
2022
《Ceremony(Burial of an Undead World)》, 세계문화의 집, 베를린, 독일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 제주비엔날레, 제주
2021
《Pan-Austro-Nesian》, 가오슝 시립미술관, 가오슝, 대만
《After Hope: Videos of Resistance》, 아시아 아트 뮤지엄, 샌프란시스코, 미국
2020
《송출된 과거, 유산된 극장》, 광동 타임즈 뮤지엄, 광저우, 중국
《Our World is Burning》, 팔레 드 도쿄, 파리, 프랑스
《역사가 우리를 망쳐 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아르코미술관, 서울
《경계 협상》, 피민코재단, 호망빌르, 프랑스
2019
《한국관: 역사가 우리를 망쳐 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제58회 베니스비엔날레, 베니스, 이탈리아
《Neither Black/Red/Yellow Nor Woman》, 타임즈 아트 센터, 베를린, 독일
《모두를 위한 세계》, 남서울미술관, 서울
2018
《Voices of Dispersion》, 루드비히 미술관, 쾰른, 독일
《Decolonizing Appearance》, CAMP, 코펜하겐, 덴마크
《개성공단》, 문화역서울284, 서울
《4·3 70주년 특별전: 포스트 트라우마》,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17
《경계 155》,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아시아 디바: 진심을 그대에게》,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 or 3 Tigers》, 세계문화의 집, 베를린, 독일
《Soil and Stones, Souls and Songs》, 파라사이트, 홍콩 / 짐 톰슨 하우스 뮤지엄, 방콕, 태국
《Nordic Delights》, 포토그라피스크 센터, 코펜하겐, 덴마크
2016
《아트스펙트럼 2016》,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2016-17
《Soil and Stones, Souls and Songs》, 현대미술디자인미술관, 마닐라, 필리핀 / 파라사이트, 홍콩 / 짐 톰슨 하우스 뮤지엄, 방콕, 태국
2015
《신화와 근대, 비껴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4
《Víctimas y Olvido》, 네오무데하르 미술관, 마드리드, 스페인
《Camellia Has Fallen》, 소노마카운티뮤지엄, 산타 로사, 미국
2013
《War Baby/Love Child》, 윙 루크 박물관, 시애틀 / 드폴대학교 미술관, 시카고, 미국
《텔 미 허 스토리》, 코리아나미술관, 서울
2012
《City States》, 7회 리버풀비엔날레, 리버풀, 영국
《Liminal State》, 타운하우스 갤러리, 카이로, 이집트
《Women In-Between: Asian Women Artists 1984-2012》, 오키나와 현립 미술관 / 도치기 현립미술관 / 미에 현립 미술관 /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일본
2011
《ENTER II》, 브란트미술관, 오덴세, 덴마크
비디오날레13, 본 현대미술관, 본, 독일
《FOKUS 비디오아트페스티벌》, 니콜라이 미술관, 코펜하겐, 덴마크
《IN THE ACT》, 말뫼 콘스트할, 말뫼, 스웨덴
제12회 제주여성영화제, 제주
2010
《바다를 건너서》, 국립제주박물관, 제주
야마가타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야마가타, 일본
2008
《Breaking Out》, 가나아트갤러리, 뉴욕, 미국
2007
《Traces in Photography》, 국립사진박물관, 코펜하겐, 덴마크
2006
《열풍변주곡》, 6회 광주비엔날레, 광주
2005
《Accent》, 로스킬데 현대미술관, 덴마크
2004
《한국인 해외 입양 50주년: 입양인, 이방인》, 금산갤러리 & 동산방화랑, 서울
주요 수상 및 기금
2023
베케트상, 덴마크
뉴 칼스버그 재단상, 덴마크
2022
덴마크 예술재단 3년 보조금, 덴마크
2020
덴마크 예술비평가협회 올해의 전시상, 덴마크
2011
몬타나 엔터프라이즈, 덴마크
주요 레지던시 및 파견 연구
2022
덴마크 아트워크숍 SVFK, 코펜하겐, 덴마크
존스홉킨스대학교 미디어스터디센터, 볼티모어, 미국
2011
타운하우스 갤러리, 카이로, 이집트
주요 소장처
아트선재센터, 한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미술관,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미국
제주도립미술관, 한국
덴마크국립미술관, 덴마크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Critic 1
이어도에 홀리다: 들썩임의 에코그래피1
김소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교수, 영화감독)
1. 의례적 경험의 ”들썩임(effervescence)“과 사진(絲診)
살아 움직인다. 춤추듯 한다.
너울거리는 흰옷, 검은 머리
자맥질하듯, 헤엄치듯
소용돌이, 물속이다.
매듭을 푸는 듯, 매는 듯
속박인 듯, 풀림인 듯
매듭의 춤. 매듭이 타래인 듯 해초를 감아들고
아직 알 수 없는 인간의 의지, 향방, 동작. 움직임이 위태롭다.
여기에 오기까지
소창 매듭2은 풀어진 명실(장수를 기원하는 무명실)처럼, 춤사위처럼 움직였다.
들썩임(effervescence)“3이라는 의례적 경험
기포를 만들고
해초를 흔든다.
생기의 환호
포말, 물방울, 부유물
들숨과 날숨,
물속에서 오래 숨을 견딜 수 있는 여자들
그러나 한 여자의 절규가 있다.
흰옷을 입은 다른 여자들의 애탄이 이어진다. 잠재된 무의식의 문(the subliminal door)4이 열리고, “지표로서의 신들림. 신령의 현전을 드러내는 목소리와 몸짓의 변화, 피땀 흘리기, 황홀경, 마비 또는 신병 등과 같은 신들림 현상에 수반되는 극적 표정”5이 나타난다. 급진적 경험과 몰입 체험의 경계. 회심(回心), 마음이 돌아선다.
’12분의 시간 동안 매듭은 맺히고 꼬이고 풀어지며, 인간과 해초가, 물과 매듭이 정동의 줄다리기를 한다. 매듭과 타래들이 붉은색의 해초군과 엮일 때, 붉은 피색의 해초 적색이 흰색 소창에 배어난다. 이렇게 매듭이 해초에 가닿을 때, 사진(絲診),6 실의 진맥이 이루어진다. 제주의 역사가 〈이어도(바다 너머 섬)〉(2022–2024) 연작을 통해 펼쳐지고 있다. 〈잔해〉(2024)에서 보이는 바다에 매장되던 무기들.
‘
문화 인류학자 김성례는 제주도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한다. “제주도는 통곡의 섬, 일만 팔천 신전의 섬, 또는 영웅 전설의 섬이라 일컬어지는데, 한마디로 애수와 비극의 분위기로 표현된다. 그리고 심방이라 불리는 제주 샤먼의 영험은 이런 분위기를 얼마나 잘 연출하느냐에 달려 있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는 역사적 실재로 존재한다. 과거 제주도는 군사적으로 일본과 중국을 먼 바다 위에서 접하고 있는 최남단 변방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정객의 망명지거나 모반자의 유배지였다. 근세에는 200년 동안 출륙 금지라는 정치적, 문화적 억압을 감내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조선조 말기에는 잦은 민란으로 관민의 대결이 극심했다. 가깝게는 1948년 4월 3일에 발단하여 6.25 사변 이후까지 계속되면서 섬 전체를 초토화하고 큰 인명 손실을 가져왔던 4.3의 음영이 아직도 걷히고 있지 않다. 삼백여 마을 당신과 집안 조상신의 본풀이와 비판조의 제주 무가는 바로 이러한 역사의 폭력을 또는 폭력을 기억하는 신화 텍스트 (…)”7
4.3 사건 이후 아들의 시신을 찾지 못해,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심방의 구슬픈 무가 속에서 〈잔해〉 속 예의 사진(絲診)이 수행된다, 실 진맥, 매듭이 너울거리며 드러내는 제주의 국가 폭력, 상흔의 매듭들, 그 매듭을 만드는 〈할망〉(2023), 〈잔해〉의 아카이브 영상에서 보이던 전쟁 무기, 그 무기를 매듭으로 감싸 바다 속으로 떨구는 제의의 의미를 위 설명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바다가 검은 역사가 된 곳에 바다와 동체인 해녀들의 움직임, 동작, 물에 휘날리는, 휘갈기는 머리카락과 매듭들.
물속 부유물들
기포 속 정념의 표현
열락, 신명, 신들림,
무엇을 드리는 것인가?
제주 바다가 제물로 응당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의에서 하강은 때로 고난, 몰락, 죽음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늘과 땅 사이의 일이 아니고
바닷속, 수중에서라면 다른 의미 영역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제인 진 카이젠의 작업은 그 무대를 바닷속으로 옮긴다. 카메라 장치가 동반된다. 수중 촬영을 위한 장비들. 플라톤의 동굴에서 시작된 영화 이론은 물속을 알지 못한다. 바다 밑 수중 세계에서 일어나는 무빙 이미지(moving image)에 관한 개념이 많지 않다. 그렇다면 이런 실행, 수행을 ‘에코그래피(Eco/Echo-graphy)’8로 명명해 보기로 한다. 에코그래피는 생태를 담는 무빙 이미지, 사진(絲診)과 같은 생태계(ecology)의 진단, 이 작업이 일으킬 공명(echo) 등을 함의한다. 이 에코그래피에서 카메라, 조명기, 수중 장비 등이 동원된 테크노스피어(technosphere)가 바다 안에 일시에 만들어진다. 제의의 상징들이 배치된다. 바다의 생명들이 활개를 친다. 해녀들의 수행은 때때로 다이버들이 겪는 황홀경과 다른 상태, 애도를 보여 주는 것 같다. 이 에코그래피 속에서 자연광과 인공광이 서로를 간섭한다, 빛의 간섭, 회절 속에서 수중 장면들의 미장센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일어나는 공명이 ‘에코그래피’다.
다시 〈제물〉(2023)
여자, 해초에 감긴 매듭들로 헤엄쳐 간다.
소창 매듭과 해초, 기포, 물질들이 마치 무당의 춤사위 같다.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물질들이 비물질적 영적 기운과 중첩되는 듯한 감각의 바다. 바다의 감각.
“처음 고비에서의 몸놀림은 대체로 직선을 긋는다. 앞뒤로 또는 좌우로 몸을 움직인다. 그러는 중에 동작에 힘이 실리고 템포가 빨라지면서 동그라미를 긋게 된다. 온몸이 뱅글뱅글 돌면서 원을 그리게 된다. 그 원이 차츰 좁아지다가 마침내 원의 중심에서 돌던 맴돌이는 소용돌이가 된다.”9
이러한 맴돌이, 소용돌이, 윤무 등 무당의 춤사위의 특징들이 실제 무당이 부재함에도 바닷물의 흐름에 의해 강조된다. 사람과 매듭과 해초, 바다 생물들이 급진적 경험과 몰입 체험의 경계를 만든다. 제의가, 풀이가 생태 운동에 참여하는 해녀들에 의해 수중에서 펼쳐지면서 기존 제의와의 차이가 만들어진다. 제의는 전통적이고 정전(canon)적 형식을 갖는 반면, 〈제물〉과 〈이 질서의 장례〉(2022) 그리고 〈잔해〉는 제의의 정전, 양식, 아우라를 유지하면서도, 탈제의적 과정을 다시 통과하며 강건한 긴장을 생산한다. 모체(matrix) 기호를 벗어나 기호 이탈(de-sign)을 감행하면서 새 기호를 궁리하고, 그리고 다시 모체로 반역의 몸짓, 언어로의 귀환, 새로운 장을 만든다. 결과적으로 알려진 것과 미지에 대한 것이 자리를 바꾸어 가며 펼쳐진다. 이 실행은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다. 촬영, 작업이 일어나는 제주 공동체 구성원들과 작가와의 협업은 여기서 중요한 구성 조건이다.
제인 진 카이젠은 전작 〈이별의 공동체〉(2019)에서 작가의 발화 위치, 자기 지시성을 바리데기(공주) 신화에 놓는다. “무한한 ‘사이’인 이쪽과 저쪽을 넘나드는 ‘여자’는 죽음의 강을 건네주는”10 바리공주다. 이 시원(始源)의 장, 원초경(primal scene)을 치환하는 제인 진 카이젠에게 그 첫 장은 자전적으로 보자면 입양이다. 한국에서 덴마크 가정으로 입양되고, 이후 덴마크에 거주하면서 제주도에 돌아와 리서치와 장기간의 컬래버레이션, 학제적 실천을 번역하고, 수행성 이론에 기반해, 서사 실험 영화, 사진 설치, 퍼포먼스, 그리고 텍스트라는 매체를 아우르며 시도하고 있다. 역사의 주름을 펴는 기술로서의 미디어 설치 작업, 파편들의 프리즘의 다중채널과 단채널 작업을 한다.
〈이어도(바다 너머 섬)〉에서는 할망, 해녀, 심방, 활동가들, 어린이, 물질, 해조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이 〈잔해〉, 〈제물〉, 〈이 질서의 장례〉, 〈할망〉, 〈수호자들〉(2024), 〈어귀〉(2024), 〈심〉(2024)의 선순환을 만들어 낸다.
2. 각설하고, 동티를 설하다11
초기 예술 작품들이 마술적 또는 종교적 의식에 봉사하는 과정에서 탄생했고, 예술 작품의 아우라와 관련된 존재는 결코 그 제의적 기능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진정한’ 예술 작품의 고유한 가치가 그 원래의 사용 가치가 있던 제의에 기초한다.12 이 관점에서 보자면 제의를 다루는 무빙 이미지, 시네마, 특히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를 시청각적 에스노그래피(ethnography)로 번역하는 것을 넘어선, 제인 진 카이젠의〈이어도(바다 너머 섬)〉의 정치, 역사, 환경, 생태를 아우르는 실천은 주목할 만하다.
〈이어도(바다 너머 섬)〉이 의례를 작동시키는 방식은, 사람들이 ‘동티’라고 부르는 것을 대담하게 동티 설화로 전복시키는 것이다. 동티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건드려 해를 입는 것인데, ”동티 설화는 여기서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이질적이고 불통하는 관계를 동질적이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담고 있다.”13 동티를 동티 설화로 바꾸어 내면서 〈이 질서의 장례〉는 통상적으로 남자들에게만 허용된 운구(運柩)를, 세대와 계층, 젠더를 가로질러 환경 활동가, 예술가, 디아스포라, 퀴어, 트랜스 행위자들로 바꾸어 수행한다. 사진이나 초상화 영정은 검은 거울로 대체된다. 동티라는 공포의 담론으로 재생산되는 위계, 젠더를 가격(revolt)14하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무빙 이미지를 통한 이야기하기(fabulation)를 이루어 낸다. 1980년대 민중 미술, 거리 시위를 환기시키면서도, 장례 의식, 카니발적 수행에서의 젠더 역할의 뒤집기, 우회하기를 통해 다른 의미의 영역을 만든다. 의례의 형식, 자기 지시적 메시지, 수행성의 과정을 정교하게 재연하는 제의 과정15의 반복 안에서 동티 설화를 만들어 낸다.
한국 제의 문화의 으뜸인 장례에서 운구는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화장지)까지 운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질서의 장례〉에서 운구와 하관 의식 사이 도깨비가 나타난다. 도깨비들은 장난이 지독한 훼방꾸러기이지만 ‘이 질서의 장례’에 난장을 가져와 질서의 뒤집힘을 가능케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도깨비들이 폐허가 된 리조트의 방과 다른 장소들을, 운구 행렬과 마주치며, 가로막으며, 비켜 가며 돌아다닌다. 긴 지팡이로 두드리기도 한다.
“두두을(豆豆乙), 두두리. ‘두둘’, ‘두들기다’와 관계된 도깨비에게 두들김은 그의 본성과도 같고 또 장기와도 같은 것이어서 ‘돈 나와라, 와라와라, 뚝딱!’ ‘쌀 나와라, 와라와라. 우당탕!’”16
두들김.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힘이 겨루게 된다. 도깨비의 두들김 난장과 ‘이 질서의 장례’와 기존 질서의 장례 코드, 상복과 운구 용품들. 이 세 세력의 힘과 위세와 반권력이 미장센, 장면을 만들고 그들을 들썩이게 한다.
각설하고, 운구해 온 관을 장지에 하관하는 대신, 운구를 하던 사람들은 관을 내동댕이친다. 이 사태 이전, 타도와 부정, 거부의 구호, 소리가 높았다. 검은 물이 삼켜 버린 것 같은 숏이 이어진 후, 박살 난 관등이 보인다. 이후 상복을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일상복을 입은 사람들은 관 대신 매듭을 엮는다. 소창 매듭은 〈이어도(바다 너머 섬)〉에서 역사의 악순환과, 자연의 순환, 그것의 얽힘과 풀림, 상처, 내부화 작용을 엮어 내는 생기 있는 물질이다. 매듭은 외부와 내부를 잇기도 하지만 바로 그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만들고, 내부의 외부성이기도 하다. 컴퓨터 시대, 실, 소창, 매듭, 실마리는 프로그래밍의 ‘스레드(thread)’로 치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바다 안, 제의 촬영이 가지는 자연스럽게 극화된 유동성은 “자연이 어디에서 멈추고 문화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혹은 그 반대인지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정의에 꼭 맞춤인 생태학17을 제시한다.
3. 에코그래피, 매듭들
이러한 바다의 유동성과 대비되는 〈이어도(바다 너머 섬)〉의 매듭들은, 심리학부터 무교 연구까지에 있어 중요한 토픽이다. 인간 관계, 인간 심리의 복잡성을 R. D. 랭(Laing)은 『매듭들(Knots)』이라는 책에서, 매듭(knots), 얽힘(tangles), 혼란(fankles), 막다름(impasses), 단절(disjunctions), 소용돌이(whirligigs), 묶임(binds)과 같은 심리적 현상으로 표현하면서 시의 형식을 빌어 다룬다.18 또 한국의 정서 구조에서 매듭은 이렇게 이해된다. “원한의 맺힘과 풀이에는, 보다 정확하게는 그러한 말에는 끈, 실, 띠 등의 비유법이 작용하고 있다. ‘매듭 고’를 국어사전에서는 “옷고름 따위를 잘 풀려지지 않게 고리 모양으로 만든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또 매듭은 “묶어 맺은 자리”에 대한 비유법은 원한의 비유법을 넘어서 인생의 비유법에까지 넘나들게 된다.”19 이렇게 〈할망〉이 엮어 낸 매듭은 〈제물〉, 〈잔해〉에서 제주와 제주 바다를 사진(絲診), 실로 진맥하여 진단한다. 제주는 한국의 근대사, 현대사의 응축된 증후이자, 생태계다. 국가 폭력,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강정 군사 기지의 해양 생태계 파괴 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매듭은 무교를 포함하는 제의에서 신유물론의 유령적 얽힘, 유령론을 왕래할 수 있는 탁월한 물질이다.20 앞서 말했듯 매듭이 수중에서 활동할 때 바닷물이 그것들이 만들어 내는 일시적 경계들을 일렁이게 해 그 유동성은 배가 된다. 이러한 매듭의 물길, 우주 속에서 〈제물〉을 수행하는 해녀들, 여성들은 물속에서 어떤 매체로 행동하게 된다.
미디어(media)는 ‘매체(媒體)’로 번역되는데, ‘매(媒)’는 중매, 매파(媒婆), 즉 중매쟁이, 그리고 ‘체(體)’는 주로 몸이나 물질을 뜻한다. 미디어와 한국 번역어 매체는 어느 정도 상응하지만, 매체(媒體)는 비전자전기적 몸과 물질을 가리킬 수 있다. 흥미롭게도 매(媒)의 부수는 여자[女]다. 관련 단어로는 중매쟁이인 매파(媒婆)와 무당인 영매(靈媒)가 있다. 매체는 몸과 물질의 중매로서 무형의 소통, 즉 무당을 연상시킨다. 이것을 실마리 삼아 나아가면 제인 진 카이젠의 작업 〈이어도(바다 너머 섬)〉은 무교, 제의의 장에 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의 세 가지 생태계, 즉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생태계를 겹쳐 놓고 순환시킨다.21 이때 생태의 정의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인간 주체성까지 확장된다. 가타리는 지구를 위협하는 생태 위기가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확장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주장하며, 모든 생명 시스템 간 차이를 존중하는 새로운 생태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세 가지 생태계를 지닌 〈이어도(바다 너머 섬)〉의 “공간 시간 물질화“22는 〈어귀〉와 〈심〉을 중심으로 나선형으로 펼쳐진다. 〈어귀〉와 〈심〉은 한편으로는 고대 퇴적층의 갑각류 화석과 다공성 용암으로 기이하고 숭고한 경관을 만들어 낸다. 이들의 장구한 존재감과, 사운드로 일부 사용되는 뚝딱 음은 아이러니를 생산한다. 두 작품에서 사굴에 깃든 설화 ”제물이 된 처녀와 그를 구해 준 판관에게 내린 붉은 기운의 저주“는, 생명을 움직이는 거대한 여신 설문대 할망에 대한 제주도의 샤머니즘적 시조 신화로 바뀐다.
또한 〈어귀〉와 〈심〉으로 다시 호명된 이 장소들은, 〈잔해〉에서 바다가 쓰레기 매립장인 양 무책임하게 대량의 무기를 버리는 충격적인 장면과 상호 연결되며, ”회복 탄력성(resilience)“에 대한 사유를 이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제안했던 C. S. 홀링(C. S. Holling)은23 작은 규모의 반격, 변화(revolt)와 기억(remember)을 생태학적 회복의 핵심 능력이라고 본다. 〈잔해〉, 〈심〉과 〈어귀〉, 〈제물〉에서 이 작은 규모의 변화와 기억에 관한 생각, 감각이 촉발되며, 자연과 역사가 상호 연결된 제주 바다의 회복 탄력성을 지닌 마을들과 바다는 “짙은 청흑색의 거친 현무암 형성물 틈이 바다 조개의 내부로 들어가는 어귀”로 이어진다. 이에 〈이어도(바다 너머 섬)〉은 ‘기억의 기술(mnemotechnologie)’을 통해 생태, 환경, 역사의 반격을 이루어 내는 변화와 기억을 담는다. 다시 말해, 사진(絲診)의 에코그래피로 발현되고 반향을 만든다.
〈수호자들〉에서 꼭두가 상여 꼭대기에 망자들을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손에 들려진 채 강강술래를 돌 때, 꼭두는 망자의 죽음과 종말만이 아닌, 삶, 내세의 삶, 잠재성, 미래성을 바라보고 지켜낸다. 이 이질적 미래성이 〈이어도(바다 너머 섬)〉이다.24
1. Liquid Hauntology of Ieodo: Effervescent Eco/Echography
2. 소창은 전통적으로 농한기에 직조기로 생산됐다. 농민들은 면사를 산 다음 작태-가공-와인딩-후다·정경(整經)-연경-직조-검단 과정을 거쳐 시장에 내다 팔았다. 가내 생산량은 대여섯 마 정도였지만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됐다. 소창은 무속 의례와 불교 의례에서도 애용된다. 소창은 무속 의례에서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 또는 삶의 질곡을 뜻한다. 절에서 49재를 지낼 때도 영가(靈駕)를 데려오기 위한 일종의 다리로 소창 30마가 사용된다. 장장식, 김나라, 『강화의 직물, 소창: 근현대 생활문화 조사보고서』(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19) 참조.
3. 로이 라파포트, 『인류를 만든 의례와 종교』, 강대훈 옮김(서울: 황소걸음, 2017), 9
4. 윌리엄 제임스,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김재영 옮김(파주: 한길사, 2000), 38.
5. 김성례, 『한국 무교의 문화인류학』(고양: 소나무, 2018), 560.
6. 한의에서 맥과 연결된 실의 끝을 잡고 그 감촉으로 살피는 진맥. 부녀자의 몸에 손을 대거나 마주 보지 않도록 벽을 사이하여 진맥한다. 젠더 편향적인 진맥 방식이지만, 〈이어도(바다 너머 섬)〉에서 매듭으로 현상에 다가가고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진’이라는 단어를 전유하고 활성화한다.
7. 김성례, 163–164. 제주도의 특정한 지방 역사에 비추어 제주 무교가 하나의 역사적 담론(historical discourse)으로 존재하는 양식을 기술하고 있다.
8. ‘echography’는 주로 의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신체 내부의 상태(예컨대 임산부 배 속 태아의 상태나 안구 내부의 상태 등)를 고주파를 통해 진단하는 방법을 가리키며, 초음파 진단법이나 초음파 조영법 등으로 번역되는데,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와 베르나르 스티글레르(Bernard Stiegler)는 이런 의학상의 의미에 메아리 반향 등을 더해 텔레비전에 대해 논한다. 여기서는 ‘echo’와 더불어 ‘eco(생태적 함의, 생태 지리학의)’의 의미를 더해 한글로 ‘에코(echo/eco)그래피’를 이중적, 다중적인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래피(graphy)’는 ‘쓰다, 기록하다’ 또는 ‘표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불어권의 ‘에코그라피’와 영어권의 ‘에코그래피’ 중 에코그래피로 표기한다. 생태 지리학, 생태 무빙 이미지, 진단 영상, 반향 등 ‘echography’에 대한 부분은, 자크 데리다, 베르나르 스티글레르, 『에코그라피: 텔레비전에 관하여』, 김재희, 진태원 옮김(서울: 민음사, 2002), 10–16 참조.
9. 김열규, 『풀이』(서울: 비아북, 2012), 64.
10. 김혜순, 『여성, 시하다』(서울: 문학과지성사, 2017), 43.
11. Dongti, Triggered and Fabulated
12.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사진의 작은 역사 외』, 최성만 옮김(서울: 길, 2007) 참조.
13. 김신정, 「동티 설화에 나타난 생태 담론」, 『기호학 연구』 제75권(2023), 7–36. 동티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영화 〈파묘〉에서 인부 한 명이 파묘 중 사람 머리를 한 형상을 손상시켜 동티를 당하는 설정 등에서 찾을 수 있다.
14. C. S. 홀링(C. S. Holling)의 개념 ‘revolt’와 ‘remember’로, 주석 23에서 설명.
15. 로이 라파포트, 69–146.
16. 김열규, 『도깨비 본색, 뿔난 한국인』(파주: 사계절, 2010), 42.
17. Nadia Bozak, The Cinematic Footprint: Lights, Camera, Natural Resource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2012), p. 15.
18. R.D. Laing, Knots (New York, NY: Pantheon, 1970)의 책 날개에 인용된 저자의 표현.
19. 김열규, 『풀이』, 41.
20. Karen Barad, “Quantum Entanglements and Hauntological Relations of Inheritance: Dis/continuities, SpaceTime Enfoldings, and Justice-to-Come,” Derrida Today 3.2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0), 240–268.
21. Félix Guattari, The Three Ecologies, Translated by Ian Pindar and Paul Sutton (London: Athlone Press, 2001), 6–17.
22. Karen Barad, 240–268.
23. Lance H. Gunderson, C. S. Holling, Panarchy: Understanding Transformations in Human and Natural Systems (Washington, DC: Island Press, 2002)라는 책에서 논의된다. 홀링의 회복 탄력성 개념은 전통적인 공학적 안정성 개념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공학적 안정성은 시스템이 교란 후 평형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홀링의 생태학적 회복력은 시스템이 교란을 흡수하고, 재조직하며, 핵심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면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다. 이러한 개념들을 예술 작업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기억의 기술이나 에코그래피로 이 개념을 옮겨 와 사용하고 있다.
24. Soyoung Kim, “Modernity in Suspense: The Logic of Fetishism in Korean Cinema,” Korean Cinema in Global Contexts: Postcolonial Phantom, Blockbuster and Trans Cinema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22). 김소영은 이 논문에서 김기영 감독의 영화 〈이어도〉(1977)를 분석하는데, 여기서 이어도는 물신, 연물, 주물 세 가지로 번역되는 ‘fetish’, 근대 상품 자본주의와 무교적 제의와 전근대적 믿음 체계, 세 가지가 응축적으로 경합하고 있는 파랑도라는 가상의 섬 그 너머,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를 가리킨다.
Critic 2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1: 제인 진 카이젠 작가론
츄스 마르티네스 (바젤 고등 미술 및 디자인 아카데미 FHNW 아트 젠더 네이처 학과장)
I.
우리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더 이상 알 길이 없다. 거듭 심화되는 야만의 논리에 따라 전개되고 있는 이것을 후기 자본주의라고 명명하는 게 적절할까? 내가 태어난 스페인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자본주의는 전성기를 맞았다. 약속된 발전, 보장된 주체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라는 동기가 부여된 인간 기계, 즉 도시 노동 계급이 가동하는 경제 엔진 덕분에 이들 국가는 빈곤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했다. 우리 할머니는 수많은 젊은 세대가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어떻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지 이야기했다. 그들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특이한 복장, 그리고 가전제품을 사들이려는 욕구와 함께 여름에만 고향으로 돌아온다. 원래 그들의 가정에는 냉장고가 없었다. 음식을 건조, 염장, 발효 등과 같은 전통 기법을 통해 보존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에서 음식은 거의 항상 모자랐고, 따라서 귀중했다.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의 전통식 부엌에 선물로 놓아 드린 거대한 냉동·냉장고는 거의 항상 비어 있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아침, 냉장고 문을 연 어머니는 안을 가득 채운 갈색 용지로 포장된 무언가를 발견했다. 놀란 어머니는 다소 불안한 얼굴로 할머니에게 냉장고에 과일을 넣어 두려고 하니 포장물을 좀 치우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할머니의 답은 직설적이었다. “안 돼. 나는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은 항상 싫었어. 뭘 마취시킨 것처럼 아무 맛도 안 나거든.” 도대체 포장해서 넣어 둔 것이 무엇인지 묻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시트란다. 여름에 시트를 쾌적하게 보관하는 데는 냉장고만 한 게 없어. 아주 훌륭한 발명이야.”
제인 진 카이젠은 (그의 경우,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경제관 그리고 가치관에 균열을 내고자 한다. 그의 작품을 해석할 때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균열, 예를 들어 냉장고 안에 침대 시트를 넣어 두는 일은 사유의 궤적은 물론이고 세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현실이란 항시적 실체이자, 변화 없이 인식될 수 있는 무언가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취약한 것이다. 현실은 바라보는 이의 관점이 바뀌면 그에 따라 변모될 수 있는 가변적인 실체이다. 몽상에 가까운 사색에는 기적을 행하는 가능성, 현실의 온갖 문을 개방하고 이를 통해 다른 세계가 도래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다. 지금 이 세계에는 과거 그리고 미래의 모든 세계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 의식, 인물, 상징물을 활용하는 작업. 이것이 카이젠의 작품을 관통하는 요소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다.
II.
이번 전시에는 일곱 점의 작품이 나선형을 이룬다. 〈잔해〉(2024), 〈수호자들〉(2024), 〈할망〉(2023), 〈이 질서의 장례〉(2022), 〈제물〉(2023), 〈어귀〉(2024), 〈심〉(2024)은 개별적인 작품이지만, 서로 유기적인 단위를 형성하기도 한다. 옛 두루마리 그림처럼, 각 부분의 모티프는 자신만의 고유한 맥락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 그림이 관객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순간의 장관을 이루기도 한다. 이미지의 순차적인 나열을 통한 서사 방식은 아시아 고미술의 특징인 반면, 서양에서는 그림이 일단 벽에 걸리는 순간 항시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카이젠의 작품은 이러한 동서양 미술의 요소 사이를 유기적으로 횡단한다. 카이젠의 영상 또한 서양 미술의 특징처럼, 각각의 작품을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재현으로서 볼 수 있다. 반면에 다수의 작품을 연결 지어 보는 순간, 그들이 구성하는 전체성은 나선을 형성하며, 한 영상에서 다음 영상 사이의 제례적인 전환을 자아내고,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관객은 전시 공간 사이를 이동하며 관람함으로써, 순서에 대한 감각을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순서라는 것 또한, 보는 관객의 재량에 따라 몇 번씩 재해석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작품은 대한 해협에 위치한 큰 섬,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다. 화산에서 솟아난 〈심〉에서, 관객은 마치 자궁과도 같이 섬에 생명을 부여한 사굴(蛇窟)을 마주하게 된다. 〈심〉과 짝을 이루는 〈어귀〉는 모든 생명의 심장을 뛰게 하는 힘, 그리고 그러한 힘이 깃든 설문대할망과 제주도의 창조 신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제주도의 탄생 이후에는 역사가 뒤따른다.
〈잔해〉는 태평양 전쟁 당시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다루며, 〈할망〉은 바람의 신 영등할망과 그녀의 보호를 받는 해녀들을, 그리고 〈수호자들〉은 사자(死者)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봉헌물을 가지고 노는 화산 지대의 아이들을 보여 준다. 〈제물〉은 변화의 의식이 거행되는 제주 바다로 우리를 데려가고, 〈이 질서의 장례〉는 인간이 망치고 부숴 버린 무수한 질서와 세계를 위한 장례 행렬 사이로 관객을 이끈다. 각 작품은 섬세한 관람 방식을 유도하고, 과거의 고통에 대한 감응과 기억의 힘을 상기시키면서도, 자연 질서에 대해 경외심을 갖게 하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믿음과 의식에 대해 조명한다. 또한, 신화를 통해 인간의 취약함과 제주도와 같은 지역 내 인간 사회의 고대 기원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도록 하며, 자연과 인간 사이의 연결 고리를 재연하고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 또한 일깨운다. 카이젠의 작품 속에서 제주도는, 이 행성에서 하나의 종(種)으로서 지닌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터전에 관한 사유의 보고로 거듭난다. 2백만 년도 더 전에 수중 화산 폭발로 인해 형성된 이 섬은, 한국 사회 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탐라국이라는 독립적인 나라가 존재하던 제주도는 처음으로 섬에 말을 데려온 몽골 제국에 의해 침략당하고, 이후 고려와 조선의 관할 아래 있었으며, 1910년에는 일본에 의해 식민지가 되었고 해방 이후 1946년에는 한국의 행정 구역인 ‘도’가 되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과는 별개로, 제주도는 육지를 갈구하는 타자성(otherness)과 본토에 대한 대응성(counterpart)을 나타낸다. 제주도는 전통과 자연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노력이 계속되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강도를 더해 가는 착취와 관광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곳, 그리고 한 공동체에게 귀중하고 신성한 모든 것이 자본주의화되어 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제주도는 해녀의 땅이기도 한데, 이러한 바다 여성의 공동체가 연령과 젠더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창출해 내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다. 이 여성들이 가진 놀라운 힘은 ‘유산’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나아간다. 원래 유산이란 우리가 속하고 싶은 과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붙이는 이름이며, 보통 이러한 과거의 중심에는 여성이 부재한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지만, 물려줄 유산의 소유권은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이러한 상징 서사는 여신의 이름에서 기인하는 어원을 통해 전복되고, 인간을 포용하는 바다와 바람의 여신, 화산 속에 잠들어 있는 불의 어머니, 그리고 해녀의 존재에 의해 대체된다. 패류 채집과 작살 낚시라는 고된 노동 속에서 여성의 존재가 공동체 전체에 대한 이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기 그지없다. 나 또한 스페인 북서쪽 해안 지역의, 여성들이 절벽 바위에 줄로 몸을 묶고 물속으로 들어가 따개비를 채집하는 문화권 출신이다. 이런 직종을 가진 여성의 존재가 어디에 기원하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빚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거센 물살, 춥고 어두운 바다의 위력을 극복하는 힘, 가파른 절벽에 난 길을 능숙하게 오가는 기동력을 가진 이 여성들은, 사회 태도의 변화를 야기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은 누군가의 결혼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 아버지와 남자 형제들에 의해 좌우되는 자립성 없는 존재로서 여겨지지만, 제주도 바다의 여성들은 변화의 능동적인 주체이자,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자연과의 소통에서 주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III.
제주도는 타자성을 상징한다. 카이젠의 작품에 깃든 힘은 이러한 측면을 포착하는 데 있다. 카이젠이 만들어 내는 이미지의 강렬함은 재현적 혹은 시각적 역량이라기보다, 무언가에 생명을 불어넣는 힘에서 기인한다. 구체적으로는 과거의 이미지, 심상, 몽상, 그리고 욕망의 이미지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이러한 힘은 역설적이게도 영화나 영상 미술보다는 시의 특징에 가까운 것이다. 영상은 세상에 깃든 어떤 기운을 자아낸다기보다는, 현실을 드러내 보이는 힘이 더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강렬한 이미지와 선명한 색조가 특징인 카이젠의 작품에서 그는 대지, 공기, 물, 그리고 신체 등 화면 안의 모든 요소 사이의 대비가 드러나게 한다. 백일몽처럼 느껴지도록 이미지 환경을 조성하는 사운드, 즉 음악이 강조하고 있는 작품의 내재적 리듬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마련한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 제주도와 같은 곳이 몇이나 더 있을까? 어떤 장소와 그 장소가 가진 잠재력을 서사를 통해 소진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오히려 발굴해 낼수록 더욱 특이하고 놀라운 서사와 신화가 생성될 수 있는 걸까? 글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경제적 잉여 및 가치 창출의 체계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형성해 온 다양한 관계망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생산과 소비를 위한 자연 착취에 맞서, 소유욕과 탐욕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수련, 의례, 수행의 창조를 통해서 말이다. 세계를 향한 새로운 시선을 통해, 우리는 자본주의적인 충동을 억제해야만 한다. 카이젠의 영상에서는 흰색 면직물인 소창이 등장하는데, 이는 강렬한 관계성이 만들어 내는, 이전과는 다른 길로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이끌 실의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와 교감하는 모두를 하나로 이어 낸다. 실은 탯줄을, 바다는 태반을, 그리고 흰옷은 순수성을 상징하며, 이전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순환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 직물 그리고 카메라가 움직이는 방식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기운은 생성적이고 개방적이며 고리 모양을 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카이젠의 작품에는 인간의 말소리로 된 대화가 부재하며, 영상 내 등장인물이 서로와 말을 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화를 대신해 소통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리적인 접촉, 부스럭거리는 바람, 피부, 표정, 신체의 움직임, 물, 식물, 하늘, 아이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형상, 아카이브에서 건져 낸 이미지, 목소리, 제례 음악, 그리고 강렬한 소리와 같이 ‘말소리’를 제외한 모든 것을 통해 형성되는 연결 방식이다. 또 다른 세계에서도 살아 있다는 감각과, 자신이 있는 장소를 파악하고 다른 존재나 생명체들과 공존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카이젠 작품의 핵심이다. 반면, 말과 대화는 그러한 이해의 공간에서 우리를 밀어내고 언어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유일한 종, 즉 인간종의 영역으로 배치시킨다. 자연의 노래에는 말의 언어가 없듯, 인간 또한 자연과 같은 방식으로 노래할 수 있다. 자연이 움직이듯 인간 또한 움직이고, 자연이 살생하듯 인간 또한 살생하며, 자연이 의례를 치르듯 사람도 의례를 치른다. 카이젠의 작품은 단순히 인간의 오감으로만 환원되지 않는 새로운 감각의 힘을 마치 직물처럼 엮어 낸다.
IV.
강도(intensity)라는 것은 정동과 관련된 개념이다. 정동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신체의 역량을 가리킨다. 카이젠의 전시 방식에는, 그의 모든 작품이 그렇듯 ‘뿌리 찾기’와 ‘연결하기’라는 특징이 강조되어 있다. 여기서 뿌리 찾기란, 누군가의 삶에 중요한 장소가 상징하는 것을 깊이 파고들어, 그 장소와 비로소 연결되는 것을 뜻한다. 연결하기란, 신체를 맞닿아 인지와 감정의 동기화를 이루어 신뢰와 온기의 감각을 형성하고, 그로부터 즉각적인 보람 및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중세 유럽의 제단화나 아시아의 두루마리 그림처럼, 카이젠의 작품은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같은 화폭에 속해 있는 다수의 영상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넓은 전망을 제시한다. 재현과 언어의 위기라는 것은 다른 언어를 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의 필요성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우리를 둘러싼 파괴의 역학과 폭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는, 결국에는 삶에 대한 관용을 담은 언어, 적절성, 존엄성에 대한 우리의 바람을 정박할 장소를 찾아야 한다. 그럴 수 있는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제주도이지만, 아직은 구축되어야 하는 장소이다. 제주도는 구체적인 지리적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의 이상향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또한 우리의 보금자리를 구성하는 바다와 땅의 지혜, 의례, 신화, 여러 세대의 사람들, 폭넓은 지식 체계의 연결을 보여 주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연상적 사유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론이다.
카이젠의 작품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양상과는 대조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그의 예술 언어는 과거를 회상하지만, 향수를 유발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는다. 과거에 자행된 참사를 다루지만, 이에 초연하지는 않는다. 그의 작품은 변화를 담고 있지만, 이는 급격한 변혁이라기보다, 태도와 행동의 차원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에 가깝다. 또한 카이젠의 작품은 다른 현실의 가능성, 즉 우리가 현실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낸다는 측면에서 변이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은 또 다른 현실을 생성해 낼 수 있는 코드의 위력을 믿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것이다. 인공 지능의 적용을 상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지만, 그에 앞서 이러한 위력을 포착해 내는 예술, 퍼포먼스, 영상이, 현존하고 있는 세계를 대체해 버릴 만큼 방대한 세계의 도래로 이끄는 코드를 구성하기도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공상 과학 영화 한 편, 아름다운 시구 하나가 현상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7점의 작품이 가진 공통점은 바로 이러한 힘이다. ‘7’이라는 숫자는 고대부터 코드, 즉 상징체계를 만들 때 쓰인 바 있으며, 거기에는 모든 힘, 신화, 그리고 영적 영역을 언급하는 대상들 전부를 신호화할 수 있는 힘이 깃들어 있다. 이 코드는 은유적인 힘이 아니라 지금도 실질적인 것으로, 실재와의 연결 지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하며, 외부 세계로부터 솟아 나와 인간 정신 내부로 스며들어 더 나은 삶에 대한 의식과 계몽을 만들어 낸다. 이 7점의 작품은 나선을 형성하며 우리의 선택, 가치, 그리고 목표를 결정할 정신성의 진화와 성장을 상징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