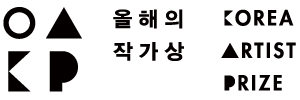이강승

Interview
CV
교육
2012
캘리포니아 아트 인스티튜트, 미술학 석사
주요 개인전
2023
《손의 심장》, 빈센트 프라이스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2021
《잠시 찬란한》, 갤러리현대, 서울, 한국
《Permanent Visitor》, 커먼웰스 앤드 카운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2020
《Becoming Atmosphere (with Beatriz Cortez)》, 18th Street Arts Center, 산타모니카, 캘리포니아, 미국
2018
《가든》, 원앤제이갤러리, 서울, 한국
2017
《untitled (la revolución es la solución)》, 아트페이스 산안토니오, 텍사스, 미국
《Leave Of Absence & Absence Without Leave》, 커먼웰스 앤드 카운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2016
《Covers》, 로스앤젤레스 컨템퍼러리 아카이브, 로스앤젤레스, 미국
2015
《Kang Seung Lee: Untitled (Artapeak?)》, 피처 칼리지 아트 갤러리, 클레어몬트, 캘리포니아, 미국
2012
《나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센트로컬추럴보더, 멕시코시티, 멕시코
주요 그룹전
2023
《Made in LA: Acts of Living》, 해머미술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Out of the Night of Norms (Out of the Enormous Ennui)》, 팔레드도쿄, 파리, 프랑스
《Queer Threads》, 산호세퀼트앤텍스타일뮤지엄, 산호세, 캘리포니아, 미국
《We Cry Poetry》, de Appel,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Strings of Desire》, 크래프트 컨템포러리, 로스앤젤레스, 미국
2022
《Let’s Talk: Vulnerable Bodies, Intimate Collectives》, 휘트니 미술관, 뉴욕, 미국
《테라코타 프렌드십-우정에 관하여(invited by Jatiwangi Art Factory and MMCA)》, 도큐멘타 15, 카셀, 독일
《Nosotrxs》, 커먼웰스 앤드 카운슬, 멕시코시티, 멕시코
《Annotations, how we are in time and space》, 아모리센터포더아츠, 파사데나, 미국
2021
《Soft Water Hard Stone》, 2021 뉴뮤지엄 트리엔날레, 뉴뮤지엄, 뉴욕, 미국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 제13회 광주비엔날레, 광주, 한국
《Omniscient: Queer Documentation In an Image Culture》, 레슬리-로만 미술관, 뉴욕, 미국
《가드닝》, 피크닉, 서울, 한국
《Queer/Feminism/Praxis》, 로드아일랜드스쿨오브디자인, 프로비던스, 미국
《Close to you》, 매사추세스 현대미술관, 노스애덤스, 매사추세스, 미국
2020
《[Glyph]》, ICA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미국
《연대의 홀씨》, 아시아문화전당, 광주, 한국
《또다른 가족을 찾아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이 공간, 그 장소: 헤테로토피아》, 대림미술관, 서울, 한국
《Queer Correspondence》, 셀프로젝트, 런던, 영국
《When we first arrived…》, 더코너 휘트만워커, 워싱턴 DC, 미국
2019
《Touching History: Stonewall 50》, 팜스프링스 아트 뮤지엄, 팜스프링스, 캘리포니아, 미국
《Altered After》, 파티시펀트, 뉴욕, 미국
《Condo London》, 머더스탱크스테이션, 런던, 영국
2018
Commonwealth and Councl, 티나킴갤러리, 뉴욕, 미국
2017
《Reconstitution》, LAXART,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2016
《De la Tierra a la Tierra》, 센트로컬추럴메트로폴리타노, 키토, 에콰도르
주요 퍼블릭 프로젝트
2022
la revolución es la solución!, LACMA × Snapchat: Monumental Perspectives, LACMA, 캘리포니아, 미국
2019
퀴어락, 합정지구, 서울, 한국
2017
Leave of Absence, 웨스트할리우드 디지털 빌보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주요 레지던시 및 펠로십
2022
맥도웰 펠로십, 미국
2020
18th Street Arts Center Lab Residency, 산타모니카, 캘리포니아, 미국
2019
California Community Foundation Fellowship for Visual Artists, 캘리포니아, 미국
2017
아트페이스 산안토니오 국제레지던시, 산안토니오, 텍사스, 미국
주요 수상 및 기금
2023
아태디아상, 미국
2022
LACMA × Snapchat: Monumental Perspectives, LACMA, 캘리포니아, 미국
2019
apexart International Open Call, 뉴욕, 미국
2018
레마 호트 만 파운데이션 지원금, 미국
Critic 1
기억과 애도로부터 난잡한 미래를 여는 연습들
남웅
확장된 정원술의 실천
#1. 파푸아섬에 사는 생물군은 외부 천적과 기후변화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게 고립되어 생존의 압박에서 자유롭다. 이러한 조건에서 서식하는 극락조들은 짝짓기를 위해 저들만의 유혹 방식을 고안한다. 그들 중 바우어새는 온갖 반짝이는 잡동사니들로 바우어(bower, 나무 그늘)를 정원처럼 꾸민다고 알려져 있다. 일부다처제를 유지하는 바우어새 수컷은 양육을 신경 쓰지 않는다. 바우어는 둥지보다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장치에 가까운데, 수컷은 털갈이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전부 바우어를 꾸미는 데 할애한다고 한다. 이들은 여러 종류의 소재나 사물을 모은다. 특정 색상을 띠거나 반짝거리는 것은 무엇이든 둥지의 재료가 된다. 그렇게 집어 오는 것 중에는 잔여와 쓰레기, 마을에서 버려지거나 방문객이 버리고 간 플라스틱 보석들도 있다. 한편 이 새는 또 다른 능력으로 주변 환경의 소리를 흉내 낼 수 있다. 다른 동물의 소리뿐 아니라 기계음까지도 따라 한다.
#2. 1921년 미국에서 태어난 칼 페리스 밀러(Carl Ferris Miller)는 1945년 4월 일본 오키나와에 통역장교로 배치되고, 1946년 한국에 연합군 중위로 오게 되었다. 1953년 한국은행에 취직한 그는 1979년 귀화하며 민병갈이라는 한국 이름을 사용하는데, 한국과 식물을 공부하며 수목원 조성을 하게 되었다. 2002년까지 살았던 그는 평생 홀로 지내며 천리포에서 수목원을 가꿨다. 해외 학회들과 종자 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환경과 식물을 알린 그는, 일찍이 1978년에 감탕나무와 호랑가시나무의 자연 교잡으로 생긴 신종 식물을 발견한 바 있다. 한국의 완도에서만 자라는 식물이 희귀종으로 검증되면서 ‘완도호랑가시’로 명명하며 ‘Ilex x Wandoensis’(C. F. Miller & M. Kim)를 국제학회에 등록하기도 했다. 현재 그가 남긴 천리포수목원은 2009년 이후 단계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의도야 다르겠지만, 수컷 바우어새의 행위를 두고 실용적이지 않지만 무용함을 거스르는 장식 행위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구애를 위한 몸짓이라 하지만 과연 짝짓기를 위한 구애만을 위한 것인가를 조금이나마 의심할 수 있다면, 더불어 주변의 소리를 흉내 내면서 다른 새들을 모으거나 경계하는 기능을 상상할 수 있다면, 여기에 이강승 작가의 작업에 관한 논의를 포개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정원’으로 줄곧 부르는 파푸아섬의 바우어(bower)는 주변 사물을 수집하고 배치한 결과물로 외부 환경에 개입하고 그 풍경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민병갈의 생애로 시선을 돌리면, 타국에 이주하여 터를 잡으며 보이지 않았던 존재를 바깥에 드러내고 외부와 연결을 넓히는 작업을 또한 교차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 활동해 온 이강승 작가가 2018년 11월 국내에서 처음 연 개인전의 주제는 ‘정원’이었다. 원앤제이 갤러리에서 진행한 《Garden》은 장소와 상실, 상실을 기억하는 장소, 기억과 애도를 위한 장소를 시각화하는 정원술, 정원술로서 시각예술의 형식들을 보여줬다. 탑골공원과 남산, 영국의 프로스펙트 오두막에서 흙을 가져다 저편의 장소에 묻는 작가는, 그 과정에 조심스럽게 작은 소품들을 활용하며 매장의식을 상연한다.
게이와 트랜스젠더의 크루징 장소였고 지금도 밤이면 하나둘 모여 길가에 서성이는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과 남산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스킨십과 만남의 그림자들을 품어왔다. 명명되지 못한 모래와 잡초처럼 세어지지 못하거나 거부당한 이들은 인적 드문 도시의 자리를 축내는 변태로, 경계를 넘는 문란한 자들로 그려져 언제든 공권력의 단속과 대중의 눈총을 받기 쉽다. 그들이 드리운 자리는 언제고 슬럼가로 불리며 정비와 개발이 필요한 장소로 남는다.
서울 도심 언저리에 터를 잡고 활동해 온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오래전 활동했던 오준수를 작가는 불러냈다. 동시에 영국의 퀴어 영화감독 데릭 저먼(Derek Jarman)의 정원을 연결한다. 영국 남부 켄트주 던지니스의 황량한 땅 위에 선 오두막 한 채 주변으로 데릭 저먼은 바닷가의 폐자재를 가져다 배치하고 해안가에 자생하는 풀과 꽃을 식재했다. 울타리와 사람 키를 넘는 나무 한 그루 없는 장소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찾아 든다. 그러니까 공공장소의 빈자리, 사람들을 만나는 어둠 저편으로 쓰레기와 자생식물이 모여 있는 공간, 울타리가 없어 꾸준히 관리하는 중에도 무엇이든 찾아올 수 있는 정원이 놓인다. 둘을 연결하는 작업은 공공장소를 떠돌면서도 자리를 지키며 누군가를 기다렸을 익명의 성원을 정원으로 초대하며, 개인의 손길이 닿은 사유지를 공공장소 위에 포개어 초대받지 못한 이들을 환대한다. 이는 시민의 몫을 요구하며 도시 역사에 공적으로 기입되지 못한 이들을 공공장소에 출현시켜 광장의 질서에 개입하는 시도로도 접근할 수 있다.
두 지역을 오가며 이뤄지는 매장 행위는 상이한 시공을, 하지만 비슷한 성적 지향과 질병으로 묶인 이들의 생애와 생애 환경을,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을, 기억과 기억을 엮는다. 서로 연고 없는 두 사람은 각각 1998년과 1994년 HIV/AIDS로 세상을 떠난 동성애자라는 공통의 생애를 갖는다. 전 지구적 감염병이자 ‘동성애자 암’으로 낙인찍히기도 했던 HIV/AIDS의 맥락은 정원 위에 애도와 장례의 의미를 환기한다. 밤의 게토로 기능한 한국의 공원과 공원을 서성였을 누군가의 정원을 잇는 일종의 패치워크는 실제 바느질로도 이어진다. 그는 삼베에 금사로 자수를 놓는다. 그가 수놓는 것들이란 리서치한 자료에서 발췌한 문장을 도안한 형상이거나 소품들의 이미지다. 장소를 오가며 상대 지역의 소재들을 매장하는 의식적인 기록에 더해 수공업 기반의 노동을 통해 애도의 의미를 보태는 방식은, 시신을 덮는 수의를 연상시킴과 동시에, 과거 HIV/AIDS 위기가 극심했던 1985년 당시 미국의 HIV/AIDS 활동가 클리브 존스(Cleve Jones)가 네임 프로젝트(NAMES Project AIDS Memorial Quilt)를 기획하며 희생자 동료와 가족들을 통해 취합한 퀼트를, 당시 북아메리카 지역의 가정에서 행해 온 전통 공예인 퀼트를 이용해 에이즈로 희생된 이들의 기록과 얼굴을 패브릭으로 남긴 선례를 환기한다.
기억의 대상뿐 아니라 기억하는 방식까지도 서로 간 엮는 작업은 그저 꽃과 나무를 심는 단편적인 정원술 너머 정원술의 의미론적 활용을 예술 형식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원은 울타리로 경계 지은 공간에 식물을 선별하여 배치하고 인공의 풍경을 만들어 관리한다는 점에 어느 정도 보수적인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정원은 쇠하고 새롭게 피어나는 변화를 품지 않을 수 없다. 예기치 않은 동물이 찾아와 둥지를 틀거나 풀을 뭉갠다. 때론 경계 바깥에서 씨앗이 날아오고 잡초가 자란다. 날씨와 계절에 따라서도 풍경은 변한다. 정원술은 이러한 변화까지 창작과 감상의 요소로 삼는다. 이강승 작가는 정원술의 방법론을 화이트큐브로, 도서관과 박물관으로 호환하면서 제 형식들을 확장해 가는 기예를 펼친다. 정원사와 예술가가 한 데 포개어지면서도 예술로서 분기하는 부분에서 그는 무용한 소재를 수집했던 데릭 저먼의 정원술을 참조하면서도, 무용함의 자리에 민족지적 역사의 갈래를 포갠다. 희박한 역사의 흔적을 좇고, 이를 드러내 보이는 방법론을 고안하며 선적 시간과 공간의 질서에 개입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작가의 경험은, 인종과 젠더의 기울어진 역사로부터 조명되지 못했던 이를 조형하고 이를 다른 시공의 다른 누군가와 조우시킴으로써 시너지의 감수성을 끌어내는 배경이자 동기로 작동했을지 모른다.
정원의 감각적 노동은 예술 창작의 형식적 확장에 이어 큐레이토리얼 실천으로 이어진다. 자료와 드로잉, 소품들을 전시장에 배치하면서 저마다의 서사와 소재를 잇고 재구성한다. 연결은 무작위로 구성되기보다 특정 키워드를 누빔점 삼는다. HIV/AIDS와 퀴어, 누락된 역사와 오욕의 이미지들은 사적이고 사적으로만 취급되어 공론에 오르지 못한 얼굴과 이름들을 화이트큐브의 질서에 개입하는 시도로 이어진다. 특기할 것이 있다면 파편과 부분의 이미지를 수집하고 배치하는 행위는 망각된 기억뿐 아니라, 기억하려는 시도가 또한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는 점이다. 기억의 흔적을 애써 찾는 행위는 기억의 온전한 복원을 의도하며 재생하기보다 부분의 문장과 이미지, 파편의 사물을 연결하며 빈자리의 존재를 남긴다. 배치는 불완전하고 유동적이지만 그로부터 다양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품는다. 작가는 드로잉과 설치를 콜라주하여 관객들이 찾아와 각각의 의미를 연결하고 재발견하는 노고를 요청한다. 이는 확장된 장으로서 정원술의 비평적 해석에 영감을 주는 바우어새의 생리나 민병갈의 생애를 강렬하게 연결 지으면서, 동시에 던지니스의 프로스펙트 오두막을 가꾸며 말년을 보낸 데릭 저먼을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하면서도 그보다 오래전, 아비 바르부르크(Aby Warburg)가 미술사를 구축하며 출처와 소재를 가리지 않고 학제와 역사를 엮는 ‘아틀라스 므네모시네’의 방법론까지 정원술을 연결고리 삼아 미적으로 전유할 수 있는 단서를 남긴다. 불안정한 이들의 불완전한 기록은, 예술가의 손끝에서 역사가 놓쳐 온 취약한 기억의 면면을 잇는 현재적 실천으로 이어진다.
불완전성으로부터 연결을 넓히기
공간과 주변 환경을 리서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다듬는 작업을 요구하는 정원의 개념적 의미는, 줄곧 오욕의 이미지만 남은 이들의 자리를 소환하는 동기이자 명분이 된다. 그리고 정원술을 작업의 방법론으로 연결하는 시도는, 미술 공간의 큐레이션에 정원술의 기예뿐 아니라 해석을 확대할 가능성까지도 연다.
2019년 10월 합정지구의 전시 《퀴어락》에서는 언론에 비쳐온 불온한 얼굴과 기억되지 못한 공동체를 더듬는 시도가 좀 더 본격화된다. 여기서 그는 작가이지만 동시에 기획자이자 전시 감독의 역할을 일임한다. ‘퀴어’에 ‘역사’를 주요 키워드로 잇는 전시를 기획하면서 그는 작가와 각계의 동료들을 불렀다. (좀 더 정확하게는 불러냄으로써 그들은 동료의 자리를 점한다.) 드로잉 속 얼굴들이 애도와 기억의 대상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동료 작가와 활동가들이 기억하고 기리며 동시대적 의미를 부여한다.
그의 큐레이토리얼 실천이 본격적으로 돋보인 전시 또한 《퀴어락》이었다. 2019년 합정지구에서 진행한 전시에서 작가는 자료 수집과 배치 작업을 위해 참여 작가를 섭외하고 아카이브에 기반한 창작을 독려하는 장을 열었다. 패션디자이너 김세형(AJO), 아카이브 활동가이자 연구자인 루인, 예술가이자 무대연출가인 문상훈, 여기에 드래그 퍼포먼스도 하는 아장맨, 시각디자이너 이경민, 조각가 최하늘을 동료로 섭외하여 퀴어들의 역사를, 역사의 퀴어적 수집과 아카이브 실천을 선보인다. 미술 기획의 범주에 있지만, 동료 퀴어 작가를 모으고 그들에게 한국 퀴어 역사를 바탕으로 미션을 주고 그들의 제안을 전시하는 시도는 한시적인 공동체성을 점하는 효과 또한 낸다. 참여한 이들은 자료를 조사하면서 제 맥락을 투영한 형식을 재창안한다. 물론 이 바탕에는 영세한 환경에도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시공을 공공의 몫으로 요구해 온 30여 년의 성소수자 운동이 있다. 앞서 《Garden》이 오준수가 활동했던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도움이 있기에 가능했다면, 《퀴어락》은 퀴어아카이브 퀴어락과의 협업을 통해 그들의 자료를 바깥으로 꺼내 전시하거나 전시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거꾸로, 공동체를 추적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보존할 수 있는 장치들을 고안하는 것은 실제로 공동체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협업 작가들이 전시 크레딧에 등장하는 것은 그의 전시가 개인적인 성과이자 서사로 남을 수 없음을 환기한다. 미술 안팎을 연결하며 전시를 구성하는 작업은 재차 위기에 대응해 온 퀴어 커뮤니티를, 위기에 고립되지 않기 위해 서로를 찾고 위기 속에서 안전과 내일을 도모해 온 공동체의 윤곽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2021년 갤러리현대에서 열린 전시 《Briefly Gorgeous》는 과거를 온전히 소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아가 위기를 맞은 현재에 이르러 아카이브 실천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전염병의 창궐을 비롯한 사회의 재난이 드리우면 일상의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 확대된 풍경으로 펼쳐진다. 전파에 취약한 장소와 집단이 표적이 되고 공격 대상이 되며, 시민으로 세어지지 않는 이들은 예방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병 걸린 가지와 종들을 뿌리 뽑아야 하는 정원의 작업이 사람의 세계에 이르면 생사를 다투는 환경에 규율과 감금, 표적과 낙인을 찍는 일로 수행된다. 전염병의 비상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방역 당국과 언론은 특정 집단을 표적하여 그들의 안전불감증이 전염병을 확산하게 한다고 공격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구멍만 메꾸기 급급하지만, 정작 표적이 된 이들은 누구보다 취약하고 공동체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이다. 그렇게 2020년 코로나19로 이주민과 배달노동자가, 클럽의 게이들이 지탄받았다. 그리고 이듬해 초, 한국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연이은 자살 소식이 뉴스로 보도되었다.
질병이 관통하는 전염병의 재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시에서 그는 HIV/AIDS 위기 속에 사망하거나 생존한 예술가 중에서도 홍콩에서 태어나 1990년까지 뉴욕에서 생을 보내고 떠난 사진가 쳉퀑치(Tseng Kwong Chi)와 싱가포르계 안무가이자 발레 댄서로 1980년대 워싱턴 발레단에 명성을 가져다준 고추산(Goh Choo San) 등 아시안 유색인종 예술가들을 소환한다. 여기에 2021년 초 연달아 세상을 떠난 한국의 트랜스젠더 활동가이자 음악 교사였던 고(故) 김기홍과 성별정정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에 강제 전역당한 고(故) 변희수 하사의 드로잉을 나란히 놓는다. 그가 재조명하는 과정은 이성애 정상성뿐 아니라 백인 위주의 퀴어 역사관에 맞서는 시도로 설명되곤 하는데, 근간에는 이를 동시대에 상존하는 위기로 확장해 연결의 형식들을 조형해 내는 시도를 도모한다. 사진과 푸티지 영상, 세라믹과 캔버스 회화, 메모와 낙서, 꽃과 풀, 지도들은 결정적이거나 기념비적이기보다는 기억을 위해 단편적인 이미지와 텍스트, 오브제를 배치해 낸 신중함을 보여준다. 패치워크와 모자이크를 참조하는 재구성은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상이한 지역과 맥락에 서거나 스러진 이들을, 특수한 장소성을 견지하면서도 동시대의 인식과 감각적 요소들을 집약한다. 작가는 엘살바도르 출신 작가 베아트리스 코르테스(Beatriz Cortez)와 함께 동료들에게 ‘퀴어 미래’를 질문하면서 미래 완료형 시제로 문장 잇기(‘미래가 오면(When the future comes) … 할 거야.’)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역사의 궤도에 셈 되지 못한 이들의 희미한 기록과 기록을 찾고자 하는 이의 염원을 바탕으로 현 체제의 이상적 미래를 찢어내는 개인들의 갈망을 모아낸 집합적 주문일 터.
갤러리현대 지하 1층 전시장에는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당시 표적이 되었던 이태원 ‘킹 클럽’의 로고를 조립된 퍼즐 형태의 오브제로 세우고, 클럽 조명을 연출한 다음 동료 예술가들에게 받은 음악 플레이 리스트를 재생했다. 이처럼 지하에 조명과 미러볼, 오브제가 음악 속에 펼쳐지는 동안 1층에는 아카이브 자료들을 놓고 2층에는 드로잉한 얼굴들을 벽면 가득 배치했다. 즉, 전시장은 지하 클럽과 1층에 아카이브, 2층에 구체적 얼굴과 생애 흔적을 취합하는 드로잉과 사진, 소품들로 만든 작업을 보여주는데, 이는 한국의 퀴어 공간을 관찰하여 그 기능의 흐름을 갤러리 건물 구조에 재구성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기억과 공동체의 감각이 전시 공간으로 구현된 예로는 위의 전시보다 1년 앞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기획전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2020)가 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는 라운지 형태의 열람 공간을 연출했다. 오혜진 문학평론가가 선정한 서적은 (당시 오혜진 평론가의 설명을 따르면) ‘어떤 목적론적인 지성사의 제유나 퀴어 헤테로토피아의 페티시적 대상’으로 취급되거나 ‘퀴어적인 것에 대한 강박’적인 태도를 경계하면서도 자의적이고 유동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리며 공간이 한시적인 점거의 의미 또한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하지만 의도와 다르게 열린 형태의 공간은 전시장의 허브(hub)로 자리매김하며 주변 다른 작가들의 작업을 연결하는 인상을 줬다. 관객들은 서성이며 자료를 들춰보고 영상과 드로잉에 눈을 둔다. 배치한 선반과 가구는 어느 정도 닫힌 파티션의 기능과 동시에 둘의 경계를 흐리며 연결 짓는 울타리 형식을 갖춘다. 그 안팎으로 작가는 퀴어 특정적인 콘텐츠와 이미지를 수집하여 전시한다. 공적 장소에 사적인 역사와 사료들이 매듭을 만드는 장소의 성격은 특정 집단의 게토적 성격을 연상케 하면서도 사방으로 연결되는 도시 공간의 설계를 떠올리게 한다.
한데 그것은 이강승 작가가 같은 해 작업한 〈표지들(퀴어락)〉(2019/2020)에서 퀴어 관련 논문과 잡지, 단행본을 망라한 출판물들의 표지를 한 데 수집하여 스크랩북과 벽지로 만들어 전시장 가득 붙인 모습과는 다른 감상을 남기지 않을까.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모으고 망라한 듯한 작업은 기성 시장과 제도 안에서 주변적인 위상에 놓였음에도 어떻게든 제 언어와 문법을 만들어 온 이들의 기록과 연구를 종횡으로 펼쳐 놓으며 공간을 압도하는 인상을 준다. 그것은 양적인 스펙터클의 효과를 내지만, 한편으로는 ‘성소수자’라는 키워드이자 프레임에 걸쳐 있는 아카이브에 의존한다. 그것은 앞서 오혜진 평론가가 도서를 선정하며 남긴 노트의 방향과는 다르지 않은가. 다만 우리는 여기에 작업이 갖는 또 하나의 한계로서 전부를 아우를 수 없다는 점을 새길 필요가 있다. 불완전하며 끝없이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작업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배타적인 정체성의 박스를 견지하기보다, 무엇도 온전히 포집하여 의미 부여할 수 없음을 시인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하여 수집벽에 가까운 방법론이 아카이브 공간을 비롯한 전시 기획 실천에 이르면 선별과 편집의 방법론으로 부각되는데, 누구의 어떤 관점이 개입하거나 기준이 적용했다는 표식들은 빈자리에 집단의 의견을 구해다 넣고, 그 의견을 하나하나 살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구성하는 방식을 껴 넣으며 서로를 보완한다. 기억과 보존의 불완전성은 공동체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이자 연결의 근간이 되는 셈이다.
불온한 기억과 난잡한 미래
공적인 것과 사적인 생애의 기록을 포개고, 과거의 인물과 생존하는 주체를, 생과 사의 기억을 한 장소에 등장시킨다. 서로 다른 문법과 가치를 갖는 소재들을 나란히 배치하고, 발굴한 자료를 재해석하거나 새로운 문법을 제안하는 작업은 타인의 삶이 가려지는 부당한 맥락을 따라가며 부당함에 여과된 이들을 출현시킨다.
하지만 드러남의 미덕은 노출의 우려가 되기도 한다. 미술 공간에 소개된 삶과 얼굴들은 재현 대상이자 미적 표상으로 표백되기 쉽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금 짓궂은 혐의가 있을 수 있다. 여전히 그가 길어낸 삶의 흔적들, 기억에 실패한 표상들은 그가 길어내고자 했던 시간과 얼굴들을 ‘타자의 삶’이라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억하고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을까. 혹은 반대로, 타자를 대상으로 삼는 작업은 쉽게 존중과 배려의 자세를 남기지 않는가. 다시 말해 취약한 기록과 대상에 대한 존중의 태도는 발굴한 기억과 인물, 자료들을 전시장에 내놓으며 공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미덕을 확보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짐짓 누군가를 ‘타자’로 포획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대상으로 삼는 존재들에 개입하고 그들의 시간을 예술의 형식으로 갱신하는데 머무름을 견지하는 명분으로 작동한다. 말인즉 타자를 대하는 작업에는 드러내 보이는 이와 드러나는 것들이 동등한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는 본질적인 딜레마가 놓인다. 타인의 몸, 타인의 감각적 표상과 기록, 그들의 생과 사가 ‘잊히고’ ‘망각된’ 영역으로 놓일 때, 이들은 재차 ‘발견되어야 하고’ ‘이름 붙여져야 하는’ 타자의 프레임에 사로잡힌다. 일방적인 참조와 재현, 그리고 존중과 배려의 자세는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주체와 타자를 의심 없이 분리한다는 점에 공통적이다. 하여 아카이브 대상으로서 타자의 자리는, 이를 수집하고 편집하며 재구성해서 미술 공간에 올리는 주체의 위상을 다시 한번 소환한다. 이들은 반성할지언정 드러나지 않은 소재를 드러내 보이고 다시 배치하는 반성적 주체로서 예술가의 위치를 필연적으로 견지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 주체는 어떤 파상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더불어 예술가의 호출을 받고 등장하는 생애와 몸들은 어떻게 과거의 오욕으로부터 명예를 회복하는 데 나아가 제 불온한 가지와 욕망을 지속할 수 있을까.
질문에 직접 답하기에 앞서, 잠시 드로잉으로 시선을 옮겨 우회해보자. 섬세하게 명암과 톤을 맞춰가는 연필(흑연) 드로잉은 인물뿐 아니라 신문 기사와 지역의 초목, 자갈 등 소재를 망라한다. 글자 하나와 종이의 구김 자국, 돌멩이의 구멍까지 그는 쉽사리 놓치지 않는다. 다만 그의 필촉은 확신의 선으로 묘사하기보다 이리저리 화면을 서성이듯 얼룩처럼 형상을 만들고 뭉개는가 하면, 뭉개는 궤적이 형상을 출현시킨다. 더러 인물들은 지워낸 채로 그려지기도 한다. 지워내고 뭉갠 듯한 자국은 연기 또는 얼룩처럼 남아 인물의 자리를 증발시킨 모습으로 출현시킨다. 이는 그가 차마 담지 못한 시간에 대한 치밀한 묘사이자 타인의 얼굴을 유령의 자리로 남기며 포획되기를 애당초 거부하는 제스처이기도 할 터. 그는 손에 쥔 기록을 샅샅이 그리면서도 그것이 온전히 담을 수 없음을 시인하듯 빈자리를 남기거나 모서리를 불에 태워 그을음을 내기도 한다. 여기까지 설명한다면 그의 작업은 타인의 얼굴을 포착할 수 없음을 그리는 전형적인 작업으로 갈음하기 쉽다.
그의 드로잉은 앞서 언급한 쳉퀑치의 사진 시리즈 <East Meets West>(1979-1989) 또한 포함한다. 그가 생전 행한 작업 방식은 이강승의 드로잉을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단서이다. 선글라스를 끼고 인민복을 입은 채 미국과 유럽의 상징적이고 전형적인 풍경 앞에서 손에 쥔 버튼을 눌러 촬영한 기록은, 아시안을 보는 시선이 인식하는 스테레오타입을 그대로 수행했음을 전한다. 그의 기록은 풍경 속에 있으면서 고립된 모습을 프레임에 가두고, 그럼에도 제 눈빛을 감추며 포착되기를 거부하는 시선의 긴장과 경합을 보여준다. 이강승의 경우, 당신이 남긴 사진을 그리면서 사진 속 당신의 얼굴을 그대로 그려 내기보다 지우고 차라리 지워진 자리를 상정하여 그리기를 택한다. 처절하리만큼 치밀하게 묘사한 작가의 노고는 온전한 소환과 복원이 불가능한 기억의 열망을 샅샅이 남기고자 하는 충동이 드로잉의 동기로 작동하고 있음을 가늠케 한다. 여기에 지워내면서 자리를 남겨두는 방식은 유색인종을 바라보는 프레임으로부터 거리를 두며 스스로를 시각화하는 형식을 고안해 온 쳉퀑치의 부단한 시도에 대해 동시대 관점에서 비평적으로 참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것은 HIV/AIDS로 세상을 떠난 예술가를 기억하면서, 그가 생전에 취한 관점에 대해 1세계를 살아낸 동아시아권 예술가가 택할 법한 전형성으로 포획될 우려를 고려한 형식의 묘(妙)라고 접근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강승이 오준수와 김기홍, 변희수,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과거 퀴어들의 얼굴을 전면에 드러내는 상반된 재현 방식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드러냄으로써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들과, 자신을 가두는 인종과 국적, 젠더 프레임에서 자신을 지워내는 주체의 위상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드러내고 드러내지 않는 선택은 지역의 정치적인 상황과 대상으로서 어떤 타자가 재현되는지, 그가 생전에 표명한 생애적 태도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사회적 배경 아래 형성되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음을 밝혀 둘 필요가 있다. 하위주체로 구분 짓고 스테레오타입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해 온 재현의 권력에 저항해 온 이들의 저편에는, 과잉 대표성 아래 호명되지 못한 이들이 필사적으로 남기고자 했던 이름과 얼굴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대를 살아낸 이들의 환경을 면밀하게 살피며 고안해 나가는 재현의 방법은, 먼저 세상을 살아내거나 떠난 타인을 대상으로만 두기보다, 당대의 맥락을 살피면서 동시대의 관점으로 재해석할 여지를 남김으로써 관계성을 지속해서 재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여 그는 동료 작가와 문필가, 활동가 등을 불러 비평적 아카이브 실천을 시도하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상호연결을 꾀하는 데에서 나아가, 지난 세대의 예술가들까지 동시대의 동료로 포함하면서 그들이 생전 행한 예술의 방법론을 호출하여 현재적으로 갱신하고 새로이 의미 부여하기에 이른다.
작가가 보여준 콜라주적인 배치와 드로잉의 방법론이 최근에는 몸짓으로, 무대로, 화면으로 펼쳐진다. 잊히기 쉬운 몸의 율동을 입은 이는 과거의 동세를 취하며 동시대 몸짓을 창안한다. 작가는 에이즈로 떠난 중국계 작가 마틴 웡(Martin Wong)이 사용했던 미국 수어를 폰트로 디자인하여 문장마다 활용하는가 하면, 〈손의 심장〉(2023)에서는 필리핀계 트랜스젠더/논바이어리 안무가 조슈아 세라핀(Joshua Serafin)이 고추산의 1981년 안무 「Configurations」를 해체하여 서울에서 활동하는 트랜스젠더 뮤지션 키라라(KIRARA)의 음악에 무대를 만든다. 퀴어 예술가의 몸짓을 기억하고 이를 취하면서도 지금 당신의 불온한 몸짓과 시선을 표현해 달라는 주문은 그저 그가 예술가 주체로서 과거를 취하면서도 구분 짓기만 할 수는 없다는, 좀 더 급진적인 제스처를 꾀하려는 포석인지 모른다. 《올해의 작가상 2023》에 처음 선보인 〈라자로〉(2023)는 참았던 호흡을 터뜨리듯 참조와 네트워크를 동시다발로 수행한다. 고추산의 오리지널 발레 〈미지의 영토〉를 안무가 정다은이 재창안하는데, 두 남자 무용수는 브라질의 개념미술가 호세 레오닐슨(José Leonilson)의 유작으로 알려진 〈라자로〉(1993)를 본떠 두 개의 드레스셔츠가 위아래로 꿰매진 의상을 입고 벗으며 서로 간 교감을 표현한다. 퀴어 치카노 작가 사무엘 로드리게스(Samuel Rodriguez)의 1998년 실험 영상 〈Your Denim Shirt〉에 쓰인 텍스트를 등장시키고, 마틴 웡이 회화에 고안한 수어를 폰트로 가공하여 이를 표기하면서 키라라의 음악에 LA에서 활동하는 영화감독 네이슨 머큐리 킴(Nathan Mercury Kim) 등과 협업하는 공정은, 과거와 현재의 구분 짓기와 동시대 예술가들의 협업을 하나의 무대로 압축한 양태를 띤다. 이는 향후 그의 작업이 협업자와 레퍼런스 간의 상호 참조와 전유까지도 시도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그것은 이강승 작가의 드로잉에서 지워진 채로 등장하는 얼굴과 몸의 자국을, 그로부터 다시 모습을 드리우는 얼굴과 몸의 윤곽들을 살피도록 한다.
위의 무대들이 복잡한 레퍼런스와 공정을 함의하면서 관객에게 지적 감상의 노력을 요청한다면, 그의 오브제 작업은 좀 더 직관적으로 상이한 맥락이 조우하는 과정을 물성으로 드러낸다. 단적으로 이러한 면모는 도예 작업에서 집약된 모습을 보인다. 각기 다른 연고지의 흙을 모아 반죽하고 가마에 구워 화분을 만든 뒤 그 안에 다른 흙을 채우고 기억하는 누군가가 키웠던 화초를 옮겨 심는다. 오브제는 상이한 참조점을 교차하면서도, 질료마다 그 자체 기억의 지표로 기능하는바, 관객들은 캡션과 도예 오브제를 번갈아 보면서 기억을 음미하고 서로 연결 지을 수 있다. 도예의 방법론은 수집과 콜라주 너머 소재와 질료를 매시업 하는 방법론으로, 과거를 참조하고 오마주하면서도 동시대 생존작가들과 협업을 엮어내며 몸짓과 리듬을 재차 생성하는 무대로 네트워크의 장을 연다.
결(結)
작업의 참조 대상과 협업의 관계를 넓히고 둘 사이 경계를 가로지르며 갱신해 나가는 여정은 예술가 주체 또한 타인의 시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그 또한 쇠해가는 불완전한 위상에 있음을, 하여 그 또한 타인으로 포획되고 점거해야만 살아낼 수 있음을 환기한다. 그는 2023년 《올해의 작가상 2023》 전시 제목으로 미국 레즈비언 시인 파멜라 스니드(Pamela Sneed)의 시구 ‘누가 우리를 돌보는 이들을 보살피게 될까’(Who will care for our caretakers)를 제시한다. 1980-1990년대 에이즈 위기로 동료들을 보내면서 썼던 이 문장은, 애도하는 지금의 생존 주체의 관점 너머 지금 여기서 애도하는 주체 또한 언제고 손상당하며 생을 마감할 타인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한다. 그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기억 너머 생을 살아낸 공동의 삶을, 상호적 돌봄을, 돌봄 체제와 돌봄 산업을 초과하는 문란한 보살핌을, 배타적인 가족 모델을 초과하며 빈곤과 노화를 둘러싼 생의 불안을 함께 나눌 사회적 돌봄의 구조를 재고하는 당대의 과제를 통과한다.
《올해의 작가상 2023》 인터뷰에서 그는 ‘전달자’를 자처한다고 밝혔다. 어느 정도 한정을 두는 표현은, 그가 상이한 시간과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를 익혀야 하고 살 만한 삶을 표명하고 확보하기 위해 어떤 장치들이 필요한가를 살필 것을 요청한다. 그것은 기록과 자료를 엮고 전시를 기획하는 데서 나아가 과거로부터 의미 부여되지 못한 몸짓을 재차 고안하여 무대 위에 출현시키는 연출의 위치를 점하도록 한다. 나아가 동시대 협업자와 동료들 간에도 서로 간 참조와 조율을 바탕으로 공동의 창작이 계속해서 토론과 담론을 만들어낼 장을 제시할 것을 요청받는다. 이는 기억하는 일과 시간을 열어내는 작업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조금 눈치가 빠른 독자라면 그가 이토록 발굴하고 연결 짓고자 하는 행위가 퀴어 시간성으로 줄곧 설명되어 왔지만, 또한 그것이 민주주의의 실천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지각할 수 있다.
이강승은 오욕의 이미지를 전면에 내걸었다. 환락과 문란으로 설명된 표제에서 줄곧 ‘발각’되거나 ‘포착’되어 ‘르포’의 대상으로 증발하기 쉬웠던 이들은, 차라리 플래시의 섬광에 제 모습을 출현시킨다. 그가 전시장 전면에 내건 이미지는 폭력적인 바깥의 시선에도 어두운 밤의 장소에서 바득바득 불온하게 장식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기념하듯 남긴 모습이었다. 물론 이들이 뽐내고자 했던 장식 자체부터 사회는 무해하게 인식할 리 없었을 것이다. 변태로, 문란함으로, 하여 양지에는 나오지 말아야 하는 이들로 치부되며 언제고 단속의 대상이 되고 가십으로 수탈되는 과정에서도 이들은 끝끝내 자신의 표현과 연출들을 양보하지 않으며 화면에 스스로를 붙박아 둔다. 이를 고투와 열락, 고립 속에서 구사한 연약한 연결의 희망이자 신호라고, 저마다 가꿔왔을 정원술의 유산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 아니다. 기억과 수집을 바탕으로 하는 작업을 급진적인 돌봄의 가능성으로 밀어붙이는 시도는, 애도하고, 애도를 위해 발굴하며, 온전한 기억이 어려운 이들처럼 나의 작업 역시 타인의 자취에 의존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협업의 태도로 이어진다. 동료를 부르고 공동체의 프로그램들을 재생산하는 시도를 고안하는 작업은 이강승 작가가 지금까지 견지하며 지속해 왔을 예술의 효능은 아닐까.
닿지 못한 당신의 체온을 전달하는 불가능한 시도들은 주체로서 작가의 역량을 초과하지만, 동시에 작가를 통해 연결된다. 그는 도래할 시간, 열어갈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고 고안하며, 그 과정에 동료를 찾고 연결을 이어간다. 사려 깊게 수집하고 재배치한 전시장을 거닐면서, 그동안 고안해 온 미적 스킨십의 형식들을 살피면서, 지금의 시간은 누구에게 어떻게 열리거나 닫힐 것인가를 생각한다.
Critic 2
움직임을 불어넣다
케이비어 문
공동체, 협업, 지속적 변형은 한국에서 태어나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 중인 작가 이강승의 작업에서 중심의 자리를 지켜왔다. 그는 10년 넘게 공공 및 개인 아카이브를 발굴하여 세상을 떠난 퀴어 예술가, 작가, 무용가, 게이 및 트랜스 인권운동가들의 작업과 유산을 되살리는 연구 조사 기반의 작업을 발전시켰다. 국경을 초월하는 다양한 역사적 인물 중에는 오늘날에도 잘 알려진 사람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잊힌 이들도 있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 이강승은 아카이브의 관리자는 물론 기록에 담긴 역사에 관여했던 생존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종이에 흑연 드로잉, 삼베에 자수, 발견된 오브제 콜라주 등 이강승은 작품에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는 또한 자신이 속한 퀴어 공동체의 예술가 및 문화생산자와도 협업하여, 진행형의 개방적인 미술 프로젝트, 그룹 전시회, 영상 작업을 진행해 왔다.
공동체 그리고 협업은 <무제(아트스피크?)>(2014-진행 중) 같은 초기 작품부터 작업의 구조를 이루었다. ‘양식 있는 길잡이’라 소개된 로버트 앳킨스(Robert Atkins)의 저서 『아트스피크: 1945년부터 현재까지, 동시대의 개념, 운동, 전문어 안내서』는 여러 미술운동과 동시대 미술용어를 정의한 참고서로, 주요 사건을 연도별로 ‘세계사’ 또는 ‘미술사’로 분류해 넣은 연대표도 들어 있다. 이강승은 <무제(아트스피크?)>를 위해 로스앤젤레스와 칼아츠(이강승은 이곳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 중 20명에게 협업을 청했다. 이강승은 그들에게 『아트스피크』에 실린 연대표에서 각자의 생년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손으로 그린 확대본을 준 다음, ‘편집’을 부탁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나이, 젠더, 인종, 성적 지향, 문화적 배경 등 면면이 다양했다.1 참가자들은 페이지를 두른 넉넉한 여백 안에 저마다 『아트스피크』에 누락된 작품, 뮤지션, 영화감독 등에 관한 주석, 일화, 사건, 드로잉을 채워 넣었다. 그렇게 모인 편집본들은 당시 이강승의 국가와 세대를 넘는 공동체가 지닌 관심사와 개개인의 배경을 반영한 다중의 역사 서사를 도입함으로써, 『아트스피크』 판본의 역사에 내재한 남성중심적이고 이성애적이며 식민지적인 관점을 흔든다.2
2019년 즈음 시작된 <하비> 프로젝트에서 분명히 드러나듯 최근 몇 년간 이강승의 공동체적 접근은 역동성과 개방성을 한층 더했다. 이 프로젝트의 근원에는 동료 미술가이자 친구인 줄리 톨렌티노(Julie Tolentino)의 작품 <흙 속의 아카이브>(2019-진행 중)이 있었다. 작품은 톨렌티노가 작게 잘라준 선인장 자구를 길러 키운 크리스마스 선인장 화분으로 이뤄져 있다. 선인장 자구는 샌프란시스코의 시정감독관이었던 하비 밀크(Harvey Milk, 1930-1978)가 키우던 선인장 ‘모본’에서 잘라낸 것이다.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최초의 선출직 공직자 중 한 사람이었던 하비 밀크는 취임한 지 1년도 못 되어 암살당하는 비극을 맞았다. 톨렌티노의 선인장은 퀴어 운동가이자 아키비스트인 친구가 간이 인쇄물을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내준 것이다. 친구의 선인장도 받은 것으로, 하비 밀크의 옛 룸메이트 중 한 사람(그는 수년에 걸쳐 여러 친구에게 선인장을 잘라 주었다)에게 나눔 받았다.3 톨렌티노의 작품을 본 이강승은 하비 밀크가 세상을 떠나고 40년 동안 세대에 걸쳐 사람들이 그의 식물을 돌보고 번식시켰다는 사실에 감동하였다.4 2019년부터 이강승은 톨렌티노가 ‘하비’ 선인장을 널리 퍼뜨릴 수 있게 도와주었고, 두 사람의 퀴어 친구들이 맡아 키운 식물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에 이강승은 직접 본인의 작품을 만들었다. <하비> 프로젝트는 하비 밀크에 관한 기억을 살리고 오늘에 지키려는 공동의 열망을 중심으로 공동체 의식을 북돋는 돌봄과 선물의 행위를 만들어 낸다.
지속적 변형은 <하비> 프로젝트—선인장 자구와 소유자가 세대를 달리하면서 말 그대로 형태가 변한다—는 물론이고 더 넓게 이강승의 예술 작업에서도 핵심이다. 이강승은 작품에서 독창적인 소재를 썼노라 주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작업 양식을 ‘전유’의 측면에서 바라본다.5 그는 아카이브, 서적, 특별 장소에서 특정한 역사와 상징적 울림이 깃든 이미지, 오브제, 유기체 및 기타 재료를 발견하고 수집한다. 본래의 의미를 변형하는 방식으로 그는 원재료에 새로운 맥락을 부여하고 때로는 다른 매체—이 글에서 논하듯 특히 드로잉, 자수, 콜라주, 비디오—로 번역한다. 이렇게 이강승의 작품들은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며, 기억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할 뿐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
드로잉: 존재와 부재
이강승의 여러 흑연 드로잉 작품은 로스앤젤레스 커먼웰스 앤드 카운슬에서 열린 《떠남 없는 부재》(2016-2017)에서 선보인 것처럼 짧게 막을 내린 퀴어들의 삶을 추모한다. 전시에서 이강승은 1970년대와 1980년대, 특히 뉴욕의 게이 라이프를 담은 사진을 정교하게 다시 그린 흑연 드로잉 연작을 선보였다.6 작품이 원자료로 삼은 사진으로는 로버트 메이플소프(Robert Mapplethorpe)의 자화상, 피터 후자(Peter Hujar)가 찍은 데이비드 워나로위츠(David Wojnarowicz)의 초상, 피터 벨라미(Peter Bellamy)가 촬영한 마틴 웡(Martin Wong)의 초상을 비롯해, 앨빈 밸트롭(Alvin Baltrop)과 레너드 핑크(Leonard Fink)가 허드슨강 부두에서 찍은 게이 크루징 장면 등이 있다. 이강승의 드로잉은 사진을 충실하게 모사한다. 단 한 가지만 제외하고 말이다. 사람의 형상은 마치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듯 흐릿하고 알아볼 수가 없다. 인물 지움은 한편으로 에이즈가 뉴욕은 물론 전 세계 도시의 퀴어 공동체에 몰고 온 충격적인 절망과 유행병의 존재를 처음에는 인정하려 들지 않던 정치권과 정부의 태도를 암시한다. 미국만 놓고 보아도 1990년대 말까지 수십만 명이 에이즈와 그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었고, 메이플소프, 워나로위츠, 후자, 웡, 핑크도 그 숫자에 들어 있다. 그런 이유로 이강승의 드로잉을 미술사학자 이강훈이 말한 대로 상실에 대한 비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7 또 한편으로 인물 지움은 사진 이미지에 대한 이강승의 예술적 개입을, 즉 그가 앞서 세대의 예술가들과 나누는 열린 대화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개념적 촉진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강승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나의 작품이 앞서 존재했으나 드러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지운 현실에 의문을 던지고, 세대 간의 연결과 돌봄이 담긴 공간에 관한 대화를 불러오며, 비가시성을 가능성으로 다시금 상상하는 초대가 되었으면 한다.”8 이런 방식으로 그의 드로잉을 존재에 대한 긍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노고와 시간을 들인 이강승의 드로잉 방법론 덕분에 관객은 작품을 더욱 오래 천천히 감상하게 된다. <무제(오준수의 편지)>(2018)처럼 대형 작품일 경우 더욱 그렇다. <떠남 없는 부재> 연작처럼 사진을 그린 이강승의 드로잉 대부분이 32 × 28 cm의 아담한 크기이지만, <무제(오준수의 편지)>는 160 × 120 cm로 거의 다섯 배나 크다. 크게 확대된 덕분에 작가이자 시인인 오준수(1964-1998)가 쓴 편지 내용이 어렵지 않게 읽힌다. 편지에는 그가 조용필의 노래를 듣다가 에이즈로 죽는 상상을 하며 느낀 외로움이 통렬하게 담겨 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중요하지 않은 양 잊힐까 몹시 두려워한다. 오준수는 한국에서 에이즈 양성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최초의 게이 남성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가명으로 에이즈 환자로서의 경험을 담은 회고록을 냈고9 (이후 에이즈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설립에 일조했던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생애 마지막까지 일했다. 이강승의 드로잉을 보면 고르지 않은 색조로 나타낸 종이의 질감부터 섬세하게 표현된 종이의 구김까지, 편지의 물리적 특징이 잘 재현되어 있다. 오준수는 편지를 한 번 접어 친구에게 보냈다. 대형 크기의 드로잉은 편지에 담긴 강렬한 개인적 소재는 물론 서신 교환이 상징하는 우정을 기념비화한다. 작품이 전시될 때면, 그 기념비적인 규모 덕분에 그림은 한 번에 다수의 관객—대중—에게 말을 걸어 오준수의 삶과 작업이 실제로 잊히지 않도록 힘을 보탠다.
삼베에 금사 자수: 죽음과 영원
2017년 이후로 이강승은 애도와 덧없음을 일깨우는 한국의 전통 삼베 천에 금사 자수 작업을 해왔다. 삼으로 만든 천인 삼베는 한국에서 장례식,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1950년대 전까지 삼베는 농민과 중산층 가정의 여름옷은 물론 상주와 고인의 상복 소재로 널리 쓰였다. 하지만 1950년대 이후 한국전쟁이 끝나고 서구 스타일의 옷이 인기를 더했고, 삼베는 이제 매장 의례에 주로 쓰인다. 삼베는 면이나 비단보다 더 빨리 분해되기 때문에, 특히 수의에 적합하다고 여겨진다.10 노동집약적이고 고도의 숙련을 요구하는 삼베 직조 과정은 한국에서 주로 농촌 지역의 여성 노인 세대의 손으로 이뤄진다. 농촌의 젊은 여성 세대가 더 나은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난 데다 수입산 대량생산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전통 삼베 가격은 엄두도 못 낼 수준이 되었고, 장래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 보인다.
한국의 전통 삼베처럼 이강승이 자수에 쓴 금사에도 쇠퇴의 기미가 엿보인다. 이강승이 쓴 실은 직물의 고장으로 오랜 명성의 교토 니시진 지구에서 1910년대와 1920년대 초에 생산된 24캐럿 금사이다. 금사는 순금박 띠로 명주실을 감싸 만드는데, 이제는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사장된 기법이다. 이 특정한 종류의 니시진 금사는 전 세계에 한정된 양만 남아 있다. 비율은 낮아질지언정 아직 생산은 되는 한국의 전통 삼베와는 달리, 이 역사적 실은 어느 시점에서 공급이 끊기고 말 것이다.
이강승의 삼베 위 금사 자수의 기저에 상실—그리고 상실의 예견—이 깔려 있지만, 작품에는 존경도 담겨 있다. 기독교나 불교 같은 종교 분야에서 황금은 전통적으로 특히 신성함, 순수성을 표하는 데 쓰였다.11 <무제(커버)>(2018)에서처럼, 이강승의 손에서 황금사는 자수의 대상을 성상화한다. <무제(커버)>의 본래 이미지는 오준수의 추모집 표지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선 양복 차림의 말쑥한 두 남성을 그린 선화를 본다. 한 남자가 다정하게 손을 다른 이의 어깨 위에 올리고 한쪽 발을 상대의 다리에 닿도록 뻗은 모습이다. 추모집 표지에서는 이미지가 “오준수를 추모함”이라는 제목 옆에 배치되었기에, 오준수가 긴밀히 참여하였던 친구사이(말 그대로 ‘친구들 사이’라는 뜻이다)와 오준수 자신을 나타내는 듯하다. 이강승의 자수에는 이미지를 특정한 해석으로 이끌 설명이 없다. 이미지는 자유롭게 흘러가 두 남성의 애정의 몸짓을 그린 충만한 이미지가, 호모소셜과 호모섹슈얼 사이를 오가는 이미지가 된다. 금사와 삼베라는 재료로 재맥락화된 이 다의적인 남성 친밀의 이미지는 빛나는 금으로 그려져 영원해지지만, 자수의 바탕인 삼베는 유기물이어서 적절한 조건 아래 관리하지 못하면 바스러져 버릴지도 모른다.
콜라주: 연결과 재구성
이강승의 여러 작품에서 콜라주는 아예 다른 인물과 장소와 역사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어, 알려진 존재와 눈에 띄지 않는 존재를 연결 지어 모두가 볼 수 있게 가시성을 넓히는 데 활용된다. 콜라주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사례를 서울의 원앤제이 갤러리에서 열린 중요 전시인 《Garden》(2018)에서 찾을 수 있다.12 전시는 서로 만난 적 없는 두 명의 인물인 오준수와 영국의 예술가이자 영화감독인 데렉 저먼(1942-1994)의 관련 이미지와 오브제를 한데 모은다.13 HIV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오준수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낙인에 직면하였고 상대적으로 무명인 채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쓴 에세이와 시 다수는 사후에 그의 친구와 동료들의 노력으로 출간되었다. 반면, 퀴어 섹슈얼리티를 펑크 감수성과 결합하여 재현한 저먼의 아방가르드 시네마는 생전에도 사후에도 비평적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게이 인권운동가였던 두 사람은 몇 년의 차이를 두고 에이즈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Garden》을 위해 이강승은 영국 켄트주의 던지니스로 향했다. 저먼이 생의 마지막을 보냈던 집과 정원인 프로스펙트 오두막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저먼은 자신이 HIV 양성임을 안 직후 이곳을 발견하고 매입했는데, 생애 만년을 이곳에서 정원을 가꾸며 깊은 위안을 얻었다.14 서울에서 이강승은 한국퀴어아카이브를 찾아 오준수의 삶과 작업을 들여다보는 연구 조사를 진행했고 오준수의 친구와 친구사이 동료와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Garden》 전반에 걸쳐, 이강승은 세상의 다른 두 장소에서 수집한 출판물, 사진, 개인 물품, 꽃, 돌, 흙을 배열하여, 데렉 저먼과 오준수가 남긴 서로 균등하지는 않았던 유산을 함께 엮어, 두 사람이 각각 나란히 펼친 투쟁과 창조와 저항을 겹쳐 놓으며 추모한다.
이강승의 《Garden》 전체를 콜라주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전시 초입에 자리한 <무제(테이블)>(2018)은 전시의 전제와 매체 활용을 대표하는 작품이라 하겠다. 사각의 나무 탁자 위아래로 오브제들이 배열되어 있다. 프로스펙트 오두막과 더불어 게이 공동체 역사와 연관된 서울의 장소를 촬영한 사진들, 오준수가 남긴 일상 메모의 복제본 묶음, 오준수의 추모 기사 면을 펼친 한국 최초의 게이 레즈비언 잡지 중 하나인 『버디』 한 권, 오준수의 일상과 장례식 모습을 담은 스냅 사진들, 두 장짜리 편지를 펼쳐 보이는 오준수의 글 모음 폴더 그리고 필명으로 낸 오준수의 회고록 한 권과 그의 추모집 한 부가 놓였다. 테이블 중간에는 삼베로 된 장식천이 깔려 있는데, 잎이 난 잔가지 위로 하트가 달린 모티프를 금사로 수놓았다. (모티프는 이강승이 프로스펙트 오두막에서 본 커튼에서 유래한 것으로, 《Garden》 전시에서 선보인 프린트 <무제(프로스펙트 오두막의 커튼)>(2018)이 이를 담고 있다) 삼베 장식천의 위와 옆으로 저먼의 정원에서 가져온 녹슨 쇠사슬이 있고, 조약돌이 짝을 지어 혹은 나란히 무리 지어 놓였다. 두 존재 간의 또는 한 집단 간의 친밀한 유대를 은유하는 이미지이다. 캘리포니아 클레이에 던지니스와 서울 탑골공원 및 남산공원—오준수의 글에 언급된 유명한 게이 크루징 장소들이다—의 흙을 섞어 만든 무광의 도자기 한 점이 탁자 가운데 놓여 있는데, 전시 중에 식물을 새롭게 채워 놓게 되어 있다. 탁자 위 금사 한 줄에 매달린 것은 오준수의 묵주 반지이다. (오준수도 저먼처럼 가톨릭 신자로 자랐다.)
오준수가 쓴 두 장짜리 편지는 가슴을 때리는 감정적 충격을 안긴다. (한 장은 앞서 언급한 <무제(오준수의 편지)>로 그려졌다.) 편지에서 오준수는 깊은 낭만적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슬픔과 누구에게도 의미 있는 존재로 남지 못할까 싶은 두려움을 이야기한다. 이강승은 더 많은 사람에게 오준수의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먼의 이야기를 이용한 것에 관해 이야기한 바 있다.15 <무제(테이블)>처럼 《Garden》의 전시작들도 오준수의 유산을 재구성하기 위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결합한다. 다만 오준수를 대체로 잊힌 인물로 바라보는 대신, <무제(테이블)>은 오준수라는 인물의 역사적 중요성과 어떻게 그가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로 남아 왔는가를 보여준다. 그의 동료들이 보관해 오다가 이번 전시를 위해 빌려준 출판물, 기념물, 기타 물건들이 증명하듯 말이다. 저먼이 척박한 풍경에 무성한 정원을 탄생시켰듯, 이강승의 《Garden》 전시작들도 오준수만의 유산이 커가도록 힘을 보탠다.16
<무제(테이블)>이 두 게이 남성의 유산을 연결하기 위해 오브제들을 한데 모은다면, 갤러리현대에서 열린 《Briefly Gorgeous》 전시의 <무제 1>, <무제 2>, <무제 3> 연작(2021)은 지난 세기부터 오늘날까지 더욱 확장하고 뻗어가는 퀴어 욕망의 역사와 그 다각적인 표명 양상을 콜라주 한다. 잡다한 이미지와 물건들이 세 장의 대형 나무 패널에 모여 있다. 저먼의 프로스펙트 오두막 사진 한 장, 이강승의 3채널 비디오 <Garden>(2018)의 스틸 이미지 한 장, 앤디 워홀(Andy Warhol)의 <꽃을 든 손>(1957)을 색조 반전하여 그린 흑연 드로잉 한 점,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트랜스젠더 추모정원 사진 한 장, 장 콕토(Jean Cocteau)가 그린 장 주네(Jean Genet)의 소설 『브레스트의 논쟁』(1947)의 삽화를 다시 그린 흑연 드로잉 한 점, “우리는 아시아인 게이이고 자랑스럽다”고 적힌 큼지막한 현수막을 든 남자들을 담은 사진, 피어스 푸시라는 이름의 뉴욕의 퀴어 여성 콜렉티브가 만든 <For the Records>(2013-진행 중) 연작 중 한 점을 그린 흑연 및 수채 드로잉, 제임스 볼드윈(James Baldwin)의 초상 사진 흑연 드로잉을 비롯해, 물건으로는 1850년대의 깃털들, 진주, 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요소가 한데 모여 수 세대에 걸친 퀴어 문화생산자들의 미학 담론, 트랜스 및 동성애자 혐오 폭력의 비극적인 역사, 풀뿌리 운동으로 조직된 여러 퀴어 활동가 집단을 표현한다. 이강승은 다른 예술가의 작품을 다시 그린 흑연 드로잉과 본인의 소형 프린트 작품을 연작에 끼워 넣었는데, 이는 그 문화적, 역사적 미시 세계 속에 자신의 존재를 미묘하게 통합하였음을 나타낸다. 『아트스피크』 같은 주류 출판물이 대표하듯 관습적으로 ‘미술사’와 ‘세계사’를 구분하여 가르치지만, 이강승의 콜라주 연작 <무제 1>, <무제 2>, <무제 3>은 미술사가 곧 세계사임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개념을 허물어뜨린다.
비디오: 욕망과 표출
상실과 갈망과 에로티시즘이 어린 욕망이 이강승의 최신 연작 <손의 심장>(2023)에 흐른다. 싱가포르 태생의 무용가이자 안무가인 고추산(1948-1987)의 삶과 작업에 바탕을 둔 작품이다. 고추산은 어린 나이에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고,17 대학 졸업 직후 싱가포르를 떠나 네덜란드국립발레단에 합류했다. 네덜란드에서 그는 몇 작품의 발레 안무를 만들었는데, 이 작업이 알려지며 워싱턴 D.C.의 워싱턴발레단의 레지던트 안무가에 이어 예술조감독을 맡았다. 미하일 바리시니코프(Mikhail Baryshnikov)가 아메리칸발레시어터를 위해 의뢰한 〈Configurations〉(1981)의 안무 작업이 비평적으로 높이 평가받으며, 세계 유명 무용단의 의뢰가 이어졌다. 고추산이 거둔 예술적 성취는 생전에 널리 인정받았지만, 그의 섹슈얼리티는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고추산과 널리 동행하였던 오랜 파트너 H. 로버트 매기(H. Robert Magee)는 고추산의 가족에게 비즈니스 매니저라고 소개되었을 뿐, 두 사람의 로맨틱한 파트너 관계는 이야기된 적이 없다. 경력의 정점에서 고추산은 몇 달 앞서 매기가 그러했던 것처럼 에이즈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강승은 이번 연작에서 양피 위 혼합 매체 작업을 선보였는데, 기록 사진을 보고 그린 드로잉은 무척 정교하지만 고추산과 매기를 포함해 인물들의 모습만은 흐릿하게 그려져 있다. 고추산의 핵심적 정체성을 에워쌌던 침묵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로스앤젤레스의 게이 크루징 장소인 엘리시안 공원의 참나무 옹이 조각, 정액을 연상시키는 진주, 프로스펙트 오두막과 서울 및 싱가포르의 게이 크루징 장소에서 가져온 돌의 수채 드로잉을 비롯해 사비에르 비야우루티아(Xavier Villaurrutia , 1903-1950)와 도널드 우즈(Donald Woods, 1958-1992)와 사무엘 로드리게스(Samuel Rodríguez, 생몰연도 미상)18 등 게이 시인들이 욕망에 관해 쓴 시구와 이를 뉴욕의 게이 미술가 마틴 웡(역시 1999년 에이즈 합병증으로 사망했다)이 디자인한 미국수어(ASL) 폰트로 옮긴 버전까지, 게이 욕망을 암호화한 표현들이 양피 위로 조심스레 드러난다.
<손의 심장>의 콜라주 혼합 매체 작업에서 욕망이 은근히 드러날 뿐이라면, 연작의 비디오 작업에서는 분명하게 무대의 중심을 차지한다. <손의 심장>(2023) 비디오는 브뤼셀의 논바이너리 무용가이자 안무가인 조슈아 세라핀(Joshua Serafin), 로스앤젤레스의 영화촬영감독이자 화편집자인 네이슨 머큐리 킴(Nathan Mercury Kim), 서울의 트렌스젠더 작곡가 키라라(KIRARA) 등 퀴어 공동체 사람들과의 협업으로 만들어졌다. 영상은 밤의 어둠으로 촉발되어 밀려든 성적 욕망을 표현한 비야우루티아의 시 「녹턴」(1938)의 구절을 웡의 ASL 폰트로 형상화한 손들이 화면 위를 떠다니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후 조명의 극적인 명암 아래 춤을 추는 세라핀의 빼어난 독무가 이어진다. 세라핀의 춤은 고전 발레와 현대무용 그리고 나이트클럽에서 볼 법한 몸동작을 뒤섞어 놓았다. 음악은 강렬한 EDM 트랙으로 고동친다. 퍼포먼스의 원자료인 〈Configurations〉 안무와 그 음악인 새뮤얼 바버(Samuel Barber)의 「피아노 협주곡 Op. 38」(1962)과 아득히 멀어지는 것만 같다. 퍼포먼스가 중반을 향하면 세라핀이 바닥에 쓰러지고 전구 하나가 천천히 내려온다. 몸이 꿈틀대는 동안 음악이 느려진다. 그러다 갑자기 터져 나온 황홀의 춤사위 이후, 마지막 움직임이 시작된다. 이제는 금색 물감과 반짝이로 뒤덮인 세라핀이 나른하게 관능적으로 춤을 춘다. 세라핀의 입에서 금사 한 줄이 천천히 풀려나온다. 비디오는 세라핀이 미소를 지은 채 카메라를 똑바로 들여다보고는, 부드럽게 웃으며 뒤로 걸어 나가는 모습으로 끝이 난다. <손의 심장> 비디오는 이미지, 움직임 시퀀스, 박동하는 사운드트랙을 통해 발레의 깐깐한 고전주의와 고추산의 호모섹슈얼리티에 가해진 억압에 맞서 지하 클럽에서 춤을 출 때 느낄 법한 해방과도 같은 투쟁, 유혹, 표출의 미학적 비전으로 저항한다.
<손의 심장> 비디오가 무용수 한 명의 서사적 여정에 집중한다면, 또 다른 비디오 작품 <라자로>(2023)은 두 사람의 몸이 상호작용하며 빚어내는 친밀에 초점을 맞춘다. 작품이 참조한 원자료 중에는 고추산의 발레 <미지의 영토>(1986)와 브라질의 게이 미술가 조제 레오니우송(José Leonilson, 1957–1993)의 <라자로>(1993)가 포함되어 있다. <라자로>는 그가 에이즈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만든 조각으로, 끝단을 이어박은 두 벌의 남성 드레스셔츠로 구성된 작품이다. 영상은 사무엘 로드리게스의 「너의 데님 셔츠」(1998)의 시구를 한 글자 한 글자 마틴 웡의 ASL 폰트로 표현한 손들이 화면 위를 떠다니며 시작한다. 시의 화자는 바이러스로 죽은 연인(“내 사랑”)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연인의 소지품이 바이러스를 퍼뜨릴까 두려워 물건들을 버리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다. 구슬픈 음악이 중간 정도의 빠르기로 흐른다. 이후 두 남성이 서로의 손을 만지는 클로즈업에서 시작해 큼직한 방의 바닥 위를 구르다가 쉬었다가 서로를 향해 몸을 웅크리는 등 몸의 형상을 달리하며, 둘 사이에 일어나는 움직임의 시퀀스가 이어진다. 방을 밝힌 삼각형 모양의 형광등은 에이즈 인식 고취를 위해 만들어진 저 유명한 “침묵=죽음” 포스터(1987)의 삼각형을 연상시킨다. 작품의 중반쯤 오면, 이강승이 레오니우송의 <라자로> 조각을 삼베로 리메이크한 작품이 옷걸이에 걸려 있다. 두 남자가 목이 둘인 삼베 셔츠를 입고 나면 조명은 차가운 느낌에서 따뜻한 느낌으로 변한다. 두 사람이 춤을 추면서 음악은 더욱 극적으로 고조된다. 하나로 이어진 셔츠의 물리적 제약을 받으며 두 사람은 다양한 구도로 서로에게 멀어졌다 다가가기를 거듭한다. 마지막에 두 사람은 셔츠를 벗어 정중히 바닥에 놓고, 조명은 다시 차갑게 변한다. 한 남자가 팔을 상대의 어깨에 두른 채,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는 동안 두 사람이 걸어 나간다. <라자로>의 분위기는 다면적이어서, 상실을 특히 에이즈와 연결 지어 애도하는 한편, 또 상실을 딛고 나아가는 극복의 과정에 깃든 감정적 복합성과 양가성을 탐색한다. 특히나 <라자로>의 내러티브는 셔츠가 누군가에 의해 다시 활성화되어 의미를 아마도 무한히 재생성할 수 있으리라 암시하며 결말을 열어둔다.
맺음
이강승의 예술적 실천은 돌봄의 연결망을 조명하며, 작품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연결망을 더욱 키워간다. 그의 작품은 간과되거나 제대로 탐색되지 못한 퀴어 인물과 역사의 가시성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탠다. 이강승은 풍요의 장소에서 작업한다.19 아카이브, 도서관, 소장품, 역사적 장소에서 수집한 이미지, 텍스트, 오브제를 재생산하여 새로운 별자리 속에 재배치한다. 형태는 되살아나, 새로운 맥락과 조합 속에서 새 삶을 얻는다. 공동체는 새로운 협업으로 이어지고, 협업은 새로운 공동체로 이어진다. 이강승의 작업은 모두에 움직임을 불어 넣는다.
주석
필자는 이강승의 작품과 관련 내용에 대해 너그러이 의견을 나누어준 이강승, 이수연, 정영, 우데이 람에게 감사를 표한다. 또한 번역을 돕고 이강승의 작품과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 대한 통찰을 전해준 모친 문은희 님에게도 감사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