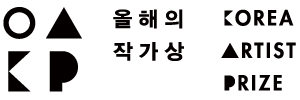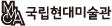김영은

Interview
CV
1980년 서울 출생
산타크루즈와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
학력
2021–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크루즈, 필름과 디지털 미디어 박사 재학 중, 산타크루즈, 미국
2013
헤이그 왕립음악원 소리학 과정 수료, 헤이그, 네덜란드
2007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전문사, 서울, 한국
2004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학사, 서울, 한국
주요 개인전
2022
《소리의 틀》, 송은, 서울, 한국
2019
《Bones of Sound》, 비지터 웰컴 센터, 로스앤젤레스, 미국
2014
《맞춤벽지음악》, 솔로몬 빌딩+케이크갤러리, 서울, 한국
2011
《402호》, 문래예술공장, 서울, 한국
《세미콜론;이 본 세계의 단위들》,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서울, 한국
2009
《작명소 레슨: 제1장》, 대안공간 루프, 서울, 한국
2006
《청취자들》, 인사미술공간, 서울, 한국
주요 단체전 및 스크리닝
2025
《올해의 작가상 2025》,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2024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 한희원 미술관, 광주, 한국
2023
《Beyond the Crest》, M+ 미술관, 홍콩
이미지 포럼 페스티벌, 씨어터 이미지 포럼, 도쿄 / 교토문화박물관, 교토 / 아이치 예술 문화 센터, 나고야, 일본
《Monitoring: This Image Will Become Important Later》, 카셀 독페스트, 카셀 쿨투어반호프, 카셀, 독일
이흘라바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라하, 체코(온라인 스크리닝)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천, 한국
아시안 아메리칸 국제영화제, 뉴욕, 미국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 케이하우스, 바젤, 스위스
2022
《Past. Present. Future.》, 송은, 서울, 한국
2021
《서서울미술관 사전프로그램: 경계에서의 신호》,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공포의 선율을 흥얼거리며》, 헬렌 제이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미국
《Border Crossings: North and South Korean Art from the Sigg Collection》, 베른 미술관, 베른, 스위스
2020
인사미술공간 20주년 아카이브 프로젝트 《인미공 공공이공》, 인사미술공간, 서울, 한국
《시대를 보는 눈: 한국근현대미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COLA 2020》, 로스앤젤레스 시립미술관, 로스앤젤레스, 미국(온라인 전시)
2019
《LOOP Discover Award》, 산트 아구스티 수도원 시민센터, 바르셀로나, 스페인
샤르자 필름 플랫폼, 샤르자, 아랍에미리트
2018
《Unclosed Bricks: 기억의 틈》, 아르코미술관, 서울, 한국
2017
《제17회 송은미술대상전》,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녹는 바다》, 아트 스페이스 풀, 서울, 한국
2016
SeMA Gold 《X: 1990년대 한국미술》,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아트스펙트럼》,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한국
2015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하이트컬렉션, 서울, 한국
《Radiophrenia》, 현대미술센터, 글래스고, 영국
주요 강연 및 발표
2024
「GB Talk」, 광주비엔날레, 광주, 한국
「Sound and Writing in East Asia」, 시카고 대학교 동아시아연구센터, 시카고, 미국
2023
「Atmospheres of Violence」, 하버드 대학교 예술·영화 및 시각문화학과, 캠브리지, 미국
「Arts and AI Innovations」,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크루즈 과학과 정의 연구센터, 산타크루즈, 미국
2022
「Differentiating Sound Studies: Politics of Sound and Listening」,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 서울, 한국
2020
「시간을 수집하는 방법 – 작품은 외장하드에 담아 오시면 됩니다」,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2019
「귀높이: 소리와 미술관」,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한국
2016
「공간 듣기」,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한국
주요 수상 및 기금
2023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한국경쟁 단편 작품상, 한국
2020
로스앤젤레스 인디비주얼 아티스트 펠로십, 미국
2017
송은미술대상 대상, 한국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영예상, 오스트리아
2014–2015
몬드리안 재단 펠로십, 네덜란드
주요 레지던시
2018
Q-O2: Workspace for experimental music and sound art, 브뤼셀, 벨기에
2014–2015
라익스 아카데미,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주요 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부산현대미술관, 한국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제주현대미술관, 한국
지그 컬렉션, 스위스
Critic 1
김영은과 경계의 청취
케이시 메시하 (요크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 연구학과 조교수)
우리의 바람에는 특별한 성질이 있었다. (…) 시간이 흐르면서, 내 귀는 배경의 소음에 조율되어 갔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조용히 하라고,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말라고 가르침 받았을 때조차도, 아니 어쩌면 특히 그럴 때일수록, 닳아 풀리기 시작한 옷감의 가장자리에서는 그 익숙한 침묵의 실을 잡아당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그레이스 M. 조, 『한인 디아스포라의 출몰』
김영은은 지난 20년간 한국의 소리 역사와 친밀한 접촉을 여는 다학제적 실천을 이어왔다. ‘소리 민족지학’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작업 전반에 걸쳐 수집되고 무대화된 소리들은 시간과 장소에 깃든 복잡한 심리적·감각적·역사적 특수성을 섬세하게 펼쳐낸다.1 김영은의 작업에서 소리는 한국의 군사주의, 이주, 디아스포라 관계성의 유산을 좇으며 식민 폭력과 근대화 과정, 그리고 그에 수반된 감각의 위계가 부정해 온 구멍 난 서사의 틈을 메운다. 그녀의 개념적 개입은 작업 전반에 걸쳐 지식을 시각 중심으로 환원해 온 서구적 인식 체계에 맞선다. 시각 헤게모니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작가는 청취의 양태들이 근대화와 식민주의의 논리에 따라 어떻게 각인되어 왔는지 또한 주목한다. 이러한 탐구로부터, 억압되거나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곤 하는 사회정치적·역사적 맥락을 일상 속 잔여물로 드러내는 강렬한 청각 아카이브가 생성된다. 소리라는 패러다임은 김영은에게, 관객들이 그레이스 M. 조(Grace M. Cho)가 “닳아 풀리기 시작한 옷감의 가장자리”라 부른 지점과 조율될 수 있도록 하는 민족지학적 진입점을 제공한다.2 소리는 식민 지배가 남긴 닳아 풀린 경계 속에서 울려 퍼지고, 청취는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고 실행하는 형식이 된다.
많은 학자와 예술가들은 청취가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를 넘어선다고 말해왔다. 이는 청취 행위 자체에 어떻게 이데올로기가 스며드는지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3 소치틀 마르실리-바르가스 (Xochitl Marsili-Vargas)는 “청취는 해석의 행위이면서도, 동시에 특정한 사회적 공간을 점유하는 것, 즉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방식을 수반한다”4라고 시사한다. 청취자의 맥락은 고유하며, 따라서 주어진 소리가 어떻게 코드화되고 재현되는지에 대한 주체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소리를 듣는 것은 윤리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김영은에 따르면, 그녀의 실천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추동된다. “청취는 지식 생산과 탈식민화 과정에서 어떤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가?”5 그녀의 여러 작업에서 ‘소리 민족지학’은 공식 국가 서사를 넘어 울려 퍼지는 역사의 중첩과 정치적 저항 행위를 세심하고도 충실하게 재현하고자 한다. 주목할 점은, 이 방법론이 텍스트에서 음악, 환경음, 준언어적 소리에 이르는 모든 양태의 소리를 관찰한다는 것이다. 김영은은 작업 전반에 걸쳐 의미 없다고 여겨지거나 즉각적으로 읽히지 않는 소리들에 고유한 의미와 변혁의 잠재력을 부여한다.
소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음향적 실체’를 탐구하며
『작명소 레슨: 세 개의 트리트먼트』(2009)는 김영은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제작한 세 편의 영상 작업을 위한 트리트먼트를 담은 책이다. 트리트먼트는 영상의 전체 개념, 스토리라인, 스타일적 접근 방식을 기술하는 문서를 일컫는다. 또한 제작에 앞서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서사의 세부 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책과 그에 연관된 영상 작업 삼부작은 구두점, 발화, 음성 기호라는 예상치 못한 주인공들을 내세운다. 예를 들어, 「제1장: 구술지대」(2009)에서는 텍스트가 소설처럼 배치된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또르르르르르르르—” 이어지는 문장들은 아이가 놀이의 시작을 알리며 혀로 소리를 내는 모습을 묘사한다. “마그마”라는 단어는 처음 등장한 뒤 연속해서 열다섯 번 반복된다. 페이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다. “단어는 아이의 입 속에서 반복될수록 그 의미를 잃어간다.” 작가에 따르면, 이 장의 각 페이지는 하나의 단어로부터 파생된 소리, 기호, 음성 부호, 그리고 그것들이 가리키는 대상을 드러내는 사건 장면을 기록한다. 화용론적 맥락을 의도적으로 비워두고 페이지에 충분한 여백을 남김으로써, 관객과의 공동 저작을 유도한다. “마그마”는 우리의 참여 없이는 줄거리가 정해지지 않는, 모습을 뒤바꾸는 주인공이 된다. 이 수행적 틀은 소리, 기호, 단어, 지시 대상 사이의 관계를 느슨하게 풀어내며, 작품과 맺을 수 있는 다양한 서사나 관계가 등장할 여지를 만들어낸다.
「제3장: 세미콜론;이 본 세계의 단위들」(2011)의 트리트먼트에서, 주인공인 세미콜론은 동료 문장 부호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맡는다. 붙임표나 줄임표 같은 각 문장 부호는 문장 내에서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지닌다. 그러나 문장 부호들은 언어에 미치는 형성적 영향력과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고 이해되는지를 좌우하는 힘에도 불구하고 소리 없는 존재로 남겨지곤 한다. 한 페이지는 세미콜론과 콜론의 만남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를 만나는 건 쉬웠습니다. 애써 보려 하지 않아도 나와는 너무 가까이 살고 있어서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 하지만 나는 한때 그에게 심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3:16, 로마서 5:18과 같은 성스러운 일을 해내는 것이었죠.” 문장 부호에 목소리와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김영은은 단어와 기호의 이미지로부터 ‘음향적 실체’를 끌어낸다.6 상상력의 확장 속에서, 세미콜론은 개성으로 충만한 존재로 등장하며 관객에게 이야기의 주인공이 지닌 이념과 심리적 삶에 대한 친밀한 통찰을 제공한다. 기호학과 그 감각적 제약에 도전하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언어를 구성하는 소리와 기호는 유연한 사회적·물질적 힘으로 부각된다. 이들이 변주될 때 그 관계의 자의성이 드러나고, 언어적 헤게모니의 ‘거의 같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 특성이 유희적으로 연출된다.7
역사를 (다시) 울리다
2014년 9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홍콩에서는 우산운동이 벌어져 도심의 상업 지구에서 79일간 민주화를 요구하는 점거 시위가 펼쳐졌다. 경찰의 최루액과 최루가스를 막기 위해 펼쳐 든 우산은 시위대의 비폭력적이고 끈질긴 저항을 상징하는 기표로 자리 잡았다. 대부분의 시위가 그렇듯, 시위 현장은 연설, 활동가들의 구호, 정치적 슬로건으로 채워지며 소리로 활기를 띤다. 그러나 이 시위에서는 뜻밖의 음향 전술이 등장했다. 시위대와 반대 진영 간의 긴장을 풀려던 한 참가자가 메가폰을 조작하던 중, 실수로 ‘생일 축하’ 노래를 틀어버린 것이다.8 이 우연한 사고는 순간 군중의 침묵을 불러일으켰고, 이어 자발적인 박수와 함께 광둥어로 부르는 ‘생일 축하’ 합창이 울려 퍼졌다. 반대편 시위대는 결국 현장을 떠났고, “비논리적 음향 풍경”9은 잠재적 폭력을 완화하는 전 세계 시위자들의 정치적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이 장면은 김영은의 작품 〈소리의 살〉(2015–2019)에 영감을 주었다. 김영은이 “우연히 일어난 작은 사건을 통해 시위 노래로 선택되고, 집단적인 목소리라는 도구를 통해 상징적 힘을 획득한” 노래를 참조한다고 밝힌 〈소리의 살〉은, ‘생일 축하’ 노래가 비물질적 소리로서 집단적 참여를 거쳐 신체화된 저항의 도구로 변모하는 과정을 탐색한다. 작업은 한 사람이 ‘생일 축하’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녹음으로 시작되며,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이 목소리는 점차 겹쳐지고 축적되어 다성의 합창으로 확장된다. 녹음이 더해질수록, 처음엔 단일했던 목소리는 점점 더 깊이와 무게, 역동성을 띠게 된다. ‘생일 축하’라는 익숙한 말과 그에 수반되는 축하의 정서는 맥락의 부조화와 집단적 발화를 통해 새롭게 재편된다. 집단적 목소리가 지닌 물질성은 의미를 매개하는 강력한 도구로 조명된다. 그러나 이런 맥락에서 소리가 지닌 육체성은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 소리는 의미를 가능하게 하지만, 스스로 의미를 창출하지는 않는다. 잘못 눌린 버튼에서 비롯된 우연한 실수와 그에 이은 집단적 합창은 노래와 그것을 부르는 목소리의 의미작용이 신체성과 맥락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변형됨을 보여준다. 위니 W. C. 라이 Winnie W.C. Lai는 “시위자들은 시위 공간에서 물리적 신체로 존재하는 자신과 함께 소리를 재맥락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정치적 참여자로서의 역할과 행동을 숙고해야 한다”라고 말한다.10 〈소리의 살〉에서 단일한 목소리는 집단적 신체로 변모하며, 김영은은 목소리들의 축적을 통해 정치적 가능성의 음향을 향한 몸짓을 구가한다. 김영은의 작품 전반에서 저항적 소리 민족지학을 엿볼 수 있지만,11 그녀는 목소리와 소리가 군사주의를 강화하고 폭력과 전쟁을 조장하는 도구로도 사용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다. 2017년 김영은은 남북한 사이의 사실상 국경이자 중무장 지대인 비무장지대 DMZ에 설치된 확성기 방송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은 사운드 설치작품 〈총과 꽃〉(2017)을 선보였다. 1953년,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측 공산군과 미국이 지원하는 남측 정부 간의 한반도 지배권 전쟁이 휴전협정으로 상징적 중단에 이른 이후에도, 남과 북은 여전히 잠재적 충돌 가능성을 안은 채 대치 중이다. 양측 모두 접경 지역에 막대한 군 병력을 배치한 상태다. 작가가 ‘음향 전쟁’의 사례로 설명한 바와 같이, 남북한은 전략적으로 확성기 벽을 마주 보게 설치하고, 선전 방송은 물론 음악, 국제 뉴스, 군악대 소리, 심지어 늑대 울음소리와 징 소리까지 상대 진영 깊숙이 송출했다. 이 고출력 확성기는 2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도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확성기에서 방출된 소리는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 MDL에 갇히지 않는다. 소리는 이동하고, 부풀고, 줄어들며, 관통한다. 소리는 경계를 우회하고, 적진을 넘나든다. 반향은 차별하지 않으며, (때로는 가차 없이) 내용과 형식을 가리지 않고 몰아친다. 소리는 모든 감각을 자극하고 정신에 잔류한다. 소리가 지닌 다감각적 속성은 신체를 주목하게 하며, 소리의 체감적 차원에 대해 탐구하도록 이끈다. 전쟁 행위를 감각적이라 묘사하는 일은 직관을 거스르는지도 모른다. 감각적이라는 말은 종종 쾌락과 연관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앰버 머서 Amber Musser가 말하듯, 감각적인 것은 “몸으로 체감되는 세부들”과 “육체가 스스로 고유한 앎의 방식을 호출하는” 방식에 집중하게 한다.12 김영은은 소리를 온몸으로 맞닥뜨림으로써, 경계에 관한 민족지학적 탐구에서 더욱 감각적이고 공감각적인 감수성을 불러일으킨다.13 〈총과 꽃〉에서 김영은은 대중적 사랑 노래의 형식을 차용해 소리를 무기로 삼는 것에서 비롯된 청취 경험을 재구성한다. 사랑 노래는 흔히 로맨스와 연관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소리로 인식되지만, 그것이 실제로 활용되는 방식과 맥락은 이러한 기대와 어긋난다. 이는 어떤 소리든 공포와 지배의 감각을 유발하도록 기계화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 설치 작업은 V자 형태로 배열된 스피커 스탠드에 다섯 개의 혼 스피커를 올린 모습으로, 한국군이 실제로 사용한 대중적 사랑 노래에서 추출한 소리들을 편집·재구성한 4분 길이의 사운드를 반복 재생한다. 작가는 확성기를 통해 사랑 노래가 만들어내는 물질적 경험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이러한 증폭된 소리를 두고 “청취의 작동 원리는, 마치 원거리에서 발포된 총알이 목표 대상에 물리적 영향을 미치듯, 진동하는 공기가 소리의 근원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의 고막을 두드려 작동하는 원격 촉각이라는 점을 상기했다”라고 설명한다. 무기로 전환된 사랑 노래는 사정거리 내에 있던 이들에게 물리적 타격을 입혔고, 그 멜로디는 청각적 특성이 사라진 뒤에도 진동으로 몸에 남았다. 니나 선 아이즈하임 Nina Sun Eidsheim은 소리가 우리의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물질 간의 진동을 통한 실천 intermaterial vibrational practice”이라 부른다.14 확성기 방송은 국경지대에 배치된 병사들과 그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겼다. 〈총과 꽃〉에서 김영은은 오디오를 ‘조각적 방식’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이러한 감각적 경험을 재구성한다. 오디오의 시각적 재현을 가능하게 하는 스펙트로그램을 활용해 사랑 노래 가운데 하나에서 특정 주파수를 추출한 뒤, 파편화되고 타격적인 음파의 격발로 이뤄진 루프 형태로 편집했다. 이 소리는 때때로 불편할 정도의 강도로 울려 퍼진다. 다양한 음높이와 음색으로 듣는 이를 ‘공격’하며, 원래는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쓰였던 음악이 지닌 모든 연상 작용을 뒤집는다. 이 작품은 평단의 호평을 받았으며, 이로써 김영은은 송은문화재단이 매년 수여하는 권위 있는 미술상인 제17회 송은미술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청음 훈련’: 사회정치적 지형으로서의 소리와 청취
2022년 발표한 〈청음 훈련〉, 〈오선보 이야기〉, 〈밝은 소리 A〉 등 일련의 작업에서 김영은은 근대화와 식민 침탈의 과정을 통해 매개된 소리와 청취의 역사가 어떻게 중첩되는지에 대한 탐색을 이어갔다. 〈청음 훈련〉에서는 일본군이 병사들에게 적군의 비행기와 잠수함의 음고와 리듬을 식별하도록 훈련시켰던 청음 훈련에서 착안, 음고 인지 훈련을 재연함으로써 한국의 음악 교육 역사를 다룬다. 이 재연은 병사들의 악보, 음성 녹음, 인터뷰, 학술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 육군과 해군 병사들이 한국 점령기 동안 겪은 소리 풍경(soundscape)을 재창조한다. 김영은은 이러한 훈련의 재구성을 통해, 감각이 전쟁 무기로 동원되는 군사화의 과정을 조명한다. 〈오선보 이야기〉 역시 역사적 기록물에 주목하며, 한국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형태의 인식 훈련을 조명한다. 47분 길이의 단채널 영상은 1914년, 한국인 음악가가 처음으로 서양 기보법으로 채보한 악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서로 다른 기보 체계 간의 번역 과정은 원본 악보 위에 온통 지워짐과 왜곡된 해석의 흔적을 남긴다. 김영은은 한국 전통음악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서양식 기보에서 추출된 작곡 요소들을 재조합한다. 관객은 번역이 문화 권력의 역학에 따라 형성되며, 인종적 수탈과 상실의 역사가 만들어낸 생략과 공백을 남긴다는 사실을 강렬히 자각하게 된다.
〈밝은 소리 A〉 역시 서양 음악의 제도화를 탐구한다. 첫 장면에서는 커다란 목재 운송함이 밧줄에 묶인 채 프레임 밖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해변을 가로질러 끌려간다. 이때 내레이터가 말한다. “3월 26일, 사문에 도착해 보니 피아노가 이미 육지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지극히 감사한 일이었죠.” 이 작업은 20세기 초의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에 처음 피아노가 도착했던 순간을 돌아보고, 이와 더불어 서양 음악의 기반을 이루는 음고 체계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를 되짚는다. 서양 음악은 19세기 말 개신교 선교사들을 통해 한반도에 전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다.15 피아노는 사문진항을 거쳐 선교사 리처드와 에피 사이드보텀(Richard and Effie Sidebotham) 부부에게 배송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한국인들은 나무 상자에서 흘러나온 “이상한 소리”에 “귀신통”이라는 별칭을 붙였다고 전해진다.16
A음은 440Hz의 주파수에 해당하며, 이는 대부분의 현대 악기를 조율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 음고다. 더 높은 주파수로 조율할수록 소리는 더욱 선명하고 맑게 들린다. ‘더 밝은(brighter)’ 음악을 선호하는 서구의 감각에 따라, 피아노와 그에 수반되는 음악적 표준은 한국인의 청각적 취향과 감상의 기준을 전통 음악으로부터 유럽과 미국의 근대적 체계로 이동시켰다. 한국 사회에서 피아노는 특권층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으며, 근대화를 향한 정치적 전환을 뒷받침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 악기는 선교 활동과 종교 교육과도 긴밀히 얽혀 있었으며, 선교 수단으로서 서양 음악은 한국의 기독교화에 일조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식 음악 교육과 기독교 이념은 한국인들에게 함께 주입되었다.17 〈밝은 소리 A〉에서 김영은은 피아노의 등장이 한국 사회에 초래한 사회정치적 파장을 가리키는 역사적 장면을 재구성한다. 서양 음악의 유입은 한국의 전통적 가치 체계를 변화시켰고, 오늘날 한국인이 소리를 듣고 청취를 경험하는 전반적인 방식을 구축했다. 피아노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악기이지만, 피아노가 담고 있는 소리와 교육 체계는 결코 중립적이거나 무해한 존재가 아니다. 이 악기는 서구에 대한 동질화 기제에 끼워진 하나의 ‘이상한’ 톱니바퀴로 작동한다. 우리가 그것에 다른 방식으로 귀 기울이고, 다시 말해 다른 감각 체계로 조율할 수 있다면, 이는 지식의 감각적 체계를 드러내며 무엇이 상실되었고 무엇이 가능했을지를 사유하게 만든다.
디아스포라의 소리를 듣다
소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놓일 때, 우리는 어떤 청취의 계보를 포착하게 되는가? 트라우마의 역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그것이 몸에 새겨질 때 우리는 어떤 윤리적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는가? 디아스포라는 어떤 소리로 들리는가? 소리는 데이터를 운반하며, 우리는 청취를 통해 그것을 처리하고 소통한다. 하지만 청취란 결코 중립적인 행위가 아니다. 청취란 “역사적으로 우연하며 문화적으로 특수한 가치 체계에 의해 조건 지어진 해석적이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실천이며, 권력관계의 균열로 가득하다.”18 김영은은 최근 작업에서 자신이 구축해 온 소리 민족지학적 접근을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작가는 한국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언어, 음악, 일상에서의 청각 경험들에 주목하며, 이주의 역사가 어떻게 고유한 청취의 양식을 생성하는지를 탐색한다. 미국 내 한국인 디아스포라와 한국전쟁의 여파에 대해 서술한 그레이스 M. 조는 한국 디아스포라를 “세대를 가로질러 따라붙는 유령 들린 (transgenerationally haunted)” 존재로 묘사한 바 있다.19 그녀는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기억되지 못한 트라우마와 상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썼다. 또한, “말로 옮길 수 없거나 불확실한 개인적·집단적 역사가 ‘유령’의 형상을 취할 때, 그것은 말할 수 있는 육체를 찾아 헤매며 디아스포라의 시공간 전반에 걸쳐 퍼진다.”20 김영은은 폭력과 이주로 인한 트라우마의 역사를 형상화하고 소리로 구현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겪어온 “유령 들린 공간(haunted spaces)”을 가리키는 다성적인 서사들을 전달한다.
〈Go Back To Your〉(2025)는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들이 경험하는 인종차별적 폭력의 소리에 관객을 몰입시키는 단채널 영상 작업이다. 소리 풍경 속에서는 빗소리 사이로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주인공의 응답은 텍스트로 제시된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네 쪽으로 걸어갔어. 너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꺼내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어. 나는 말했어. ‘난 여기서 태어났다고.’” 한 번도 속해본 적 없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외국인 혐오의 외침은 가해자의 예상을 벗어난 방식으로 되받아지며 그녀의 주체성과 맞물려 오히려 위협으로 인식된다. “난 여기서 태어났다고”라는 말이 지닌 응축된 정동은 복종에 맞서는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한국인은 군사화된 폭력과 트라우마의 역사를 짊어지고 있으며, 이는 말할 수 없는 상실에 의해 형성된 지움과 침묵을 낳아왔다.21 부정된 역사의 “유령들에 살을 붙이는” 글쓰기를 시도한 그레이스 조의 방법론과 같이, 김영은의 소리 민족지학은 인종차별의 트라우마를 “세대를 가로지르는 유령 들림”으로 인식한다. 〈Go Back To Your〉에 등장하는 텍스트는 타자성에 형태를 부여하고, 과거에는 말로 표현하기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주체들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김영은이 구성한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소리 풍경은 청자로 하여금 익숙한 인식의 틀을 내려놓게 만든다. 이러한 인식의 습관은 디아스포라가 민족주의적 상상력으로 구축된 지식 체계를 어떻게 흔들고 교란하는지를 지워버린다. 〈듣는 손님〉(2025)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김영은은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소련 출신 한인) 공동체와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이민자들이 겪는 디아스포라적 경험에 주목한다. 한 장면에서는 두 중년 남성이 마주 앉아 한국 사회가 자신들을 인식하는 방식과 이주 경험으로 형성된 자신들의 모습 사이에 놓인 괴리를 되짚는다. 둘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꿈꿀 때 러시아 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아니에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진짜.” 여기서 문화는 언어와 행위가 인종과 민족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맞지 않을 때 생겨나는 어긋남의 경험으로 나타난다. 그는 이어서 사회적 당혹감의 근원을 이렇게 설명한다. “어디 밖에 나가면 꼭 외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해. 왜냐면 어떨 때는 ‘이 사람 장난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해. 얼굴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시장 같은 데 가면 ‘저는 외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부족해도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이야기 시작해.”
고려인은 구소련 출신의 한민족을 일컫는다. 1세대 고려인들은 기근과 착취, 관료적 통제를 피해, 이후에는 일본의 점령을 피하고자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이주했다. 이 지역은 이러한 이주의 물결과 함께 한민족의 문화와 정치, 항일 저항의 거점이 되었다. 1937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뒤, 스탈린은 한국인 디아스포라를 특정 인종에 의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다. 같은 해, 스탈린 정권은 약 18만 명의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22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디아스포라는 주로 1990년대 한국과 구소련 국가들의 공식 외교 관계 수립 이후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이주하기 시작한 이들의 후손으로 이뤄진다. 많은 2세대 고려인과 후속 세대에게 있어 ‘인종’은 오직 조상을 통해서만 유령처럼 이어진 문화와 지리적 배경에 그들을 얽매이게 한다.
이 영상 작업은 고려인 디아스포라 2세대가 한국어를 배우고 말하려는 고투를 보여준다. 이들에게 한국어는 디아스포라에 속한다는 감각을 긍정하는 동시에 부정하는 모순된 조건들을 담은 소리와 기호의 집합체다. 러시아어의 소리는 한국 사회에서 그들을 명백한 외국인으로 낙인찍지만, 그들을 가족과 역사, 공동체로 이어주기도 한다. 김영은은 이 작업을 비롯해 그녀의 아카이브에 담긴 여러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소리를 관계 속에서 듣는 비판적 청취의 실천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리스베스 리파리(Lisbeth Lipari)는 『듣기, 사유하기, 존재하기: 조율의 윤리를 향하여』(2014)에서 이렇게 썼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고유한 취약성과 나약함을 드러내게 된다.”23 김영은의 작업을 따라 소리가 지닌 민족지학적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겸허히 인식하고 그와 용기 있게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닳아 풀린 지식의 가장자리에서, 우리는 타인을 감각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보다 윤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그리고 바라건대 더 정의로운 함께 있음의 형식들을 가능케 한다.
1. ‘소리 민족지학’에 대해서는 스티븐 펠드가 2004년 사운드 아티스트 돈 브레네이스와 진행한 대담을 참조하라. 이 대담에서 펠드는 인류학이 소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리 ‘안에서’ 상상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졌다. 또한 녹음, 편집, 작곡을 통해 논픽션 사운드 작업을 창작하는 소리 민족지학 실천가 에른스트 카렐의 글을 참조하라. Steven Feld, and Donald Brenneis. “Doing Anthropology in Sound,” American Ethnologist 31, no. 4 (2004): 461–474; Ernst Karel, “Notes on ‘Space of Consciousness (Chidambaram, Early Morning)’,” Anthrovision, no. 4.2 (2016).
2. Grace M. Cho, Haunting the Korean Diaspora: Shame, Secrecy, and the Forgotten Wa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8), 2.
3. Don Ihde, Listening and Voice: Phenomenologies of Sound, 2nd ed.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7); Christine Bacareza Balance, Tropical Renditions: Making Musical Scenes in Filipino Americ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6); Nina Sun Eidsheim, Sensing Sound: Singing & Listening as Vibrational Practic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5); Alexandra T. Vazquez, Listening in Detail: Performances of Cuban Music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3).
4. Xochitl Marsili-Vargas, Genres of Listening: An Ethnography of Psychoanalysis in Buenos Air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22), 33.
5. 김영은, 작가노트 인용.
6. Fred Moten, In the Break: The Aesthetics of the Black Radical Tradi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3).
7. Homi Bhabha, “Of Mimicry and Man: The Ambivalence of Colonial Discourse,” October, vol. 28 (1984): 125–133.
8. Michele Fan, Doug Meigs, “The Umbrella Movement Playlist,” Foreign Policy – the Global Magazine of News and Ideas, Oct. 9, 2014, https://foreignpolicy.com/2014/10/09/the-umbrella-movement-playlist/.
9. Winnie W.C. Lai, “‘Happy Birthday to You’: Music as Nonviolent Weapon in the Umbrella Movement,” Hong Kong Studies 1, no. 1 (2018): 73.
10. 같은 책.
11. 김영은의 저항적 소리 민족지학을 보여주는 다른 예로는 〈삼자대면〉(2013), 〈발라드〉(2017), 〈에코 챔버〉(2020) 등이 있다.
12. Amber Jamilla Musser, JSTOR E-Books – York University, Between Shadows and Noise: Sensation, Situatedness, and the Undiscipline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24), 7.
13. L. S. Min, North Korea So Far: Distance and Intimacy, Seen and Unseen (Ph.D. diss., UC Berkeley, 2020), 145.
14. Nina Sun Eidsheim, Sensing Sound: Singing & Listening as Vibrational Practic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5), 3.
15. Jeongseon Choi, Western Music in Korea with an Emphasis on Piano Compositions since 1970 (Ph.D. diss., University of Maryland, 1997).
16. Robert Neff, “Daegu and the Legend of Korea’s First Piano,” The Korea Times, Mar. 18, 2022, https://www.koreatimes.co.kr/opinion/20220318/daeguand-the-legend-of-koreas-first-piano.
17. Choi, Western Music in Korea with an Emphasis on Piano Compositions since 1970.
18. Jennifer Lynn Stoever, The Sonic Color Line: Race and the Cultural Politics of Listening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6), 14.
19. Cho, Haunting the Korean Diaspora.
20. 같은 책, 40.
21. 같은 책.
22. German N. Kim, “Koryo Saram, or Koreans of the Former Soviet Union: In the Past and Present,” Amerasia Journal 29, no. 3 (2003): 23–29.
23. Lisbeth Lipari, Listening, Thinking, Being: Toward an Ethics of Attunement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14), 206.
Critic 2
형태에 조응하는 예민한 귀
카를로스 키혼 주니어 (뉴욕현대미술관 동남아시아/동아시아 지역 C-MAP 펠로)
김영은의 작업 전반에서 형태는 소리와 음향의 물질성들이 조합되면서 드러난다. 이는 소리를 만들어 내는 전통과 기술로부터 소리가 향하는 다채로운 지점, 그것을 듣고 응답하는 방식, 그리고 소리가 사회적 공간을 물질화하는 방식, 소리의 순환을 매개하는 관계들, 또는 문화사에서 소리가 차지하는 위치까지 포함한다. 김영은의 작업에서 우리는 소리가 어떻게 감각되고, 지각 가능해지며, 다시 지각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 내는지를 작가가 집요하게 질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소리는 (출처가 불분명하더라도) 대기를 통과하고, 벽을 넘어서, 공간을 가로지르며, 확산하고 의미화된다. 김영은의 작업에서 소리는 형태를 갖추고 하나의 세계를 불러낸다.
김영은의 작업에서 소리는 시노그래피적이고 코레오그래피적인 자극이다. 소리는 사물에 생기를 불어넣고, 공간에 주석을 달며, 정동을 널리 분산시키고, 신체들을 그 주변과 곁으로 모이게 만든다. 다시 말해, 소리는 공간을 배열하고 환경을 물질화하도록 유도하는 (시노그래피적) 자극이자, 신체를 조직하고 이 신체들이 반응하고 실연하게 만드는 (코레오그래피적) 자극이 된다. 나는 김영은의 작업에서 소리가 어떻게 시노그래피적이고 코레오그래피적인 성질을 획득하는지를 사유하면서, 소리 이론에서 이와 맞닿아 있는 인터페이스인 ‘디제틱(diegetic)’1 개념을 함께 탐색하고자 한다.
디제틱에 대한 담론은 주로 영화나 시청각적 틀 안에서 전개되어 왔지만, 나는 이 개념이 김영은의 작품들을 논의할 때에도 공명한다고 본다. 이 경우 디제틱은 영화 담론에서 흔히 짝지어지는 ‘논디제틱(nondiegetic)’과의 이분법적 결합에서 벗어난다. 이는 영화학자 슈테펜 흐벤(Steffen Hven)이 해체하려는 구조이기도 하다. 그에 따르면, “디제시스는 즉각적이면서도 매개된 시공간적 환경으로 우리에게 경험된다. 그것이 즉각적인 이유는 운동적, 물질적, 정서적, 기호학적 현존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기 때문이다.”2 나아가 그는 “디제시스는 시청각 구조 전체와 관련이 있으며, 그것의 부분들을 엄격한 범주들—예컨대 디제틱 대 논디제틱, 이야기 대 담론, 내용 대 스타일 등—로 해체하려는 모든 시도는 영화의 환경으로서의 디제시스에 대해 우리가 처음 마주하는 다감각적인 경험을 배반한다”라고 역설한다.3
흐벤에게 디제시스는 대체로 하나의 텍스트적 전제로 이해되어 왔다. 다시 말해, 영화의 요소들은 시청각적 자극의 매개 작용 이전에 존재하는 서사를 구체화하기 위해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 서사가 우선시되면서 영화적 대상의 요소들이 가지는 의미를 형성한다. 영화적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디제틱을 “생태적 의미 형성(ecological sensemaking)”의 문제로 제안하며, “관객이라는 체화된 유기체와의 만남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감각된 매개 환경”4을 표면화하는 방식의 하나로 본다.
나는 ‘생태적 의미 형성’의 한 형태로서 디제틱을 재고하고자 한다. 즉 디제틱이 “의미 형성을 위한 관객의 인지적이고 정서적인—영화의 재료를 감각되는 환경이나 정서적 생태로 전환시키는—능력에 기반해 나타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미디어 생태계 안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정서적, 지각적 능력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고, 감정, 성향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에 주목한다.5 이 틀 안에서 정서적, 지각적 능력은 미디어 생태계를 통한 조정 과정과 하나로 겹쳐진다. 소리는 “우리의 즉각적이면서도 매개된 시공간적 환경”이 되며, 우리가 처한 환경과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구조화한다. 시노그래피적이고 코레오그래피적인 특성은 이러한 즉각성과 매개를 통해 펼쳐진다.
우리는 초기 작업인 〈삼자대면〉(2013)에서 이런 경향들이 교차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이 작업은 한국계 미국 작가 차학경(Theresa Hak Kyung Cha)의 소설 『딕테(Dictee)』(1982) 속의 파악하기 힘든 다중적인 목소리에서 영감을 얻었다. 소설에서는 유관순, 어머니, ‘나’, 마더 테레사의 목소리가 유동적으로 변주되면서 발화한다. 전시장에는 전화기, 환풍기 커버, 그리고 액자에 담긴 사진이 놓여 있고, 전화벨 소리, 환풍기 후면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 사진 뒤로 울리는 노크 소리와 둔탁한 충격음 등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단편적으로 흘러나온다. 이 연출에서 우리는 각각의 소리를 하나의 단서이자 자극으로 받아들이며 반응한다. 전화벨 소리만은 그 출처가 보이지만, 그 너머의 발신자는 끝내 알 수 없다. 전화벨이 울리고 누군가 수화기를 들자마자 전화가 끊긴다. 전화벨 소리는 전화기 기능의 일부이며, 그 소리는 전화기라는 사물 자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반면, 환풍기는 정체불명의 소리가 흘러들 수 있는 경로이며, 다른 곳에서 소리가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리를 내는 사물이나 통로가 아닌 사진은 소리와 사물의 관계에 관한 또 다른 음향적 존재론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이 둘의 관계가 근원이나 대상의 차원이 아니라 단순한 우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리와 전시된 사물 사이의 관계는 다양한 층위를 제시한다. 각 소리는 소리-사물-관객의 관계로 이루어진 시노그래피를 제공하며 이 경험은 생태적이다. 특정 공간에 모인 사물들은 그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 사이의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경험된다. 곧, 작품들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삼자대면〉에서의 자극은 〈맞춤벽지음악〉(2014)에서 설득력 있게 확장되었다. 이 사운드 퍼포먼스는 서울의 오래된 건물인 솔로몬 빌딩에서 진행되었는데, 이 건물은 한때 중고 상점들이 입점하여 시장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상점들 사이 칸막이는 모퉁이 코너와 폐쇄된 공간을 만들고, 이로 인해 색다른 풍경, 비뚤어진 입구, 막다른 길 같은 독특한 공간 구조가 형성되었다. 김영은은 이러한 건축적 특이성을 활용해 소리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시노그래피를 만들어 낸다. 퍼포머들은 이 은밀한 공간에 숨어서 소리를 만들고, 지휘자의 신호에 원격으로 반응하며, 다른 퍼포머에게서 들리는 미약한 소리를 단서로 삼는다. 관객 역시 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극히 미세한 단서와 알아차리기 힘든 변화에 집중하며 공연을 따라가려 애쓴다. 듣기 위해 움직이는 몸과, 들리기 위해 움직이는 몸 사이의 코레오그래피가 이 공연의 구조를 이룬다. 〈맞춤벽지음악〉은 김영은이 ‘청각적 공간’이라 명명한 개념을 탐구한 작업으로, 이는 “청각적 경험이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며, 본래 그 공간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감지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나아가 작가는 청각적 공간—작가 자신이 “시각적으로 특징이 없거나 완전히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 묘사한 것—의 신체성과 장소성은 소리에 의해서 드러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소리 장면들로 이뤄진 생태계가 〈삼자대면〉과 〈맞춤벽지음악〉에서의 경험을 만들어 냈다. 김영은의 소리 개입을 물질적, 정신적, 정서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생태적 의미 형성이다. 소리는 단지 기술이나 양식, 미학, 또는 미술사와의 관계로만 언급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감각과 감각되는 것(the sensible)의 역사를 통해 논의되며, 생태계의 역동적인 생명력 속에 자리한다. 이 생태계는 프랑스 영화이론가 미셸 시옹(Michel Chion)이 말한 “아쿠스마틱(acousmatic)”6, 즉 그 출처를 알지 못한 채 소리만을 듣는 경험에 의해 구조화되기도 한다. 바로 이 아쿠스마틱한 직관을 통해 더 거대한 관계적 세계가 함축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전시 공간의 즉시성을 넘어 존재하는 생태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생태적 의미 형성이라는 문제는 작가의 맥락 안에서 ‘감각되는 것’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음악(전통 음악의 지식 체계와 악기, 한국 대중음악의 생산 및 수용, 그리고 그것이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이념적 대립에 사용되는 방식), 도시 환경(도시 공간의 청취 맥락, 예를 들면 교통, 통신, 대중 매체 등 공공 인프라에서 사용되는 안내 방송), 시위, 기억의 재구성 작업 등이다. 작가의 작업 전반에서 소리는 보다 넓은 생태와 문화 안에 자리한다. 위에서 논의된 두 작업의 맥락에서 소리는 단지 읽고, 듣고, 해석하는 텍스트성(textuality)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감각, 인식, 가치로의 번역이라는 인프라뿐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집합성과 순환의 문제를 함께 담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다루어지면서, 문화로서의 소리가 하나의 생태계로 구성되고 구체화된다.
이러한 시노그래피, 코레오그래피적 자극은 고고학적 감수성과도 맞닿아 있다. 우리는 특히 물질적, 기술적 흔적에서 혹은 역으로 징후적 공백에서 소리와 그 역사를 끌어내는 방식을 살필 때 이 감수성을 확인하곤 한다. 디제틱은 이러한 자극을 구조화하는데, 특히 의미 형성이 생태적 요소에 의해 매개되는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디제틱은 물질적 현실과 이에 대한 우리의 지각, 그리고 소리의 매개가 하나로 만나 확장적 경험으로 합쳐지는 과정을 암시한다. 이와 관련해 흐벤은 “디제시스에 대한 우리의 지각은 단지 지각 체계만으로도, 혹은 환경이 제공하는 행동 가능성만으로도 온전히 설명될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7
이 고고학적 감수성은 〈오선보 이야기〉(2022)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 작업에서 김영은은 음악을 만들고 감각하는 문화가 식민지 시기를 거치며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탐구한다. 특히 읽을 수 있는 기보로 매개하는 여러 방식과 한계, 그리고 토착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 사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변형되고 무엇이 소실되는지를 다룬다. 한국 전통음악사의 맥락에서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고찰하며 작가는 ‘정간보’의 역사를 살핀다. 정간보는 ‘음의 높낮이와 길이를 함께 표시하는 흐름 기반의 악보 체계’이다.
‘전통음악을 해외에 소개하거나 외래 감수성을 한국 음악 작곡에 통합하려는’ 노력 속에서, 악보 표기법은 점차 이러한 토착적 표기 체계를 버리고, 서양 고전 음악의 엄격한 오선보 중심의 체계로 옮겨가기 시작했으며, 이후 오선보는 ‘보편적’ 체계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음악을 배우고 연주하고 기록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듣고 감상할 수 있는 음의 범위까지 제한한다. 오선보 중심의 체계는 한국 전통음악 표기의 유동성을 정확히 담아낼 수 없다. 〈오선보 이야기〉는 조선정악전습소의 교육자인 김인식이 1914년 「영산회상」의 양금 악보를 서양 오선보 표기법으로 채보한 「조선구악 영산회상」을 다룬다. 이 작품은 전통음악 연주자, 작곡가, 연구자들과의 인터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으며, 토착적 악보 체계가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함의를 조명한다.
〈오선보 이야기〉는 물질문화와 지식 문화를 관통하며, 듣기와 청취,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 형성의 실천이 식민지적 조우를 통해 어떻게 구성되고 변형되었는지를 추적한다. 〈삼자대면〉과 〈맞춤벽지음악〉에서 동시대적으로 구현된 시노그래피, 코레오그래피적 차원은 이러한 의미 형성의 고고학을 통해 한층 복잡해진다. 이 고고학적 전환을 통해 ‘감각되는 것’의 역사는, 곧 이런 역사를 구성하는 재료 그 자체인 지식과 정치의 지도학을 암시한다. 감각되는 것을 역사화함으로써 우리는 동시에 무엇이 보이고 들리는지를 구성해 온 지식 체계와 정치 체계 또한 역사화하게 되며, 나아가 특정한 환경에서 지식과 정치의 역사를 더 많이 알수록, 가능한 감각적 형식의 물질성 또한 더 많이 알게 된다.
이와 같은 고고학적 감각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제기한다. 특정한 감각들을 중심으로 지식 체계가 고정되고 공고해지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7분 길이의 영상 작품 〈밝은 소리 A〉(2022)는 미국 선교사가 한국 대구에 처음으로 피아노를 들여온 사건을 다룬다. 이 피아노는 악기를 일반적으로 조율할 때 표준으로 삼는 A음을 소개한다. 〈청음 훈련〉(2022)은 15분 분량의 영상으로, 김영은은 이 작업에서 ‘한국의’ 미적 교육이 일본의 식민 및 군사 역사와 어떻게 충돌했는지를 살펴본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당시 학생과 군 장교에게 군용기의 웅웅거림 속에서 자신들이 듣는 소리를 기록하게 했던 음고 지각 훈련을 시뮬레이션한다. 두 작품은 의미 형성의 학습과 적응 과정을 식민성과 전쟁의 틀 안에서 도식화함으로써 의미 형성 자체를 탈자연화하고 ‘감각하기, 학습하기, 담론화하기’라는 소리를 둘러싼 관계적 주체자들을 정치적·윤리적·실천적 함의에서 탐구한다. 감각되는 것의 역사는 곧 그것의 정치이기도 하다.
고고학적 관점은 외부 현상과 자극을 코레오그래피적 주석으로 번역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리와 음악을 매개하는 형태들에 대한 김영은의 집요한 관심을 구체화한다. 이 방식들은 악보, 기보법, 전사, 녹음, 심지어 영화적 장치에 가까운 ‘트리트먼트(treatment)’8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경향은 〈세미콜론;이 본 세계의 단위들〉(2011) 같은 작업에서 두드러진다. 이 작업에서는 싱글 채널 비디오와 함께 여러 부호들과 관련된 13개의 악보 드로잉이 병치된다. 〈세미콜론;이 본 세계의 단위들〉은 김영은의 책과 비디오 3부작 〈작명소 레슨: 세 개의 트리트먼트〉(2009–2011)의 세 번째 장으로, 기호와 소리 사이의 필연적이거나 자의적인 연결을 탐구한다. “이러한 언어 행위의 재맥락화와 재배치를 통해, 이 작업은 말과 글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새롭게 성찰하며, 이들 사이의 또 다른 관계를 상상하도록 이끈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시노그래피적, 코레오그래피적, 고고학적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소리와 음악의 풍성한 역사를 소리의 역사와 정치, 즉 감각되는 것의 미학으로 이해하게 돕는다. 김영은의 미적 실천은 소리의 시적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소리의 구성 방식과 우발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미래의 청취자들에게〉는 김영은의 고고학적 자극을 한층 더 구체화한 작업이다. 첫 두 연작의 중심에는 왁스 실린더 녹음물이 있다. 1896년, 미국의 인류학자 앨리스 플레처(Alice Fletcher)는 워싱턴 D.C.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인 유학생 세 명에게 「사랑노래─아라랑 1」을 부르게 했고, 이것은 한국 전통음악이 녹음 매체에 담긴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 플레처의 민족지학적 프로젝트는 19세기 미국 인류학의 성과로, 당시 축음기 기술을 통해 토착 민족들의 음악과 언어를 기록했다.
김영은은 〈미래의 청취자들에게 I〉(2022)에서 물질적 기술 자체의 소중함에 주목한다. 왁스 실린더는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 급격히 손상되며, 소리로 변환되는 요철이 새겨진 표면은 점차 매끄럽게 닳아 마침내는 소음으로 변질된다. 작가는 남아 있는 판독 가능한 흔적을 최대한 복원하기 위해 이 정보를 노이즈 제거 플러그인에 입력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는 선명한 소리를 추출하는 대신 매끄럽게 닳은 왁스 표면의 데이터를 모두 소음으로 해석한다. 결과물은 이 과정을 오디오 그래픽으로 재현한 것으로, 여기에 소리의 재현 방식과 미디어 포맷의 문화적 역사를 탐구한 소리 연구 학자 조너선 스턴(Jonathan Sterne)의 기념비적 저서에서 발췌한 구절이 더빙되어 있다.9
이와 같은 디지털의 개입은 1900년대에 제작된 실제 축음기를 활용한 〈미래의 청취자들에게 II〉(2022)에서도 찾을 수 있다. 김영은은 이 작업에서 「사랑노래─아라랑 1」을 직접 부르고 왁스 실린더 기술을 사용해 녹음했는데, 그 목소리가 재생될 때 납화 재료의 물질이 점진적으로 열화되는 과정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두 작품은 기술 그 자체의 미래상뿐만 아니라 기술이 열어젖힌 인류학적 지평의 미래까지도 암시한다.
두 작품에서 민족지학적 동기는 물질의 고고학에 의해 복잡하게 뒤엉킨다. 민족지학적 기록의 상상을 떠받치는 이 안정성과 영속성은 그것을 가능케 해온 기술에 의해 침식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고학적 자극 자체가 시노그래피적, 코레오그래피적 관계성들을 구체화한다. 전시장 한구석에 무심히 놓인 축음기는 경외감과 위압감을 불러일으키고, 재귀적이면서도 탈신체화된 소프트웨어의 작동은 학제적, 이데올로기적 역사의 장구한 시간을 정밀한 시선으로 관찰한다. 이는 이번 전시의 신작으로도 이어지는 작가적 실천의 중요한 성취다.
시노그래피적이고 코레오그래피적 맥락을 통해 우리는 소리가 얼마나 예리하게 물질적이면서도 정치적인 것이 되는지 목격한다. 이 두 가지 비유는 생태적 의미 형성의 순간으로서 공공, 정치, 더 나아가 민주적이라는 복잡한 틀 안에서 우리가 소리에 관여하는 상황을 설정한다. 더 주변적이고 분산되어 있어 그만큼 위태롭고 소중한 ‘감각되는 것의 역사’와 관련하여 ‘공적’, ‘정치적’, ‘민주적’이라는 개념의 정의와 전개를 재고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우리가 사회적 공간을 탐색하는 구체화되고 정착된 실천으로서 말과 노래에 관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김영은의 작업에서는 소리가 만들어지고, 들리고, 역사화된다. 이 작업들은 생태적 의미 형성의 한 양식으로서 소리의 잠재력을 살피고, 소리로 동시대의 즉각성을 가로지르며 현재를 넘어선 사회적 맥락을 감각 가능하게 한다.
이 글의 마지막은 이번 전시를 위한 신작 가운데 하나인 〈Go Back To Your〉(2025)로 맺고자 한다. 이 작품은 공적 공간에서 디아스포라 여성들이 듣게 되는 말들을 재생한다. 이는 위협과 비방이 뒤섞인 소리 풍경으로, 우리는 마치 그들과 나란히 서 있는 듯 그 소리를 듣게 된다. 언어폭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서 트라우마를 겪었거나 그런 폭력을 내면화해 온 이들에게도 들리는데, 김영은은 자신이 직접 겪었거나 다른 이에게서 전해 들은 경험들로 이런 소리 풍경을 재창안한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작가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들이 어떻게 거친 말을 피하고 이러한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방어하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개발해 왔는지 살펴본다. 예컨대, 불쾌한 말이 들릴 때 일부러 기침을 해서 그 소리를 덮거나 가리는 방식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에는 상황이 한층 더 복잡해졌다. 전 세계적 호흡기 질환이 ‘아시아의 것’으로 코드화되면서 기침은 언어적 괴롭힘을 삼키기는커녕 더 적절치 못한 언행을 부추기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Go Back To Your〉는 ‘청취의 공간’으로서 구성된 공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에 대한 또 다른 개념화를 제안한다. 듣기와 청취는 표상 행위로서 말하기만큼이나 ‘공적’이고 ‘민주적’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한다. 듣기와 청취는 호명의 문제를 재사유하게 한다. 청취의 경험은 애초에 생태적이어서, 듣는(혹은 들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시각이나 촉각의 즉각성과 친밀성을 넘어서는 소속감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듣기와 청취가 소속의 장이 될 때 그곳의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되지만, 그곳이 폭력의 장이 될 때는 피해자가 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김영은은 시노그래피와 코레오그래피로 민주적 장면을 연출하는데, 여기서 민주적인 것은 누가 국민이나 상징을 식별하는가 보다는 누가 이 열린 시공간적 상황에서 발화의 간섭을 받는가에 따라 구체화된다.
김영은의 작업에서 우리는 감각되는 것의 미학, 특히 청취의 시적, 정치적 성격에 예민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그가 우리에게 숙고와 검토하길 청하는 것은 단지 음악이나 노래, 언어의 역사가 아니라 소리와 음향의 물질성을 사유할 때 우리가 기대는 주체성 그 자체를 여러 면에서 재고찰하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주체성을 생태적인 것으로 다시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호화의 체계뿐만 아니라 ‘감각된 매개 환경’과 ‘관객이라는 체화된 유기체’가 하나로 어우러지도록 이끌 수 있다. 이러한 만남은 실제 김영은 작업에서 보이는 훼손되어 가는 노래를 연주하는 낡은 악기, 현대적 소프트웨어가 그 노래를 되살리고자 하는 시도, 보이지 않는 타인들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신체들, 전투기 소리에서 음을 식별하기 위한 청음 훈련 등과 같이 다양한 층위와 규모를 넘나들며 이뤄진다. 이 생태적 주체성은 감각과 감각 형성이 뻗어 나가는 더 거대한 세계를 가리키며, 우리가 직면한 당대는 지속적이면서도 우발적인 ‘세계-존재’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결국 생태적 의미 형성은 우리를 향해 있다. 이 의미 형성은 우리를 이러한 환경 속에 위치시키고, 변화무쌍한 조건을 매개하며, 언제 귀를 기울이고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