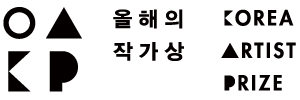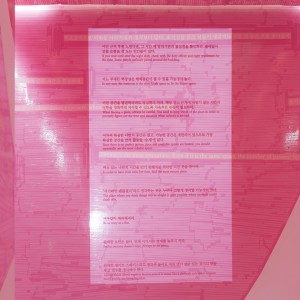오인환

작가는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과의 관계, 그 연결적 맥락에서 형성된 문화적 코드들을 해체하거나 재해석하며, 차이, 다양성, 소통 등 현대미술의 키워드를 작품으로 녹여내면서 일상의 경험과 연결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미술 작업을 진행한다.
Interview
CV
2014
‘사각지대 찾기’,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갤러리팩토리, 서울, 한국
2012
‘거리에서 글쓰기’, 신도리코문화공간, 서울, 한국
2009
‘TRAnS’, 아트선재센터, 서울, 한국
2002
‘Smoldering Relations’, 밀스컬리지 미술관, 오클랜드, 미국
2002
‘나의 아름다운 빨래방 사루비아’,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 서울, 한국
2001
‘Things of Friendship’, 팔러프로젝트, 뉴욕, 미국
2001
‘Meeting Place, Meeting Language’, 대안공간 루프, 서울, 한국
<주요 단체전>
2014
‘그만의 방: 한국과 중동의 남성성’, 아트선재센터, 서울, 한국
‘멀티미디어 페스티발-안녕 다람쥐’, 봉산문화회관, 대구, 한국
‘스펙트럼-스펙트럼’, 플라토, 서울, 한국
‘공명의 시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한국
‘건축적인 조각 – 경계면과 잠재적 사이’, 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경계와 탈경계’,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한국
2012
‘디스로케이션’, 대구미술관, 대구, 한국
‘플레이그라운드’, 아르코미술관, 서울, 한국
‘여의도비행장에서 인천공항까지’, 일민미술관, 서울, 한국
2011
‘이미지 충돌: 한국현대비디오작품전’, 콜로라도 대학교 미술관, 발더, 미국
‘조율전-인천여성비엔날레’,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 한국
‘카운트다운’, 문화역서울284, 서울, 한국
2010
‘한국드로잉 30년’, 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Aichi Triennale – Arts and Cities’, Aichi Arts Center, 나고야시립미술관 외, 나고야, 일본
‘언어놀이전’,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
‘Body & Soul of Writing between East and West’, Giorgio Cini Foundation, 베니스, 이태리
2009
‘박하사탕’,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박하사탕”, Museo Nacional de Bellas Artes,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2007
‘2007 가을, 서울’, 테이크아웃드로잉, 서울, 한국
‘제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안양, 한국
‘박하사탕’, Museo de Arte Contempor, 산티에고, 칠레
‘Tomorrow’, 아트선재센터, 서울, 한국
2006
‘두 도시의 이야기’, 2006 부산비엔날레, 부산, 한국
2005
‘한국현대미술 넷’, 베를린시립 동아시아 미술관, 베를린, 독일
‘쌍쌍’,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서울, 한국
‘한국현대미술가 6인’, 아트센터 실케보그베드, 실케보그, 덴마크
‘Seoul-Until Now! City and Scene’, 샤로텐보그 미술관. 코펜하겐, 덴마크
Critic 1
타인과 나: 관계와 소통의 불가능성에 대하여
우정아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
오인환은 지난 2014년 여름, 플라토 갤러리에서의 전시를 위해 <경비원과 나>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 작업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규범 사이의 긴장관계를 드러내고, 미술관이라는 제도적 질서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익명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일시적으로나마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작가의 지속적인 시도를 잘 드러내 주었다.
‘미술관의 경비원’이란 사실 늘 그곳에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만 굳이 보려고 하지 않는 존재이다. 대부분 미술관의 관람객들은 전시된 작품만을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비원의 임무는 작품을 보는 관람객을 보는 일이다. 경비원에 의해 ‘보는 주체’인 관람객은 ‘보여지는 객체,’ 더 구체적으로는 ‘감시자’에게 ‘감시당하는 자’가 된다.
대체로 관람객으로서 미술관에 들어서는 작가 오인환은 경비원을, 굳이 푸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회가 개인을 감시하는 권력구조의 한 축으로 받아들였다. 플라토의 경우에는 특히, 단정한 양복을 갖춰 입고 귀에 리시버를 꽂은 채 대단히 정중하지만 단호하고도 절도있는 태도로 무장한 젊은 남자들이 ‘경비원’으로 상주한다. 그들의 ‘감시’ 하에서 관람객들은 미술관이 암묵적으로 부여하는 질서에 순응하게 된다.
그러나 작품을 전시하는 작가 본연의 입장에서 오인환이 같은 미술관에 들어설 때, 그 권력의 위계질서는 완전히 뒤집힌다. 미술관은 세 부류의 ‘노동’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미술가의 노동은 ‘창조’라는 고귀한 수준으로 격상되고, 큐레이터의 노동은 ‘학술’에 해당되는 전문 영역인데 반해, 경비원과 미화원 등의 노동은 부가가치가 전혀 없는 단순한 육체노동으로 여겨진다. 즉, 미술가로서의 오인환은 다만 미술관뿐 아니라 현대 사회 전체에 확연하게 존재하는 노동의 계급적 사다리에서 그 정점에 서게 되는 것이다.
오인환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 나아가 변화를 주고자 했던 체계는 이처럼 관람객이며 동시에 미술가인 그 자신과 경비원이 각자 맡고 있는 역할 사이의 복합적인 위계질서와 문화적 의미의 층이다. 그는 작업 기간 중에 플라토의 경비원과 함께할 수 있는 무언가를 구상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대단히 일상적이고도 소박한 ‘만남’을 제시한다.
따라서 그 미술사적 맥락을 짚으라면 우선 1960년대 이후 네오-아방가르드의 제도비판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선례로는 미술관 청소를 작업으로 내세웠던 퍼포먼스 아티스트(작가는 이를 ‘유지관리아트 Maintenance Art’라고 명명했다), 미얼 래더맨 유켈리스(Mierle Laderman Ukeles, 1939년생)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독자적인 퍼포먼스를 펼쳤던 유켈리스에 비해 오인환은 실제 경비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남과 관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좀 더 현대적인 ‘관계성의 미학’ 혹은 ‘참여의 미술’과 연결된다.
관계, 참여, 소통이 현대 미술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이자 지배적인 작업 방식이 된 것도 이미 한참 전의 일이다. 지금은 심지어 진부하게 들리기도 하는 이 단어들이 오인환의 작업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들이 거대한 사회적 담론을 거론하지 않으며, 또한 추상적인 구호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경비원과 미술가가 미술관에서 만나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든 하기 위해서 이 둘은 서로를 알고 조금이라도 친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인환은 플라토의 경비원들에게 작업의 취지를 알리고 마침내 한 명의 지원자를 얻었다. 그들은 10번 만나기로 정하고, 매번의 만남이 끝난 후에는 다음에도 또 만날지 말지를 경비원에게 물었다. 첫 만남에서는 누구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친분을 쌓기 위해 하는 일상적 의례처럼 함께 차를 마셨다. 두 번째 만나서는 좀 더 편안하게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에 작가는 경비원을 자신의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그 간의 작업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열 번의 만남이 끝나면, 작가는 그와 미술관에서 함께 춤을 추기로 했다. 미술가와 경비원이 만남을 더해가며 서로를 이해하는 친밀한 사이가 되어 미술관에서 함께 춤을 추게 되었다면 아마도 한국 현대 미술사에 길이 남을 전설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아니 어쩌면 참여와 소통과 관계가 그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미학’을 등에 업고 감동과 찬탄의 대상이 된 현대 미술의 상황에서는 그토록 이상적인 결말이 오히려 상투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오인환의 작업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비원은 세 번의 만남 이후, 더 이상의 만남을 거절했고, 프로젝트는 거기서 멈췄고, 오인환은 두 달 동안 개인 레슨을 받으며 속성으로나마 열심히 익힌 왈츠를 미술관에서 혼자 추었다. 경비원이 없을 때 그를 대신하는 폐쇄회로카메라 앞에서 말이다. 그렇게 오인환은 미술가로서 미술관에서 ‘감시당하는 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감시의 수단이 미술의 도구로 변화했고, 그 과정에서 ‘감시’와 ‘감상’ 사이의 경계는 허물어졌다.
그러나 이 작업의 성과는 오히려 실패와 미완으로 남은 과정에 있다. <경비원과 나>는 물론, 기존의 작업들 –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곳>, <우정의 물건>, <유실물 보관소>, <만남의 시간> 등에서는 정체성의 문제, 즉 나와 타인과의 ‘차이’에서 오는 긴장, 사회적 규범이 개인에게 부여하는 갈등에 대한 질문들이 결코 ‘동성애’라는 작가의 어떤 한 면모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과연 작업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수많은 층위의 가정과 추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은 경비원과의 일곱 번의 만남을 기록하고자 했던 일곱 개의 부스는 텅 빈 채 전시되었다. 누구든지 자신이 속한 사회적인 위치와 직업적인 규범의 틀을 벗어나는 상황에 ‘참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관계’라는 것은 아무리 상대가 선한 의도와 정당한 대의를 갖고 있을지라도 단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완벽한 ‘소통’이라는 것은 몇 달이면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왈츠의 스텝 정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인환의 텅 빈 공간은 이렇게 미술의 사회 비판적 역량에 대한 무거운 질문들을 던진다. <올해의 작가상> 전시를 통해 비어있는 일곱 개의 부스가 어떻게든 채워지기를 기대해본다. 아니, 그 후로도 여전히 비어있더라도 작가는 그 안에 더 많은 문제와 생각들을 더해 놓을 것이다.
Critic 2
오인환: 태도가 구조가 될 때
우정아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
1. 호명의 구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꽃」, 1952.
오인환은 2006년 부산 비엔날레에서 <이름 프로젝트: 당신을 찾습니다>를 선보였다. 작가는 전시장 벽에 20개의 이름을 적어 두고, 안내 방송을 통해 각각 이름을 주기적으로 부르며 이름의 주인을 찾았다.1 안내 방송을 듣고서 이름의 주인이 찾아오면, 그들은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사진을 찍고 사진 하단에 서명하면 된다. 작가가 선택한 건 ‘한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들’ 중 20개였다. 실제로 그중 필자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이의 이름만 꼽아도 여덟이고, 실제 사람은 동명이인을 포함해 열한 명이나 된다(사실 그중 한 사람은 너무 흔한 이름이 싫어 최근 개명을 했다.) 그렇다고 해도 전시 기간에 부산 비엔날레를 찾는 관람객 중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필 그 이름이 불리는 그 시간에 전시장에 있다가 안내 방송을 들을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만약 ‘김민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방송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르는 김민정이 진짜 나’라는 확신을 갖고 부름에 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김민정’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많은 사람들로 인한 혼란을 적잖이 겪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산 비엔날레에서는 ‘김민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안내 방송을 듣고 오인환의 작품을 찾아 왔다. 무미건조한 인쇄체로 쓰여 있던 벽 위의 ‘김민정’과 ‘珉貞’이라는 두 글자를 둥글둥글하게 흘려 쓴 서명의 ‘김민정’은 마치 전혀 다른 이름처럼 보였다. 그 뒤로 오인환은 더 이상 ‘김민정’을 찾지 않았다. 이제 가장 흔한 이름 중 하나였을 뿐인 ‘김민정’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유일무이한 한 개인으로서의 ‘김민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시인 김춘수는 「꽃」에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론적 권능을 행사하는지 노래했다.2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그’는 시의 화자인 ‘나’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했다. 이렇듯 규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존재는 주체인 ‘나’의 ‘호명(呼名, nomination)’을 통해서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가 완결된 주체인 것도 아니다. ‘나’ 또한 누군가가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주어야만 ‘그의 꽃’이 될 수 있고, 되고 싶어 한다. 그렇게 시인은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고 썼다. 마지막 연의 ‘눈짓’은 처음 시가 발표되었을 때에는 ‘의미’였다가 시인이 나중에 바꿔 쓴 것이다. 무의미한 존재가 의미를 입고 세상 속에서 안정된 위치를 차지하기 데 필요한 것은 이름을 불러주는 일, 즉 ‘호명’이다. ‘호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체와 타자, 양자가 있어야 한다. 주체는 타자의 ‘빛깔과 향기,’ 즉 정체를 규정하고, 그에 합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고유한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관계를 만든다. 그 관계는 일방적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순환한다.
오인환의 작품 전반에는 바로 이러한 상호주체적인 호명의 원리가 관통하고 있다. 전시장에서 ‘김민정’을 부르는 것은 작가지만, 부름에 응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작품에 참여기로 선택하는 건 오롯이 김민정의 몫이다. 김민정이 참여해야 비로소 작품은 완성되고, 작품이 있어야 오인환은 미술가로서 존재할 수 있다. 이처럼 오인환의 작업은 대체로 현장에서 타인들의 존재와 의지에 의해서 완성된다. 따라서 작품의 완결 여부는 외부 환경에 조건부로 열려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임시적일 뿐이며, 미술가로서 그의 지위는 늘 불안정하고 위태롭다. 대한민국에서 커밍아웃한 게이 미술가로서 활동하기로 결정한 이상, 그의 삶의 방식 또한 불안정하거나 때때로 위태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작업이 작가의 삶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고 믿는다.3 따라서 작품의 구조 또한 불안정하고 위태롭다. 태도가 구조가 된 것이다.4
구조는 작품이 작동하여 의미를 산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조형적 양식(formal style)이나 지시적 이미지(referential imagery)와는 구별되는 범주이다. 오인환의 작품에서는 심미적 특성 (aesthetic qualities)이나 형상적 재현(iconic representation), 서사적 텍스트(textual narrative)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업이 때때로 언어와 텍스트를 활용한 ‘개념적 미술’이라고 규정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언어가 조셉 코수스Joseph Kosuth의 작업처럼 미술의 정의에 대한 동어반복적(tautological) 분석이나, 로렌스 위너Lawrence Weiner의 텍스트처럼 자기 지시적(self-referential)이지는 않다. 오인환의 작품이 개념적이라면 그것은 ‘시각적visual’ 혹은 ‘형식적formal’과 반대되는 의미에 가깝고, 역사적 맥락을 찾자면 개념 미술의 제도 비판적 성격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오인환의 제도 비판은 또한 한스 하케Hans Haacke의 작업처럼 미술관이 안고 있는 정치적 한계에 대한 노출에 한정되지 않는다.5
오인환의 미술은 ‘의미’가 ‘취향’이 아니라 ‘권력’의 문제임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개념적이다. 그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미술을 대중에게 선사하는 교조적인 미술가가 되거나, 다수에 도전하기 위해 소수의 대표를 자처하는 권위적인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한다. 정당한 대의를 설파하기 위해 압도적인 스펙터클을 미술관에 부려 놓는 우를 범하지 않고, 판단을 보류한 채 과장된 감정에 몰입하게 하는 센티멘탈리즘 또한 경계한다. 그는 관객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지만, 관객은 스스로 의지를 일으키고 행위를 결정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참여자의 정체성 또한 일시적이나마 유보 혹은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그들은 일상적이었던 자기 인식에 균열이 생기고, 견고하다고 믿었던 스스로의 지각 능력을 불신하게 되며, 절대적으로 고정된 정체성이란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오인환의 작업은 이처럼 위태롭고 불안정한 존재의 조건, 취약한 개인들과 나약한 주체들, 그 미완의 상태를 구조적으로 재연(enactment)한다.
2. 개인과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는 개인들을 주체로서 호명(interpellation)한다.
Ideology interpellates individuals as subjects.
루이 알튀세르,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들」, 1970.
1996년, 오인환은 역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사람을 찾는 작업을 했다. 뉴욕에서 발행되는 주간지 ⌈빌리지 보이스Village Voice⌋의 ‘개인 광고Personal Ads’란에 오인환은 로니 혼, 로버트 고버, 백남준, 하임 스타인벡, 신디 셔먼 등 다섯 명의 미술가들을 찾는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 문구는 “진짜 로니 혼을 찾습니다(Seeking the real Roni Horn)”와 같은 식이었다. 물론 ‘한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과 달리, 이 광고를 본 이들 중 ‘로니 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라는 형용사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 실제 유명 미술가 로니 혼 본인이 광고를 보았다면 ‘나는 가짜라는 말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고, 평범한 누군가가 광고를 보고서 ‘내 안에 진짜 미술가 로니 혼이 있다’고 우겨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 진짜로 찾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로니 혼이나 신디 셔먼이 아니라 작가 자신이다. 그는 이 광고에서 자신을 ‘게이 한국인 남성 미술가GKM Artist’라고 밝히고 커밍아웃했다. 그 이후로 오인환은 어떤 맥락에서도 ‘게이 미술가’라고 우선적으로 정의되었고, 동성애가 작품의 해석을 위한 주요 키워드가 되었다.6
⌈빌리지 보이스⌋의 ‘개인 광고’는 커밍아웃을 위한 역설적으로 완벽한 매체였다. ‘개인’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voice’를 통해 ‘호명’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하지만 「꽃」에서 보았듯이, ‘호명’은 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사적인 관계’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는 늘 개인의 범위를 넘어선 공적 영역을 상정하게 되어있다. 동성애란 근본적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대단히 사적인 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젠더, 신체, 인권, 종교, 법률, 정치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사회과학적 담론으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사적인 영역에 개입하는 공공의 제도를 루이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Ideological State Apparatus)’라고 불렀다.7 주지하다시피, 알튀세르는 ‘억압적 국가 기구(Repressive State Apparatus)’와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를 구분하면서, ‘억압적 국가 기구’는 ‘군대, 감옥, 경찰, 법원, 정부’ 등의 공적 영역의 차원이라고 했다. 반면,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는 ‘가족, 종교, 교육, 커뮤니케이션, 문화’ 등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작용하며 이들은 ‘사적 영역’이라고 정의했다. 물론 억압적 국가 기구와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 양자는 생산관계의 재생산(reproduction of the relations of production), 즉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기존의 계급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억압적 국가 기구’가 유무형의 폭력을 통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반면,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는 ‘호명(interpellation)’을 통해 작동한다는 차이가 있다.8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가 개인들을 주체로서 호명한다”고 했다. 하지만 ‘개인’과 ‘주체’ 사이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다만 개인이 ‘항상 이미(always already)’ 주체라고 언급했을 뿐이다. 예컨대, 가족 안에서 한 개인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아버지의 이름’을 갖도록 결정되어 있고, 특정 가족들이 기대하는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며, 사회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치가 대체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탄생한 개인은 언어와 대중매체가 주입하는 기존 질서에 순응하고 자본주의의 성실한 소비자로서 주체성을 내면화함으로써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알튀세르는 이 과정, 즉 종교, 문화, 교육, 가족의 틀 안에서 “구체적이고 개인적이며 대체 불가능한 주체”로 형성되는 의식(rituals)을 ‘호명’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따라서 알튀세르의 ‘호명’이란 무정형의 존재가 유의미한 존재로 변화하는 결정적인 단계라는 면에서는 김춘수의 「꽃」과 유사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생물학적 존재인 ‘개인’이 기존의 사회 질서로 편입되어 문화적 ‘주체’가 되는 데에 이데올로기라는 ‘국가 기구’가 개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인환의 작품에 나타나는 ‘호명’의 구조는 위의 두 경우, 즉 한 개인이 주체가 되는 상호적 과정 뿐 아니라, 그 과정에 개입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작용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존재도 확연히 드러낸다. 원시 농경사회에서 유래했을 ‘동성동본금혼제’가 21세기에서야 폐지된 대한민국에서 ‘이름’이란 가부장적·신분적 계급사회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기제(device)인 것이다. 오인환의 <이름 프로젝트>에서 최종적으로 주인을 찾은 이름은 11개나 된다. 과연 그들은 ‘한국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었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286개의 성씨 중, 인구 순위 상위 3성(김, 이, 박)의 숫자만 합해도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2천만 명이 넘는다.9 말하자면 한국인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300개가 채 되지 않는 ‘아버지의 이름’ 중 하나를 물려받아야 할 뿐 아니라, 대체로 두 글자인 이름자 중 한 글자는 항렬에 의해 정해져 있고, 나머지 한 글자마저 ‘상서로운’ 의미를 가진 제한된 선택지 중에서 채택된다. 그 결과, 우리는 주로 민첩하거나, 옥처럼 올곧거나, 지혜롭고 현명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10
<우정의 물건>은 부계사회라는 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한 개인의 정체성이 ‘공산품’에 의해 어떻게 정의되는가를 보여준다. 오인환은 지인의 집을 샅샅이 뒤져, 그와 지인이 공통으로 소유한 물건들을 찾아내 가지런히 배열하여 사진을 찍는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같은 물건들을 모두 꺼내서 좌우를 바꾼 모양으로 늘어놓고 사진을 찍는다. 결과적으로 전시장에 나란히 걸린 두 장의 사진 속에서 두 세트의 ‘우정의 물건’들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 이미지가 된다. 과연 ‘물건’은 오인환과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특정인 사이의 ‘우정’을 제유적으로synecdochically 지시한다. ⌈The World of Nam June Paik⌋, ⌈Art in Theory⌋, ⌈Minimalism⌋과 같은 현대 미술 관련 서적들과 삼각대, 필름, 슬라이드 박스는 ‘KM’이라는 이니셜의 인물과 오인환의 지적 배경 및 예술적 취향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세탁비누, 소금, 뉴욕 지하철 정기 승차권, 그리고 게이를 위한 여행가이드인 ⌈스파르타쿠스 2001/2002년판⌋을 공유한 ‘DD’와 오인환은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빨래를 하며, 간간이 외국으로의 여행을 꿈꾸는 평범한 생활인이다. ‘오인환’이라는 사람은 마주 선 거울이 달라질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비춰진다. ‘물건’은 ‘우정’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원인자다. ‘우정’이 바로 ‘물건’의 결과물이다.
3. 아버지의 이름으로
출생증명서는 내가 태어났다고 한다.
나는 이 증명서를 거부한다.
나는 시인이 아니라 시다.
아무리 주체처럼 보일지라도, 써지고 있는 시다.
자크 라캉, ⌈정신 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1981.
A certificate tells me that I was born. I repudiate this certificate: I am not a poet, but a poem. A poem that is being written, even if it looks like a subject.11
알튀세르는 주체의 개념이 주체성(subjectivity)과 종속성(subjection) 양자를 포괄한다고 했다.12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 문장의 주어(subject)와 나를 동일시하고, 무의식적으로 문장의 구조 안에 마련된 주체의 자리에 스스로를 대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호명의 메커니즘에서 중심축을 이루는 것은 언어다. 언어에 의해 생성되고 이데올로기적 호명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알튀세르의 주체론은 자크 라캉의 정신분석학과 맞닿아 있다. 라캉은 언어와 기호의 세계인 ‘상징 질서’로의 진입을 통해 주체가 탄생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간명하게 “나는 시인이 아니라 시”라고 표현했다.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육체, 그 매끄러운 표면 위에 타자들의 무수한 글쓰기가 이루어진 결과, ‘의미화한 몸(signified body),’ 즉 주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인환은 2001년부터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곳>을 전시장에 설치하곤 했다. 그는 미술관 바닥의 ‘매끄러운 표면 위에’ 향가루로 무수한 글씨를 쓴다. 전시회의 개막과 함께 타들어 가기 시작한 향가루는 전시가 끝날 때쯤이면 마치 상처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을 글씨들의 흔적을 남긴다. ‘일반인’의 눈에는 쉽게 인식되지 않는 의미의 글씨들은 전시회가 마련된 도시에 존재하는 게이바와 클럽들의 이름이다. 평론가 정현은 동성애를 일컬어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했다.13 오인환은 말할 수 없는, 혹은 가부장적 질서를 위해 말할 수 없도록 금지된 언어를 대단히 육체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미술관이라는 권위적 제도의 표피 위에 기입한 것이다. 금지되거나 혹은 은폐해야 할 이름을 쓰는 작업은 또 다른 <이름 프로젝트>인 <이반파티>에서도 드러난다. 이는 그가 2004년부터 매년 준비하는 게이 친구들과의 연말파티를 기념하는 포스터다. 파티의 참석자들은 모두 중첩해서 서명했다. 결국,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이 이름들은 알튀세르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의 호명에 응하지 않은 자들이고, 라캉식으로 번역하면 지배적 언어의 상징 질서로 진입하지 않은 자들의 존재를 표시한다.
라캉은 프로이트의 외디푸스 콤플렉스를 재해석해 주체의 성장발달이론을 상정했다.14 고전적인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하면, 외디푸스 전(前)단계에서 남아(男兒)는 어머니를 욕망한 나머지 아버지를 제거하고픈 충동에 사로잡히지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어머니에게 ‘페니스’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녀가 아버지로부터 ‘처벌’을 받아 ‘거세’당했다고 믿게 된다. 따라서 자신 또한 거세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즉 거세 공포(castration anxiety)에 의해, 남아는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억누르고 자기를 아버지와 동일시하며 애정을 어머니로부터 거두어서 다른 여성에게로 전이한다.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가 말한 ‘정상적’ 성장이다. 따라서 자아정체성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결국 페니스의 존재와 부재의 차이에 놓이게 된다.15
라캉은 이처럼 전적으로 육체적인 존재이자, 시각에 의해 감지되는 ‘페니스’의 의미를 재고했다. ‘페니스’의 가치가 절대적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성차의 도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아버지의 권위가 확고한 가부장적 사회 질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캉은 ‘페니스’가 우월한 사회적 위치를 표상하는 ‘부적절한 육체적 상징’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대체할 ‘특권적 기표’로서 ‘팔루스(phallus)’를 제시했다. ‘팔루스’란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기의’가 아니라, 그 가치가 외부의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기표’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텅 빈 ‘기표’에 성차의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권력을 할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가 바로 언어라고 했다. 주체의 선행 조건으로서의 언어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부장적인 법률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성적 정체성을 결정하며, 한 개인을 그 체계 내에 종속시킨다.16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아버지의 이름(nom)’은 동시에 ‘아버지의 금지(non)’를 은유적으로 의미한다. 이는 원초적 존재로부터 유의미한 존재로 이행하는 주체화의 과정에 내재된 억압과 희생, 결핍과 상실에 대한 은유다. 라캉은 이처럼 언어 (혹은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소외되고 분열된 주체를 상징하는 방식으로 대문자 S에 ‘빗금을 친 S’를 썼다. 라캉의 주체($)는 태생적으로 상실과 결핍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위태롭고 불안한’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 혹은 ‘아버지의 금지’에 의해 억압된 실재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라캉은 “언어 속에는 변칙적인 어떤 것,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 즉 ‘아포리아’가 항상 나타난다”고 했다. 아버지의 법의 그물망에는 구멍이 뚫려있어, 언어 이전의 실재(the real)는 끊임없이 재현의 체계를 교란하고 전복시키려 한다. 이것이 ‘실재의 귀환(return of the real)’이다.
오인환의 <사각지대 찾기>는 실재의 눈부신 귀환을 체현했다. 미술관 천장에 달린 폐쇄회로카메라는 저 높은 곳에서 관람객들을 내려다보며 이 말끔한 백색의 공간에 차분하게 순응하는 주체들을 주시한다. 벽에 걸린 모니터는 티끌 하나 없이 단정한 갤러리를 천천히 오고가는 관객들을 비추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오인환의 갤러리로 걸음을 옮기면 모니터 상의 영상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 펼쳐져 있다. 오인환은 카메라의 시선에서 벗어난 벽면을 온통 화려한 핑크빛 테이프로 뒤덮었다. ‘사각지대,’ 즉 카메라의 앵글에 잡히지 않는 잉여의 공간, 감시의 시선에 저항하는 면적, 지배적인 재현의 체계를 회피한 잔여 세력은 생각보다 넓다. 오인환의 핑크 테이프는 이데올로기의 호명으로부터 배척되었으면서도 끈질기게 자신의 현전을 주장하는, 기호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실재적으로 존재하는, 언어의 속성이 아니면서도 언어 안에 존재하는 ‘타자’의 체현이다. ‘타자’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집단주의와 가부장제가 견고하게 결속한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 안에서는 누구라도 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인환은 전시의 공식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작업의 과정을 기록하는 영상물에도 출연하지 않았다. 작가는 그 스스로 공적인 시선이 포착할 수 없는 잉여의 공간 – 사각지대에 존재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4. Here, There, Homeless
오인환은 2000년부터 <거리에서 글쓰기Street Writing Project>를 하고 있다. 그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 즉흥적으로 영어의 알파벳을 쓰고, 사진으로 찍어 두었다가, 전시할 때는 사진들을 배열하여 단어를 조합해내곤 했다. 그 재료들이란 빵부스러기, 떨어진 꽃잎, 담배꽁초, 깨진 유리조각 등 대체로 쓰레기나 다름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쓰고 버려지기 전까지는 대단히 아름답거나 유용하고 그 주인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주었을 소중한 존재들이었다. 오인환은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알파벳이라는 글자를 만들어, 의미를 부여하고, 이 글자들을 모아 단어를 썼고, 이 단어들을 이후에 전시실에 걸어 미술품으로 변화시켰던 것이다. 물론 오인환이 거리를 떠나고 나면, 글자들은 곧 허물어져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한때 꽃이었다가 시들어 떨어진 꽃잎들’이 아니라, ‘한때 미술품이었다가 흩어진 부스러기들’이 되는 것이다. 그들이 한데 모여 HERE, THERE, HOMELESS 등의 단어가 되었다. 오인환은 혹은 우리들은 모두 ‘여기’나 ‘저기’에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의미들 사이를 부유하는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존재들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