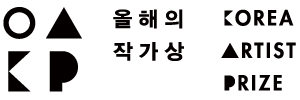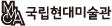김지평

Interview
CV
1976년 서울 출생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
학력
2001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 서울, 한국
1999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동양화과 학사, 서울, 한국
주요 개인전
2023
《없는 그림》, 인디프레스 갤러리, 서울, 한국
2020
《먼 곳에서 온 친구들》, 아트스페이스 보안 1, 서울, 한국
2019
《기암열전奇巖列傳》, 갤러리 밈, 서울, 한국
2017
《재녀덕고才女德高》, 합정지구, 서울, 한국
2015
《평안도平安圖》, 아트컴퍼니 긱, 서울, 한국
2013
《찬란한 결》, 가나아트 컨템포러리, 서울, 한국
2009
《옐로+퍼플》, 카이스갤러리, 홍콩
2007
《보더 라이프》, 인사아트센터, 서울, 한국
2003
《책거리 그림》, 갤러리 라메르, 서울, 한국
주요 단체전
2025
《올해의 작가상 2025》,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2024
민화와 K팝아트 특별전 《알고 보면 반할 세계》, 경기도미술관, 안산, 한국
《우리가 그랬구나》, 더페이지갤러리, 서울, 한국
2024부산비엔날레 《어둠에서 보기》, 부산현대미술관, 초량재, 부산, 한국
2023
《간신히 대수롭지 않게》, 평화박물관 스페이스99, 서울, 한국
2022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정부미술은행 프로젝트: 공공 × 김지평》, 강남대로 G-LIGHT 미디어, 서울, 한국
《Past. Present. Future》, 송은, 서울, 한국
2021
《제21회 송은미술대상전》, 송은, 서울, 한국
《아으다롱디리》, 디스위켄드룸, 서울, 한국
근현대미술기획전 《황혜홀혜恍兮惚兮》,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한국
《설탕과 소금》, 술술센터, 서울, 한국
2020
《모두의 소장품-레퍼런스 룸》,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2019
《드로잉 룸》, 아트 스페이스 풀, 서울, 한국
2019 상하이국제종이비엔날레 《Feasts on Paper》, 펑시엔구박물관, 상하이, 중국
《산수 – 억압된 자연》, 이응노미술관, 대전, 한국
《서재의 유령들》, SeMA 창고, 서울, 한국
2018
《상상의 통로》, 연강갤러리, 연천, 한국
2017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1999–2017: 인식적 지도 그리기》,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
《하늘 본풀이》, 자하미술관, 서울, 한국
《근래안부문여하近來安否問如何》, 인디프레스 갤러리, 서울, 한국
2016
《앉는 법》, 인디프레스 갤러리, 서울, 한국
《사회 속 미술 – 행복의 나라》,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2015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 2015 《동송세월同送歲月》, 동원한의원, 철원 / 아트선재센터, 서울, 한국
2014
《영화 ‘만신’ 아트워크》, 아트나인, 서울, 한국
2012
《메타제국》, 엑스코, 대구, 한국
《민화, 범상치 아니하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이천, 한국
《매화꽃이 있는 정원》, 환기미술관, 서울, 한국
《책거리 특별전: 조선 선비의 서재에서 현대인의 서재로》, 경기도박물관, 용인, 한국
2010
《남녀의 미래: No More Daughters & Heroes》,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고양, 한국
《책, 미술과 만나다》, 금산갤러리, 파주, 한국
《왕릉의 전설》,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고양, 한국
2009
《온고지신》, 가나아트센터, 서울, 한국
《전통의 재구성 – 책거리 그림》, 북촌미술관, 서울, 한국
2008
《Meme Trackers》, 송장미술관, 베이징, 중국
2007
《어린이 민화 체험전》, 경기도박물관, 안산, 한국
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한국
《모란 이후의 모란》,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한국
2006
《여자를 밝히다》, 페이퍼테이너 뮤지엄, 올림픽공원, 서울, 한국
2005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
《믹스 앤 매치》,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한국
《서울청년미술제: 포트폴리오 2005》,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리메이크 코리아》, 코리아나미술관, 서울, 한국
2004
《SeMA 2004 – 여섯 개의 이야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경계 밖으로 튀어 오르다》, 갤러리 꽃, 서울, 한국
《정물예찬》, 일민미술관, 서울, 한국
2001
《시대의 표현-상처와 치유》,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한국
《무한광명새싹알통강추전》, 정독도서관, 서울, 한국
주요 기획
2020
《산수문화 아카데미》, 산수문화, 서울, 한국
2019
《땅 밑에 별들》, 숭례문, 산수문화, 서울, 한국
2011
《집전》, 이언갤러리, 서울, 한국
주요 기금
2020/2023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서울, 한국
2019–2020
서울문화재단 창작예술공간지원, 서울, 한국
주요 레지던시
2012
류안 창작스튜디오, 서울, 한국
2008
시테 앵테르나시오날 데 자르, 파리, 프랑스
2006
가나아틀리에, 양주, 한국
주요 출판물
2025
김지평·김경연·박찬경·소진형·이은주·임옥희·조인수·캐롤 잉화 루·한윤아. 『먼 곳에서 온 친구들 – 김지평 작업과 비평』. 서울: 타이그레스 온 페이퍼
주요 소장처
경남도립미술관,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한국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세르베 컬렉션, 벨기에
송은문화재단, 한국
아모레퍼시픽미술관, 한국
양평군립미술관, 한국
일주학술문화재단, 한국
Critic 1
느리고 꾸준히: 김지평의 작업을 통해 빚어가는 새로운 세계와 오래된 세계
베라 메이 (요크대학교 미술사학과 전임 강사)
김지평의 작업을 처음 마주하면, 마치 연극 무대 배경처럼 ‘그저 배경의 일부’로 치부하기 쉬운 사물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류학자 알프레드 겔(Alfred Gell)이 말한 것처럼, 이 예술 오브제들에 ‘행위주체성’이 깃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1 사람들이 세상에 결과와 영향을 만들어내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듯, 김지평의 오브제들 역시 그런 자율성을 띤다. 이렇게 김지평의 설치 작업 속으로 들어서면, 한국 전통 예술의 재료를 다듬는 작가의 손끝에서 태어난 물질들이 우리의 주체성을 다른 차원의 세계와 대면하게 이끈다. 이 글은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가 말한 ‘세계-짓기’ 개념, 즉 세계가 ‘사물-짓기’를 통해 존재하게 된다는 사유로 《올해의 작가상 2025》 출품작들을 함께 둘러보는 여정이다.2
병풍에 펼쳐진 윤회의 여러 풍경
병풍은 한국의 장식 미술과 순수 미술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왕실과 양반가를 꾸미는 오브제로 존재해왔다. 병풍은 주로 방 뒤편에 놓였고, ‘병풍 같다’는 말은 눈에 띄지 않고 특별한 영향력이 없는 사물을 가리키는 은유로 쓰이기도 한다.3 한국의 종교 및 문화 의례와 전통은 자생적 요소들로만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아시아의 식민 공동체들과 이뤄진 접촉을 통해 전개된 다양한 교류의 혼합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일상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만들어진 사물들로부터 진화하는 전통의 형식들을 볼 수 있다. 병풍에 그려진 풍경들 사이에도 이런 맥락이 흐른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인 〈해학반도도海鶴蟠桃圖〉(1902)는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례로, 원래 미국 호놀룰루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었다. 이 병풍에서는 구름과 하늘이 마치 벽지의 무늬처럼 경계 없이 이어지고, 화려한 금박이 여백을 표현하며, 학과 복숭아가 자연 세계의 풍요와 평온함을 드러내듯 화면에 스며든다.
이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진 병풍들은 동아시아 각지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그 ‘기원’이나 출처, 어떤 국가의 틀에 속하는지를 다루는 역사화 과정에서는 종종 논쟁이 벌어진다. 이들은 각국의 양식과 정체성을 입증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동아시아 전역에서 이뤄진 선물 교환 문화나 외교적 양식 변화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4 그러나 김지평은 이른바 “자기반성의 장르”5라 불리는 동양화와 수묵화를 배웠음에도 이러한 형식을, 전통을 무비판적으로 찬양하는 지표로만 여기지 않는다. 〈산수화첩〉(2023–2025) 연작에서 그림책을 디오라마로 변형하거나 〈다성多聲 코러스〉(2023–2025) 연작에서 옛 병풍을 업사이클링해 한국의 일상적 민담과 삶에서 가져온 원형적 인물들로 새롭게 채워 넣는 방식은 앞서 언급한 국가 소장품들의 장엄한 거리감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김지평의 병풍은 오히려 집안을 꾸미는 일상의 미학을 담으면서도, 물질적 형태 그 자체로 살아있는 행위자가 되어 또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연다. 작가가 직접 수집하고 콜라주한 재료를 공예적으로 결합해 태어난 이 오브제들은 병풍 각각에 부여된 원형을 통해 다른 존재들을 가리키며, 애니미즘적 성격을 띤다. 이들은 이제 이상화된 자연의 투영으로 관객과 거리를 두지 않고, 한국의 일상에서 마주칠 법한 인물들과의 만남 안에서 존재한다.
병풍의 용도는 기능보다 미학적인 것이었지만, 보통 옷을 갈아입을 때 시선을 가리는 용도로 활용되는 등 개방된 실내 공간에서 분할이라는 환영을 만들어내는 오브제로도 쓰였다. 병풍의 매력은 시야를 가리는 도구로서 지닌 모호함에서 비롯되기도 하는데, 이는 병풍이 은밀히 훔쳐보는데 쓰이는 낭만적 도구가 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 김지평의 작업에서 병풍은 또 다른 종류의 모호함을 체현하는 장치가 되어, 무당, 아줌마, 디바, 군인, 샐러리맨, 록스타 등 다양한 한국적 인물의 원형을 재현한다. 작가가 수집해 조합한 갖가지 문양과 의복의 표식들은 병풍 위에 마치 피부나 옷처럼 얹혀 이들을 드러낸다. 김지평의 병풍은 남녀가 밀고 당기는 유희의 도구가 아니라, 한국에서의 삶이 지닌 사회적·시각적 풍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대신하는 애니미즘적 존재로 기능한다. 이 병풍들은 우리의 단일한 경험을 넘어서는 위치와 세계로 향하는 통로이자 연결점으로, 한국의 삶에서 겪는 다양한 국면을, 말하자면 불교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의 순환, 즉 윤회를 보여준다.
이처럼 도상적 원형들을 통해 이뤄지는 만남은 이 오브제들을 마치 사람인 듯 대하며 맺는 애니미즘적 ‘만남주의’의 형태다. 이 병풍들을 통해, 또한 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넘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매개라고 여김으로써, 전통적 병풍화는 전복되고 만다. 유럽 계몽주의 사유에서 만남의 변증법은 ‘자아’와 ‘타자’라는 환영적이고 이념적인 분리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불교적 틀에서는 이런 구분이 무너진다. 깨달음의 역할에 대한 고유의 믿음이 존재하는 불교에서는 자아가 아닌 ‘무아無我’만 존재할 뿐이다.6 더 나아가, 미술사학자 로저 넬슨(Roger Nelson)은 ‘만남주의’를 자아와 타자의 위계적이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구분을 전제하는 원시주의와 ‘대조되는’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7 이는 차이를 마주했을 때 소외나 거리가 발생한다는 통념과는 차이가 있다. 김지평의 병풍 속 다양한 인물군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냄으로써, 접근하기 어려운 장엄함이 아닌 일상으로부터 차이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낸다.
애니미즘의 핵심은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이다. 애니미즘은 살아있음의 가능성을 단지 감각을 지닌 존재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예술가의 손은 병풍 가운데 한 폭에 등장하는 무당의 기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무당은 비인간적이고 심지어 인간을 넘어서는 물질들에서 나타나는 존재들과의 만남을 매개하는 중개자다. 다양한 천 조각을 이어 붙여 만든 이 병풍들은 관습적으로 무생물로 여기는 대상으로부터 인간의 주체성을 인식하게 한다. 한국 문화에서 무당이라는 역할은 근대화와 함께 유입된 여러 종교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며 역사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그러나 한국의 샤머니즘과 애니미즘은 가정이라는 영역이 영혼과 조상들이 머물며 돌봄을 요하는 곳으로, 영적으로 특히 충만한 공간이라고 여겨왔다.8 무당은 또한 불운과 나쁜 혼령들을 막는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한다. 애니미즘은 현대 한국에서 널리 퍼진 주요 일신교들과 달리 아시아 문화권에서 흔히 나타나는 혼합주의적 형태를 고유하게 보여주며, 다양한 문화적 교류의 통로가 되고, 어쩌면 시대를 앞선 원초적 세계주의의 형태를 제시한다고도 할 수 있다. 무당이 다른 차원을 오가는 능력은 은유적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을 넘어선 행성적 스케일을 넘나드는 사물과 예술작품의 이동과 닮았다.
무당과 예술가 사이의 또 다른 유사점은 예술가가 관객과 재료를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키는 능력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의 손은 단순히 무언가를 창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한 시간과 장소의 흔적을 함께 새겨 넣는다. 미술사학자 파멜라 코리(Pamela Corey)는 공예와 개념주의의 관계를 ‘민족적 정체성을 지닌 촉각적 제스처’로 설명하면서, 재현의 증거가 이처럼 손으로 이뤄진 노동의 창조 과정을 통해 드러나며 “자신이 지닌 사물성의 본질을 수행적으로 선언한다”라고 말한다.9 수묵의 전통, 특히 병풍화를 살펴보면 전통 공예 문화에서 병풍이 지닌 다양하고 혼종적인 경향은 익숙한 인물들을 가리키면서 지역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통적·민족주의적 틀을 넘어설 수 있는 상징적 지위를 획득한다.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다
김지평의 신작 〈코즈믹 터틀〉(2025)은 ‘인간 너머의 존재’ 혹은 ‘다중자연주의’라 불리는 것, 다시 말해 인간 의식을 예외적인 것으로 두지 않고 다양한 종들 간 상호의존의 역량 속에서 인식론이 어떻게 자리하는지를 탐구하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10 작품 제목은 거북이가 등껍질에 온 세상을 짊어진다는 익숙한 신화를 참조한다. 이는 전체 지식 체계에 대한 은유로 읽힐 수 있으며, 영어 격언 ‘어깨에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다’처럼 짐을 짊어진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 이는 올림포스 신들에 반기를 든 대가로 땅을 등에 짊어져야 했던 그리스 신화 속 아틀라스를 떠올리게 한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라는 개념은 대개 토끼와 거북이 우화에 등장하는 거북이의 특성과 연결된다. 거북이는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전략을 이용해 성취를 이루는 끈기 있고 한결같은 동물로 나타난다. 이는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문화뿐 아니라 태평양 지역 등 여러 문화권에서 거북이를 상징으로 삼는 수많은 참조망을 이룬다. 이와 동시에 김지평은 〈코즈믹 터틀〉을 여러 조각의 목판화로 분절해 설치가 놓인 전시 공간에 흩뿌린다. 조각적이면서도 은유적인 이 존재는 작가가 상상하는 ‘세계 속의 세계들’과 혼합주의, 인간 너머의 세계와의 만남을 암시한다.
김지평의 〈코즈믹 터틀〉은 인쇄 기술을 암시함으로써 세계 안에서 개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지식이 나무와 종이의 접촉 과정을 통해 어떻게 문자 그대로 각인되는지를 떠올리게 한다. 최초의 인쇄본은 닥나무로 만든 한국 전통 제지 기법을 특징으로 했는데, 이는 훗날 병풍에 그림과 도판을 담는 데 사용된 재료이기도 했다. 세계는, 학자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인쇄 자본주의’라 부른 것의 확산, 즉 저렴한 종이와 목판 인쇄라는 기계적 복제로 구현된 인쇄물을 통한 언어 유통이 자아낸 공통의 이해 속에서, ‘상상의 공동체’로 결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 덕분에 메시지를 멀리,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속도로 텍스트 생산이 가능해졌다. 1440년경 유럽 전역에 성경을 전파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고 종종 세계 최초의 인쇄본으로 잘못 알려진 구텐베르크 인쇄물이 등장하기 200년 전인 1234년, 고려에는 이미 현지에서 잘 알려진 인쇄술이 존재했다. 최초의 인쇄본은 유교 경전이었으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은 684년에서 704년 사이 제작된 불교 경전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으로 1966년 경주 불국사에서 발견되었다. 또 다른 불교 경전인 『금강경金剛經』(868)은 경전 마지막에 ‘널리 배포하라’는 표현이 있어 사실상 저작권 없이 자유롭게 제작된 최초의 책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봉헌물로서의 예술작품
〈다성多聲 코러스〉 연작의 한국적 원형들과 〈코즈믹 터틀〉의 목판 조각들로 이뤄진 설치에서, 김지평 작업 속의 연결망을 일종의 응축된 생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작품들은 생명을 얻어 움직일 잠재력을 품고, 관객이 작품을 바라보는 동시에 작품도 관객을 응시한다. 집이라는 공간에서 영혼들은 관심과 돌봄을 필요로 하고, 그들을 살려두기 위해 정성껏 올리는 봉헌물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김지평은 한국 문화 전통를 다루는 폭넓은 수련을 통해 궁중적이고 장인적인 예술 전통에 깊이 발을 딛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신화적인 것을 다룰 때조차 근면과 겸손을 기리며 땅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에 대한 경의를 담아낸다. 거북이, 병사, 디바-할머니, 무당, 외로운 샐러리맨 등은 역사의 중심적 인물이라기보다 묵묵히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가며 그 안에서 세계를 만들어가는 존재들이다.
1. Alfred Gell, Art and Agency: An Anthropological Theory (Oxford: Clarendon, 1998).
2. R. Raj Singh, “Heidegger and the World in an Artwork,”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48, no. 3 (1990): 215–222.
3. Han-Sol Park, “AmorePacific Museum of Art Brings Joseon-Era Folding Screens to Center Stage,” The Korean Times, Jan. 31, 2023, https://www.koreatimes.co.kr/lifestyle/arts-theater/20230131/amorepacificmuseum-of-art-brings-joseon-era-folding-screens-to-center-stage.
4. Kim Soojin, “Desire for an Empire: The Painted Folding Screen Sea, Cranes, and Peaches at the Honolulu Museum of Art,” Journal of Korean Art and Archaeology (JKAA) 12 (2018): 45.
5. 이영욱·박찬경, 「앉는 법: 전통 그리고 미술」, 『레드 아시아 콤플렉스』, 김항 외 지음, MMCA 작가연구 2(서울: 국립현대미술관, 2019).
6. Ashley Thompson, “In the Absence of the Buddha: ‘Aniconism’ and the Contentions of Buddhist Art History,” in A Companion to Asian Art and Architecture (Hoboken: John Wiley & Sons, Ltd, 2011), 398–420.
7. Roger Nelson, “‘My World Is Modern’: Deprovincialising Chen Cheng Mei and You Khin, Artists from Southeast Asia Who Traversed the Global South,” Southeast of Now: Directions in Contemporary and Modern Art in Asia 5, no. 1 (2021): 205–249.
8. Laurel Kendall, Shamans, Housewives, and Other Restless Spirits Women in Korean Ritual Life, Studies of the East Asian Institut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7).
9. Pamela N. Corey, “Beyond Yet Toward Representation: Diasporic Artists and Craft as Conceptualism in Contemporary Southeast Asia,” The Journal of Modern Craft 9, no. 2 (May 3, 2016): 161–181.
10. Jamie Lorimer, Timothy Hodgetts, More-than-Human (Abingdon, Oxon: Routledge, 2024).
Critic 2
동양화의 동시대성 ― 김지평의 작업에 관한 소고
김홍기 (미술평론가)
회화는 느린 매체다. 하지만 처음부터 느린 건 아니었다. 회화는 그저 자기의 템포와 리듬을 꾸준히 유지해 왔을 따름이다. 빨라진 건 기술과 산업의 갈급한 발전에서 비롯된 문명의 현기증 나는 속도일 뿐이다. 기술문명의 성과는 예술의 표현 수단에도 급속히 반영되었다. 사진의 발명으로 회화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신속한 현실의 재현이 이루어졌고, 영화의 탄생으로 공간의 재현뿐만 아니라 시간의 재현이 가능해졌고, 뒤이어 등장한 비디오 기술은 무빙 이미지의 생산과 전송을 실시간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었다. 오늘날 디지털 매체는 온갖 종류의 시청각 정보를 순식간에 동일한 코드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젖혔다. 이와 같은 일련의 매체적 진화는 시간을 가속화한다. 특히 디지털 매체 환경에 이르러서는 시간을 원자화한다. 한병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도 시간의 원자화에 기인한 것이다. 시간의 분산은 지속의 경험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어떤 것도 시간을 늦추지 못한다. 삶은 더 이상 지속을 수립하는 질서의 구조나 좌표 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1
분산된 시간은 어떤 착시를 만들어 낸다. 지속의 경험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면 현재를 정의하는 시간이라곤 죄다 빠르게 지나가는 것만으로 이루어졌으리란 착각이 불쑥 자리를 잡는다. 엄청난 고해상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스트리밍 되는 시간, 지구 반대편의 소식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시간, 저곳의 삶의 형태가 이곳의 삶의 형태와 다르지 않은 시간, 끊임없이 낙후되고 갱신되는 총체적인 동기화의 시간만이 이 가속화된 시대를 채우고 있다는 환상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가다듬으면 가속화된 기술 진보에 관련된 것들은 오히려 많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으며, 그 사이에 달은 열두 차례 차고 이지러지기를 거듭하고, 임산부는 대략 열 달을 채워야만 출산의 순간을 맞으며, 대부분의 인간의 심장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엇비슷한 템포로 박동하고, 한반도 명산의 기암괴석은 기후 변화나 지정학적 흥망성쇠에도 아랑곳없이 광물의 시간을 살아내고,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는 우주가 생겨난 이래로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분명히 가속화된 기술적 대상들이 숱하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느릿한 각자의 리듬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가득히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모여 우리의 동시대성을 이룬다. 느린 것들은 상대적으로만 느린 것들이다. 그리고 그런 것 중에 회화가 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자면 회화는 원래 느린 매체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 느린 매체가 되었다. 그리고 원자화된 시간 속에서 동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듯한 혐의를 짊어지게 되었다. 회화 중에서도 동양화는 이중의 혐의에 사로잡혀 있다. 근대의 산업혁명을 서양이 주도했던 까닭에 동양화는 이미 매체적으로 뒤처진 회화에 속하는 데다가 더욱이 기술적으로 뒤처진 동양의 것이기에 이중으로 뒤처진 예술 장르라는 혐의에 시달려야 했다. 이렇게 급작스레 오명의 꼬리표가 붙은 동양화는 스스로 동시대의 것이기를 부인하고 ‘전통’이라는 대척점으로 물러나면서도, 어떻게든 동시대로 월반해야 한다는 조급증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른바 ‘전통의 현대화’라는 명제를 내걸고 자기 쇄신을 통해 동시대의 빠른 속도를 따라잡으려 애썼던 것이다. 이중으로 뒤처진 취급을 받은 동양화는 엉금엉금 느리게 움직이는 거북이로 여겨졌다. 하지만 제논의 역설과는 반대로, 이 느린 동물은 까마득히 앞서가는 아킬레스를 따라잡기 위해서 여하간에 속도를 높여야 하는 불가능한 임무를 스스로에게 부과했다. 이와 같이 동양화가 과중한 역할을 자임하게 된 데에는 분산된 시간이 야기한 착시에 그 원인이 있다. 속도에의 열광에서 비롯된 ‘빠른 현대’와 ‘느린 전통’이라는 기만적 대립이 동양화에게 자기 초월을 꿈꾸는 빠른 거북이가 되라고 부조리하게 부추겼던 것이다.
김지평은 느린 매체로서의 회화를 추구하지만 과거에 대한 향수에 사로잡히지 않고, 동양적인 것에 각별한 관심을 갖지만 그것이 오늘날 되살려야 할 아득한 과거의 전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가 몸담은 동시대가 빠름만큼이나 느림이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이고, 그가 들여다보는 동양이 반드시 과거에 억류된 전통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철저히 동시대성을 견지하며 그 안에서 발견되는 동양화를 사유하고 실천한다. 이런 의미에서 일찍이 박찬경은 김지평의 작업이 “전통 회화나 현대미술 ‘속에만’ 있지 않고, 전통 회화와 현대미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2 김지평에게 전통이냐 현대냐 하는 문제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동시대성을 함께 구성하는 이질적인 두 개의 시간적 템포에 해당한다. 그에게 동양화란 전통적인 것만큼이나 현대적인 것이고, 동양화의 느림이란 현대 문명의 빠름만큼이나 그가 속한 동시대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전통 회화와 현대미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가 감각하는 동시대성의 복합적이고 상대적인 속도에 대해서 사고한다는 얘기다.
가속화된 매체로 포섭할 수 없는 사물의 느릿한 템포, 원자화된 시간으로 해체할 수 없는 역사의 진득한 지속이 김지평의 작업이 보여주는 특유한 ‘현대미술’에 담겨 있다. 작가의 이런 특징을 박찬경은 “되감기”라 일컬으며, “재야 전통의 ‘현대화’는 ‘현대(서양)의 되감기’와 교차할 때, ‘전통의 현대화’와 같은 경직된 목표 추구의 언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한다.3 현대가 곧 서양과 동일시되고 그 특징이 시간의 빨리 감기라고 한다면, 김지평은 그렇게 단순화된 현대의 규정을 되감기 함으로써 복합적이고 변증법적인 시대의 실상을 도출해 낸다는 것이다. 전통의 현대화가 빠름에 대한 맹목적 열망에서 비롯된 “경직된 목표 추구”라고 한다면, “현대(서양)의 되감기”는 현대에 대한 그 협소한 이해의 감춰진 이면을 가시화하려는 시도다. ‘전통의 현대화’는 언제나 ‘현대의 전통화’와 함께 사고되어야 한다. 이런 변증법적 시각 하에서만 우리의 동시대성은 온전히 이해된다. 아킬레스는 거북이의 현재가 아니며, 거북이는 아킬레스의 과거가 아니다. 이들은 같은 시공간 속에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존재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술의 동시대성은 빨리 감기와 되감기의 변증법을 통해 파악되는 것이다.
동양화라는 거북이는 시대에 뒤처진 느림보가 아니다. 이런 착각은 원자화된 시간의 착시가 불러일으킨 협소한 시야에서만 통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야를 최대한 넓혀야 한다. 이는 공간적인 측면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 특히 시간적인 측면에서 곱씹어야 하는 제언이다. 달리 말하자면 현재의 찰나에 주목하는 협소한 시야가 아니라 지속의 두께를 감각하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야를 통해 드러난 동양화는 역시 느린 거북이지만 그럼에도 두터운 현재를 산다. 그 두터운 현재 속에서는 느린 거북이도 살고 빠른 아킬레스도 산다. 김지평의 동양화와 동시대성이 그런 것이다. 그는 병풍이나 족자 같은, 이른바 ‘전통’ 회화의 틀을 주제로 작업을 구상할 때 자신이 고미술을 다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당근마켓에서 작업에 사용할 병풍과 족자를 사들인다.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제례나 장식의 목적으로 병풍이나 족자를 필요로 하기에 이것들은 오늘도 곳곳에서 제작되고 유통된다. 그러다가 각자가 보유한 짐스럽고 남아도는 것들은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로 재거래되기도 한다. 이 값싼 현대의 기성품에는 원본 수묵화가 아니라 그것을 복제한 인쇄물이 붙어 있고, 그 뒷면에는 신문지가 덧대어 있기도 하다. 김지평이 작업의 원천으로 삼는 것들이 이런 현대의 병풍과 족자이다. 중고품 거래 앱에서 신상 스마트폰과 동일 선상에서 거래되는 현대적인 기성품인 것이다.
지속의 두께를 최대한 넓히면 우리는 어쩌면 우주적인 시각을 갖게 될는지 모른다. 오늘 밤하늘을 수놓은 총총한 별들은 우리의 동시대성을 이루는 지속의 두께를 망라한 총체적인 지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밤하늘의 수많은 빛은 각자 다른 시간대에 탄생하거나 심지어 이미 소멸한 별들이 보낸 신호이다. 게다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까닭에 그 신호가 우리에게 닿지 않는 어둠 속의 별마저도 밤하늘의 어딘가에 있다. 태고의 시간부터 지금까지 한자리에 펼쳐진 밤하늘의 별자리는, 동시대성이 포괄할 수 있는 지속의 최대치가 평면적으로 펼쳐진 장면과도 같다. 이런 맥락에서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은 동시대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의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도달하려 애쓰지만 그럴 수 없는 이 빛을 지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시대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인은 드물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용기의 문제이다.”4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고 모두가 동시대인인 것이 아니다. 동시대인이란 가시적인 현재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이지만 공존하는 다른 시간까지 함께 지각하는 자이다. 그리고 진정한 동시대성이란 현대의 빠름뿐만 아니라 전통의 느림까지, 전통의 현재뿐만 아니라 현대의 전통까지, 시간의 빨리 감기뿐만 아니라 되감기의 벡터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즉, 동시대성이란 (…) 위상차와 시대착오를 통해 시대에 들러붙음으로써 시대와 맺는 관계이다.”5 시간의 가속과 감속 사이의 위상차, 사건의 연대기를 횡단하는 시대착오를 긍정하는 용기가 비로소 우리를 동시대인으로 만든다.
동양화를 거북이에 빗댄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양자에 공통으로 느림과 뒤처짐의 이미지가 씌워져 있기 때문이지만 또한 김지평의 이번 전시가 거북이를 이야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작가는 전시의 제목으로 〈코즈믹 터틀〉(2025)을 내세운다. 이 ‘우주의 거북이’는 김지평이 어쩌면 드문 동시대인일 수 있다는, 또는 적어도 그 동시대인의 요건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가 전시에서 다루는 동시대의 거북이는 우주의 지속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고대 중국 신화에 따르면 거북은 우주의 기원과 관련이 깊다.6 예컨대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의 신화가 있다. 하도는 중국 복희씨 때에 황허강黃河江에서 용마龍馬가 지고 나왔다는 쉰다섯 점으로 된 그림이며, 낙서는 중국 하나라의 우왕이 홍수를 다스릴 때에 뤄수이강落水江에서 나온 거북이 등에 씌어 있었다는 마흔다섯 개의 점으로 된 아홉 개의 무늬이다. 태극과 팔괘의 효시로서 주역의 기본 이치가 된 하도와 낙서는 북극성 중심의 방위를 나타내는 도안이었다는 주장도 있다.7 여하간 이런 신화에 따르면 용마는 그림圖을, 거북은 문자書를 인류에게 전해준 셈이다. 즉, 이것은 인류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다. 중국의 또 다른 신화에 의하면 거북은 세계의 토대이다. 거북의 둥근 등갑은 하늘이고 평평한 복갑은 땅이다. 이처럼 거북이란 중국의 신화적 전통 속에서 세계의 기초이자 문명의 기원이다. 김지평의 동양화, 김지평의 거북이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그가 불교의 심우도尋牛圖처럼 일련의 이야기 형식으로 그린 ‘코즈믹 터틀’의 일대기는 하늘에 수 놓인 별자리, 낙서를 등에 새긴 거북이, 거북이 뱃속에서 춤추는 사람들의 이미지로 이어진다.
그러나 김지평의 작업 속에서 이 굼뜬 신화의 거북이는, 날쌘 현대 문명에 추월되고 낙오된 과거의 덧없는 전통으로 유폐되지 않는다. ‘코즈믹 터틀’의 일대기는 기원적 신화를 거쳐 근대 기술문명의 번영과 이로부터 비롯된 파괴의 장면으로 계속 이어진다. 몇 해 전 동해 연안에서 폐사한 바다거북의 내장에서 비닐 재질의 물체가 발견되었다. 이물질을 씻어내자 그 물체에 빼곡하게 적힌 작은 글자들이 드러났다. 그것은 분단국가의 이념 투쟁과 선전 선동의 상징과도 같은 ‘삐라’였다. 인간에게 문자를 선물한 고대의 거북이는 그 선물이 잔뜩 쓰인 비닐을 삼킨 채 폐사했다. 김지평의 회화 속에서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 문명의 생태 파괴는 그 문명의 시원과 함께 ‘코즈믹 터틀’의 일대기로 몽타주 된다. 이것이 김지평이 지각한 지속하는 시간의 두께이며, 시대착오를 통해 확보한 동시대인의 태도다. 이런 우주적 관점에서 그에게 동양화는 여타 현대미술과 상이한 느림의 템포로 동시대적 관계를 형성하며 그것들을 되감기 한다.
동양화의 장르 중 산수화에 대한 김지평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그에게 산수화는 오늘날에도 매우 유효한 표현 수단인데,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도 한반도 대부분에 산과 물이 고유한 시간의 템포를 지키며 존재하기 때문이다. 산과 물은 현대 문명의 변화 속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자연적 느림의 동시대성을 반영한다. 분단의 상황 속에서 산과 폭포와 강을 위장용 페인트칠이 된 군사시설과 함께 그린 〈미채산수도〉(2009), 외가의 고향이지만 왕래할 수 없는 관서 지방을 산수화와 지도 양식을 혼합하고 문헌자료를 참고해 캔버스에 먹과 금니金泥로 그린 〈평안도〉(2014) 등이 그런 예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설치의 방식으로 전시장 자체를 산수화의 공간으로 변형시킨다. 산수화에 그려지기 마련인 누각을 팔각 나무 패널로 전시장에 설치하고 그 한가운데 작게 인조 돌 모형과 물을 담아 산수를 차경借景함으로써 산수화의 요건을 전시장 안에 삼차원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관객들은 그 누각에 걸터앉아 쉬기도 하고 전시도 관람한다. 이것이 마치 지나간 산수화의 전통을 가상 체험하는 타임머신처럼 기능하는 설치가 아님은 분명하다. 누각에서 바라보는 전시장의 풍경은 김지평의 작업들이 보여주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 동양화와 현대미술이 빠름과 느림으로 교착한 온전한 동시대성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전통의 현대화’와 ‘현대의 전통화’가 변증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예술관 속에서는 어쩌면 서양미술과 동양미술의 구별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빠른 현대’와 ‘느린 전통’이라는 기만적 대립에서 벗어나는 순간, 서양미술과 동양미술의 관계는 현대와 전통의 대립이 아니라 포괄적인 동시대성이 지닌 강도와 벡터의 차이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빨리 감기와 되감기의 상호작용 속에서 서양미술과 동양미술 각자의 역사가 시대착오적으로 마주치는 순간들이 사뭇 흥미롭게 다가온다. 예컨대, 그림과 문자의 결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서양미술사에서 양자가 결합한 주요한 사례는 20세기 초 기욤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의 칼리그람과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의 종합적 큐비즘이다. 아폴리네르는 시의 내용이 다루는 대상을 시의 형상을 통해서도 시각화했고, 피카소는 회화에 이질적인 오브제를 붙이는 동시에 암시적인 문자를 그려 넣었다. 반면 동양에서는 애초부터 그림과 문자는 공통의 기원을 지니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하도낙서 신화에서처럼 도圖와 서書는 모두 별자리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고대 중국의 갑골문甲骨文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부터 글자와 그림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또한 동양화가 제발題跋을 포함한 경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다. 문인화 전통에서 시서화詩書畵는 무엇 하나 빠뜨릴 수 없는 동등한 가치를 지녔고, 조선의 문자도는 민화의 영역에서도 그림과 문자가 서로 구별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이렇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동서양의 ‘아카이브’ 속에서 김지평은 동시대를 드러낼 적합한 재료와 형식을 찾아낸다. 그가 2017년부터 시작한 〈문자도〉 연작은 조선 민화의 문자도에서 형식과 재료를 가져와 작가가 지각한 동시대성의 내용을 담는다. 유교 사회였던 조선의 문자도는 주로 효제충신孝悌忠信과 같은 유교적 덕목을 주제로 삼았다. 반면 김지평은 유교 문화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띠었던 계집 녀女 변을 포함한 문자나 ‘음淫’과 같은 문자를 선택해 동시대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주제로 삼은 문자도를 그린다. 또한 제발이 포함된 동양화 형식으로 그린 〈무제: ‘양옌핑’과 ‘박이소’의 작품을 방倣하여 한지에 인쇄〉(2017)는 한지에 인쇄한 후 연필로 덧쓰는 이종의 방식으로 선배의 원작을 본받아 그리는 동양화의 ‘방倣’과 서구미술의 ‘전유(approriation)’를 시대착오적으로 교차시킨다. 그의 문자도에 대한 관심은 한자뿐만 아니라 한글도 포함한다. 이를테면, 〈루루루루루〉(2025)는 눈물을 뜻하는 한자 ‘淚’와 이 글자에 갇힌 개犬를 소牛, 고양이猫, 거북이龜, 새鳥 등 다양한 동물로 대체한 변종 한자뿐만 아니라 ‘淚’의 독음인 ‘루’를 오와 열을 맞춰 먹으로 눈물처럼 흘러내리게 써 내려간 문자도이다. 근대 기술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 외려 고통받는 거북이를 비롯한 각종 동물들은 ‘루루루루루’ 소리 죽여 눈물을 흘린다.
다른 한편, 김지평은 1990년대 이후 독일어권과 영미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각문화연구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인 매체에 대한 담론을 동양화에 적용한다. 그는 매체적인 관점에서 동양화의 장황粧䌙/裝潢을 다룬다. 장황이란 서화를 족자, 병풍, 두루마리, 책, 첩 등의 형태로 꾸미는 표지 장식을 뜻한다. 즉, 동양화의 물질적 지지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황이다. 이것은 그림의 이미지 자체에 비해 부차적으로 여겨지는 장식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장황은 서화에 옷을 입히는 것에 비유되기도 했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그 옷이 여성의 옷으로 상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족자나 병풍의 한 폭에는 각각 이름이 있는데, 아래가 치마, 위가 저고리, 양옆이 소매이다. 작품이 아닌 장식에 여성의 성별을 부여한 까닭은 아마도 가부장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작품에 비해 부차적인 장식의 지위 사이의 유사성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김지평은 중고로 구입한 족자와 병풍에서 그림을 뜯어내고 그 지지체를 남기고, 그 지지체에 비단, 레이스, 술, 짚 등을 덧붙여 의인화한 작업을 만든다. 이번 전시의 설치 작업 〈다성多聲 코러스〉(2023–2025) 연작은 기존의 병풍 연작에 신작을 더하고 앞에 오디오 마이크를 설치해 마치 여러 인물이 무대 위에서 합창하는 듯한 장면을 보여준다. 이들이 내는 침묵의 화음을 상상하는 행위는 밤하늘의 보이지 않는 별빛을 지각하려는 노력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지평이 중고로 사들인 값싼 재료로 허술하게 만들어진 기성품 병풍은 그 그림도 진짜 서화가 아니라 인쇄된 복제품을 사용한다. 〈산수화첩〉(2023–2025) 연작은 병풍에서 떼어낸 그림(의 복제품)을 재활용해 마치 팝업북처럼 꾸민 입체 몽타주 작업이다. 제사 등의 전통 의례가 점점 더 간소해지거나 생략되면서 그 쓸모를 잃은 병풍의 이미지들이 좌대 위에 우뚝 서 있다. 이것은 동양화의 전통에 대한 달콤한 향수나 화려한 부활을 시도하려는 작업이 아니다. 이것은 ‘삐라’를 삼키고 폐사한 바다거북처럼 우수수 쓰러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동시대성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동양화의 존재방식을 있는 그대로 가시성의 표면 위로 일으켜 세우는 시도로 여겨져야 한다. 가속화된 시간 속에서 풀썩 쓰러진 동양화는 소멸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진 상태로 잔존하며 제 나름의 느린 템포로 시나브로 일어설 것이다.
다시 김지평의 이야기 그림으로 돌아가 보자. ‘코즈믹 터틀’의 일대기는 어디에 가닿는가? 우주의 지속을 편력하는 거북이는 ‘삐라’를 삼키고 폐사한 바다거북을 거쳐 흑경黑鏡으로 제작한 검은 화면에 당도한다. 마치 완전한 망각의 심연으로 스러진 것처럼 거북이의 자취는커녕 그 어떤 형상도 남아 있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이것으로 정녕 끝난 것일까? 시간의 빠른 속도에 현혹된 시야에 포착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다 과거의 암흑 속에 영영 포박되고 만 것인가? 김지평의 또 다른 검은 그림을 보자. 족자로 장식된 이 그림은 암흑 같은 바탕 속에서도 미약하게 빛나는 별자리를 뜻밖의 선물처럼 내어준다. 선물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린다. 우리는 ‘코즈믹 터틀’의 일대기가 별자리에서 시작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팽창하는 우주의 무수한 별들이 보내는 빛의 신호는 제각각 다른 속도로 우리에게 도착한다.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암흑 속에서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다가오는 빛의 신호를 기어코 지각하고자 하는 용기, 그것이 김지평을 동시대의 동양화가로 만든다. 그리고 그것이 동양화의 동시대성에 내재한 느림의 미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