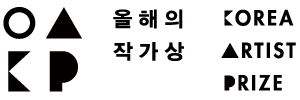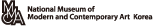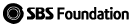Shin Meekyoung

Interview
CV
2014
Cabinet Curiosities, The National Centre for Craft&Design, Lincolnshire, UK
2012
In Between, Translation, MOT/ARTS, Taipei, TW
Written in Soap-A Plinth Project, Cavendish Square, London, GB
2011
Translation, Korean Ambassador’s Residency in London, London, GB
Translation, Art Club 1563, Seoul, KR
Translation, Haunch of Venison Gallery, London, GB
2009
Translation, Kukje Gallery, Seoul, KR
Translation, Lefebvre & Fils Gallery, Paris, FR
2008
Translation, Museum of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R
2007
Translation, Mongin Art Centre, Seoul, KR
Translation –Moon Jar, Korean Gallery, British Museum, London, GB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4
Giogio Morandi: Dialogue with Morandi,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Deoksugung, Korea
Art for Beautiful Life, AK Gallery, Suwon, Korea
2013
ArtShow Busan 2013, BEXCO, Busan, Korea
2013
Glasstress 2013: White Light/ White Heat, Palazzo Cavalli Franchetti, Berengo Centre for Contemporary Art and Glass, Venice, IT
Couriers of Taste, Danson House, Bexley Heritage Trust, London, GB
DNA, Daegue Art Museum, Daegue, KR
2012
Fabricated Object, Sumarria Lunn Gallery, London, GB
Recasting the Gods, Sumarria Lunn Gallery, London, GB
Korean Eye, The Saatchi Gallery, London, GB
The Diverse Spectrum: 600 Years of Korean Ceramics, MASP, San Paulo, BR
Synopticon – Contemporary Chinoiserie, Plymouth Museum/Saltram House, GB
Korean Eye: Energy and Matter, Fairmont Bab Al Bahr, Abu Dhabi, AE
Delving in –Beyond the Boundaries of Physical Properties, Inter-alia, Seoul, KR
Ceramic Commune, Artsonje, Seoul, KR
Material Matter, East Wing X, Courtauld Institute, London, GB
As Small As A World and Large As Alone, Gallery Hyundai, Seoul, KR
2011
Korean Eye: Energy and Matter, Museum of Art and Design, New York, US
NyLon, Korea Culture Centre, London, GB & Korea Culture Service, New York, US
Poetry in Clay: Korean Buncheong Ceramics from Leeum, Samsung Museum of Art,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San Francisco, US
Art to Wear, Plateau Museum, Seoul, KR
Mr. Rabbit in Art World,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R
TRA: Edge of Becoming, Palazzo Fortuny, Venice, IT
Convergence, OCI Museum, Seoul, KR
Seekers of the future of memories, Gana Art Gallery, Seoul, KR
38°N SNOW SOUTH: KOREAN CONTEMPORARY ART, Charlotte Lund Gallery, Stockholm, SE
2010
Memories of the Future, LEEUM, Samsung Museum of Art, Seoul, KR
Korean Eye: Fantastic Ordinary, The Saatchi Gallery, London, GB
Present from the Past, Korean Cultural Centre UK, London, GB
Boys and Girls Come out to Play, Rossi & Rossi Gallery, London, GB
Moon is the Oldest Clock,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Deoksugung, Seoul, KR
The Alchemists, Edel Assanti Project Space, London, GB
2009
Art & Synesthesia, Seoul Museum of Art, Seoul, KR
2008
Art n Play, Hangaram Museum, Seoul, KR
Nanjing Triennale, Nanjing Museum, Nanjing, CN
Art in Action, Waterparry House, Oxfordshire, GB
Welcome Home Party, Sun Contemporary, Seoul, KR
Treasure in My Heart, Nam Seoul Museum of Art, Seoul, KR
Awardees, Sungkok Art Museum, Seoul, KR
Good Morning, Mr. Nam June Paik, Korea Cultural Centre, London, GB
Meme Trackers, Song Zhuang Art Center, Beijing, CN
2007
Beauty, Desire and Evanescence, Space DA, Beijing, CN (curated by Iris Moon)
Soft Power, Korea Foundation, W Hotel, Seoul, KR (curated by Suum)
Particules Libres, nouvelle generation d’artistes Coreens en Europe, Cite Internationale des Arts, Paris, FR (curated by Aeryung Kim)
2006
Through the Looking Glass, Asia House, London, GB (curated by Jiyoon Lee)
Softness, Seoul Olympic Museum of Art, Seoul, KR
Wunderkammer-Artificial Kingdom, Art and Archaeology in Lincolnshire, GB (curated by Edward Allington)
2005
Twenty One: New Work by Student, Slade School of Fine Art, London, GB (curated by Ann Elliott)
Telltale, Museum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R (curated by Jiyoon Lee)
<Commissioned Works>
2009
Yongsan Council, Seoul, KR
1999
Memorial Sculpture for Margaret Powell, Commissioned by Margaret Powell Foundation, Milton Keynes, GB
<Collection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KR
Leeum, Samsung Museum of Art, Seoul, KR
Houston Art Museum, Houston, US
Museum of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R
Mailyooup, Seoul, KR
Painting Studio, JP
Yongsan Council, KR
Mongin Art Centre, KR
Critic
김홍석의 작품 설명
서현석 (연세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
‘작품 설명’은 ‘작품’ 외부의 시선입니다. 오브제의 배치로 성립되는 ‘작품’의 공간적 맥락의 외곽으로부터 우리의 감각을 향해 던져지는 ‘외경’이자 ‘외설’입니다. 전시마다 입구의 벽을 점유하는 캡션은 전지적이고도 주입적인 화술로서 미술관의 계몽적 사명 의식을 대행합니다. 그것은, 언술적이면서도 행동적인, ‘의미’의 전도사이자 보호자입니다. 관습적 장치로서의 그것이 ‘수행적(performative)’인 이유는, ‘작품’을 보는 관점을 점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기능은 다분히 ‘주석’보다는 ‘명령’에 가깝지 않을까요? 우리의 ‘예술적’ 체험이란, 어쩌면 무수한 ‘작품 설명’들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품 설명’이 미술의 ‘전부’라고 하면 지나친 궤변일까요? 미술관의 벽뿐 아니라, 도슨트 투어, 교과서, 미술잡지, 인터넷, 또는 (이 책과 같은) 전시 도록을 끊임없이 메우는 평론, 프리뷰, 리뷰, 인터뷰, 작가의 변, 기획의 변 등 미술사에 진짜 주인∙주인공이 있다면‘언어’가 아닐까요. 김홍석의 전시장에서 ‘작품 설명’은 어김없이 정면으로부터 우리를 습격합니다. 아예 대놓고 ‘작품’을 점거하고 감각을 점령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통상적인 위상으로부터 이탈해있습니다. 그 공격성의 원천은 작품에 대한 ‘지식’이 아닌 그것의 왜곡과 은폐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작품 설명’이 지닌 치명적인 공격성의 미끼는 그 앞에 놓인 ‘작품’입니다. 공교롭게도‘설명’되는 오브제에는 장엄한 미술 담론의 투박한 유령이 말없이 빙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술 명품’의 ‘짝퉁’들인 것입니다. 인용의 확장성과 표절의 무자비함을 동시에 발산하는 복제품들. 조셉 코수스(Josept Kouth, 1945-), 로버트 인디애나(Robert Indiana, 1928-), 소피 칼(Sophie Calle, 1953-), 제프 쿤스(Jeff Koons, 1955-), 마우리치오 카텔란(Maurizio Cattelan, 1960-), 요셉 보이스(Josept Beuys, 1921-1986)… 인용 혹은 전용되는 이름들이 미술사의 ‘혁명가’임을 자처한다면, 김홍석은 기꺼이 이들에 대한 조커 역을 맡습니다. 조커의 무기는 언어입니다. 경의와 조롱을 동시에 발하는 변사이자 광대로서, 김홍석은 오리지널의, 그리고 스스로의 ‘예술성’을 모략합니다. 어눌하게 배치된 글자들은 신체 강탈자처럼 무감각하면서도 탐욕적입니다. 그 무심한 활자들의 기만적 공격성이 드러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상자에는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유래가 없는 어느 두 사람의 대화가 영구 보존되어 있다.” “토끼 인형 옷을 입고 연기하시는 분은 북한 출신의 노동자인 이만길씨입니다. 이 분은 불법 체류자이지만 이러한 연기를 대행해 주는 조건으로 하루 여덟 시간, 시간당 5달러를 지급 받게 됩니다.” “동티모르인으로 분장한 분은 현재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었으며 그 분의 이름은 안내상입니다. 많은 격려의 박수를 보냅시다.” 언어가 아우라를 부여하는 것은 ‘작품’이 아니라, 그것의 파생적이고 부수적인 사변적 맥락입니다. 실질적인 파괴력이 아닌, 일종의 부풀려진 ‘선전포고’의 허황됨에 작품의 공격성이 있다고나 할까요. 그 기만성이 노출되는 순간, ‘작품성’은 홋홋한 쓰레기봉투처럼 공중부양하고, 우리의 물신적 예술관은 공중분해 됩니다. 이것은 암호로 이루어진 서사극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큰 웃음도 깊은 좌절도 없는 ‘짝퉁’ 희비극. 그 화려한 서막은 왜소한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뻔뻔함은 ‘원형’의 숭고미를 각색하여 그 뒤틀린 거울상을 우리의 의식에 들이밉니다. 여기엔 창작의 성스러운 고유성마저도, 그리고 재전유의 정치적 노련미마저도, 증발해 있습니다. 거짓 언어가 ‘작품’을 인식하는 방식을 개방하고 교란하고 부유시키는 동안 소통은 어느덧 ‘작품’을 훌쩍 넘어서 있습니다. ‘복제’의 아우라는 물성의 이면에서 번득입니다. “나는 결혼을 맹세합니다.” “이 배를 ‘퀸엘리자베스호’라 명명하노라.” 언어의 ‘수행성(performativity)’에 관한 고전적인 이론에서 존 오스틴(John Austin, 1911-1960)이 예로 든 ‘수행 문장(performative sentence)’들이 그러하듯, 김홍석의 공적 언술 행위는 ‘발화’와 ‘행위’의 구분을 소각합니다. 이로써 마술처럼 개인과 작품의 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합니다. 언어는 더 이상 준비된 상황에 종속되는 ‘기록’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을 발생시키는 제의적 주문이자 사회적 ‘계약’입니다. 여기에 ‘기만’의 수사가 추가되면서, 김홍석의 ‘작품 설명’은 한술 더 뜬 이중적 수행성을 장착합니다. 활자의 일차적인 기능도 ‘수행적’이지만, 드러나는 ‘기만’이야말로 수행적 발효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합니다. 통상적인 ‘작품 설명’이 단어들의 기능적 의미들을 권위적으로 배합한다면, 김홍석의 ‘작품 설명’은 그 배합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설득과 궤변, 혹은 친절한 안내와 위협적인 경고의 사각에서, 우리는 단순한 거짓의 복잡한 행간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봉제 토끼의 다리를 찔러 보는 등) 우리는 그 앞에서 여러 (반향적인) ‘해석’과 ‘확인’의 장치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규범이 개입되는 것은 이런 해석 장치들이 동원되는 와중입니다. 자아의 보호 체계가 작동하듯, 어느덧 우리는 ‘작품’과 대치하게 됩니다. <The Wild Korea, 2005>의 두 한국 간의 대립처럼, 이 긴장 상태는 ‘진실’에 관한 경쟁이면서도, 또한 그를 초과하는 ‘인식’의 문제로 환원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거짓’을 무조건 봉쇄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공격성이 가차없이 우리의 규범을 위반하고 기형적인 행동강령을 강요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선언문의 원대한 이상을 대체하는 막대한 허허함이 언어 유희 속의 부조리와 공포를 드러내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지금 이곳(미술관)에는 의도적으로 창녀가 초대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있는 미술 전시 개막행사에 2시간 참석하는 조건으로 한화 60만원을 작가로부터 지급받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사이를 유유히 걸어 다니며 전시를 관람하고 있는 이 창녀가 누구인지 찾아낸 분은 작가로부터 그녀를 찾은 대가로 12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Post 1945, 2008>의 전시 공간에 주어진 광고문은, 그 공공연한 공격성을 전시된 오브제가 아닌 관람객을 향해 대범하게 겨냥합니다. 경고문의 선정성과 대자보의 선동성이 배합된 기형적인 공권력이 고스란히 우리의 눈앞에서, 아니 ‘눈을 향해’ 작동합니다. 제의적 주문의 공격성은 ‘거짓’을 통해 발효됩니다. ‘창녀’라는 (가짜) 검색어의 비속함은 스파이처럼 은밀하면서도 게릴라처럼 저돌적인 공격성을 공간 안의 시선들에 투입합니다. 모두의 시선에 비밀경찰의 첨예한 탐구력이 무선으로 전송됩니다. 아아, 그것은 하나의 암묵적이고도 다분히 폭력적인 ‘사회적 합의’로 응집되어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에 치명적인 변화를 가합니다. 프리츠 랑(Fritz Lang, 1890-1976) 감독의 <M, 1931>에서 연쇄 아동살인범을 ‘물색’하는 자발적 시민 방범대의 ‘정의감’이 그러했듯 ‘탐색’의 규칙이 획일적인 집단 폭력으로 변질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얗지도 검지도 않은 거짓말은 태연하게 우리의 인식에 균열을 가하고 규범을 공격합니다. 언어의 침투는 뻔뻔합니다. 그래서 더 불편합니다. 경박한 악마의 조소는 아니기에, 거북함이 더 무거워집니다. 감각의 마비 속에서 급급히 복구되는 ‘규범’의 논리는 거짓말만큼이나 허허하고 칙칙합니다. ‘거짓’의 위력은 총체적입니다. 놀이의 파장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아니, 정말로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그러한 총체적 변화의 단초가 매우 단순한 언어 놀이 따위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벽보의 가장 놀라운 효력은 현장을 점유한 타인들의 모임에 포괄적으로 공급하는 집단 정체성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람객’에 부여되는 강압적 질서가 그 ‘모임’의 성격을 결정하는 절대적 조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술관으로 인해 형성된 하나의 일시적 공동체는, 단지 ‘예술 감상’을 위한 막연한 개인적 열망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작위적이고 막강한 동기에 의해 재구성된 목적 집단으로 구체화됩니다. ‘작품 설명’은 타인들을 응집하고 그것을 ‘집단’으로 규정하는 수행 언어인 셈입니다. 이 놀이에 참여할 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말입니다. 아니, 이 괴팍한 언어 놀이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는 무리들이야말로 담론의 진정한 확장의 장을 이룹니다. ‘차이’의 역학은 참여자들간의 유희가 아니라, 합의와 반발을 두 축으로 하는 넓은 스펙트럼에 걸쳐 작동하는 사회적 장치가 됩니다. 이러한 확장은 ‘연극적’ 허구가 아니라, 분명 ‘실재적’입니다. (‘연극’과 ‘실재’라는 단어들은 잠시 후 다른 의미로 제대로 활용하겠습니다.) 결국 ‘창녀’라는 지시어, 그 역을 맡은 배우, 이를 중심으로 하는 시선의 재구성, 그리고 거부의 담론까지, 김홍석이 연출한 장치는 소사회의 창립을 위한 원천이었습니다. 그것의 가장 놀라운 기능은 스스로 그 효능을 사멸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지나친 농담이 그러하듯, 이 위험한 놀이는 규범 이면의 작은 진실을 꿰뚫는 데에는 성공하지만, 그 대가로서 스스로의 엄중함을 말소시킵니다. 영화 용어로 말하자면, 줄거리를 이끌지만 스스로 중요성을 상실하는 ‘맥거핀(Macguffin)’1이라고나 할까요. 맥거핀의 역할은 물론 공백을 만들고 그를 대체하는 파생적인 관계들을 등극시키는 것입니다. 수건 돌리기에서 ‘수건’이 관계를 발생시키고 구성원들의 위치를 재구성하는 매개가 되듯, 김홍석의 언어 놀이에서도 하나의 ‘주제어’는 개인들간의 총체적인 관계들을 재배치합니다. 놀이는 수건을 만져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성립됩니다. 그 매개적 논리는 ‘부재’입니다. 컴퓨터의 단순한 명령어에 의하듯 저절로 실행되는 장치는 하나의 ‘소사회’만을 남기고 없어져 있습니다. 김홍석에 의해 연출된 (연극적) ‘장치’, 그리고 미술관에 모여든 사람들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동적 ‘장치’는, 물론 서로 일치되지 않습니다. ‘작품 설명’은 바로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수건 돌리기의 술래가 바뀌어도 전체적인 규칙과 대열은 변하지 않듯,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사회’의 구성은 개인의 참여 의사에 관계없이 확정적입니다. 놀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해도, 수건은 내 뒤를 지나가고 있거나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시장에 발을 들이는 소소한 계약적 행위만으로, 어느덧 우리의 의식은 거울 속의 이상한 기호체계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이 언캐니(uncanny)한 요지경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무기는 ‘예술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계약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의 주제어로 인한 이러한 ‘사회적 장’의 형성은 김홍석이 <공공의 공백 Public Blank, 2006-2008>에서 제안한 ‘불가능한’ 아니 ‘비현실적’인 공공장소의 또 다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이에 근거를 두는 단순한 행위에 의해 장소의 기능이 규정되고, 동시에 장소로 인해 점유자들의 사회적 관계가 재구성되는 꼴입니다. <공공의 공백>에서 제안되는 특정한 공공 설치물에 잠재된 ‘연극적 계약’은 <Post 1945>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됩니다. ‘연극’이라는 ‘장소특정적’인 사회 관계는 김홍석의 2011년 작 <사람 객관적-평범한 예술에 대해 People Objective-of Ordinary Art, 2011>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도 장소와 개인의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는 ‘말’로써 맺어집니다. 도슨트처럼 관객을 맞는 다섯 명의 배우들은, 다섯 가지의 각기 다른 주제나 작품군에 관한 ‘설명’을 전달합니다. “도구에 대한 소고—의자를 미술화하려는 의지”, “순진한 물질에 대한 소고—돌을 미술화하려는 의지”, “형태화될 수 없는 물질에 대한 소고—물을 미술화하려는 의지”, “윤리적 태도에 대한 소고—사람을 미술화하려는 의지”, “표현에 대한 소고—개념을 미술화하려는 의지”와 같은, 미술가가 직면하는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진지하고도 심층적인 성찰이 이들의 발화에 담깁니다. 이 일련의 문제들은 미술 수업 시간에 마주칠만한 ‘소고’라지만, 동시에 조형미술로부터 개념미술에 이르는 거시적 논제이기도 합니다. 미술의 궤적에서 못다 마친 숙제를 떠안는다고 한다면 너무 거창한 설명이 되겠지만, 어쨌든 김홍석은 개념미술의 실타래를 미술관이라는 장소 내에서 어떻게든 풀어보려는 의지를 공유하려 합니다. 그것은 단지 미술작가의 문제만은 아니니까요. 그 비장한 성찰의 궤도는 지금 전시되고 있는 ‘작품’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으로 환원됩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을 위해 ‘작품’은 역설적으로, 필연적으로 소거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작품 설명’들과 달리, <사람 객관적>에서 ‘설명’과 ‘작품’은 언어의 직접적인 지시작용으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다섯 개의 의자, 철로 만든 물방울 조각품, ‘관용 Tolérance, 2011’이라는 제목의 8점의 회화 작품, ‘고독한 여정’이라는 제목의 돌탑 등, 배우들이 구체적으로 논하는 ‘작품’들의 하나의 공통된 강렬한 특징은,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봉제 인형 속의 탈북자 배우, 상자 속의 역사적인 대화, 군중 속의 창녀가 그러했듯, ‘작품’의 알맹이는 부재합니다. 아니, 이번에는 ‘알맹이’뿐 아니라 설명되는 작품 자체가 통째로 실종되었습니다. 텅 빈 자리의 주변을 배회하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 ‘창녀’를 단속하라는 명령어처럼, 대상이 모호한 탐구 서사를 작동시킵니다. 이 서사의 원동력은 물론 <Post 1945>와 마찬가지로, 연극적 장치입니다. 전시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의 몇 가지 요소들은 즉각적으로 ‘연극’의 무대를 재구성합니다. ‘소고’라는 형식의 발화 내용은 미리 작성된 ‘대본’이며, 이를 전달하는 이들은 전문적인 ‘배우’라는 단편적인 사실들 외에도, ‘연극’의 가장 근원적인 조건들이 ‘미술관’ 안에서 발효됩니다. 그것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실재적 모임(real gathering)’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포스트 드라마 연극(Post-Dramatic Theatre)’의 정신적 지주인 한스-티에스 레만(Hans-Tthies Lehmann, 1944-)이 내리는 ‘연극’의 정의로, 그는 이를 “미학적으로 배치된 삶과 일상적인 삶이 교차하는 특수한 장”이라고 부수적으로 설명합니다.2 연기나 텍스트로 이루어진 재현의 체계에 우선되는, 보다 근본적인 ‘연극적 체험’의 핵심은, 관객이 공유하는 즉각적인 ‘사회적 만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장에는 작위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기묘하게 서로를 지시하고 대체하며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그가 말하는 ‘실재’는 정교하고 복합적인 ‘허구’와의 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만이 말하는 ‘실재’란 그냥 감각으로 얻어지는 준비된 현실은 아닌 것이지요. 미술관에서의 ‘전시’를 ‘설명’함에 있어서 연극 이론가를 인용하는 것은, 역시 우리에게도 ‘수행적’인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홍석의 ‘퍼포먼스’ 작품에 활용되는 언어와 연기의 이면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관계가 작동합니다. ‘연극’이라는 개념을 통해 김홍석 작품을 보는 것은 이 사회적 관계를 단순히 ‘읽기’ 위함이 아니라, ‘수행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물론 마이클 프리드(Michael Fried, 1939-)의 말대로, ‘연극성(theatricality)’이란 말은 모더니즘의 맥락에서 미술의 ‘노골적인 적(upright enemy)’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3 환영적 재현의 관습으로부터 벗어난 미술에 있어서 그것은 당연했던 태도였습니다. 최근 미술관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적과의 동침’은 미술의 옛 정서를 회복하는 시도, 즉 ‘연극’의 관습을 미술에 그대로 접목시키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연극’과 ‘미술’을 새롭게 성찰하고 그 기능들을 사회적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홍석의 ‘작품 설명’을 ‘연극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첫째로 소통의 맥락을 작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실재’를 새롭게 구성하며, 둘째로 이 절차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 객관적>에서 ‘대사’를 통해 펼쳐지는 미술에 대한 근원적 사유는 관람객이 즉시적으로 마주치는 매우 유기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연극적 틀 안에서 특정한 규칙에 의해 발생하는 작위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연극적 계약으로 발생하는 ‘작위적’인 것들에는 (‘창녀 찾기’에 대한 거부와 분노를 포함한) 풍부한 정서적 동일시도 포함됩니다. 그러한 정서적 현상들은 물론 ‘실제’와 ‘허구’의 구분을 망각하는 것들입니다. (연극을 볼 때 터지는 웃음이나 흐르는 눈물을 어찌 ‘가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창녀’를 찾으라거나, 미술 작품을 상상하라는 작위적 제스처에 의해 만들어지는 정서와 인지가 지극히 ‘실재적’이라는 역설이야말로 ‘연극적’이지 않은가요. <사람 객관적>을 통해 형성되는 ‘실재적 모임’의 구성 조건들이 바로 이러한 ‘연극적’ 장치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관계들이 하나의 ‘소사회’로서 보다 큰 조직을 반영하는 거울상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공백>에서 몇 가지 키워드가 장소와 신체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결국 ‘연극’인 것처럼, 어쩌면 미술에 대한 성찰은 연극적 계약, 혹은 근원적으로 ‘연극’적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요. <공공의 공백>이 ‘정의’나 ‘평화’, ‘윤리’, ‘영광’, ‘승리’와 같은 관념들로 인해 한 익명적 집단 내 구성원들간의 관계가 재구성되는 창의적이고도 기이한, 그리고 다분히 공포적인 상황을 상상했다면, <사람 객관적>에서 펼쳐지는 ‘미술’에 대한 성찰 역시 일련의 제한된 소통과 비소통의 역학 속에서 발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분명 ‘공포’입니다. 감히 말하자면, 이 말은 곧 ‘매체에 대한 성찰’이라는 신성한 정체성으로 수행된 모더니즘의 궤적에, 일련의 지극히 연극적인 관계들이 유전자로서 개입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극적’으로 과장해서 말하자면, 미술의 역사는 곧 한 편의 ‘연극’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언어적 재현만으로 실존하지 않는 구체적인 대상을 상상해야 하는 관객의 상황이야말로 ‘연극’적입니다. 참여자의 인지와 행동을 결정하는 ‘작품 설명’의 수행적 기능, 그리고 그것이 허무는 작가의 창의적 권위마저도, ‘연극’으로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한 배우가 재기하는 창작의 윤리적 기반에 대한 고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가짜 연기’로서가 아닌, 사회적 관계의 조건이자 본질로서의 ‘연극’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다섯 편의 ‘작품 설명’들 중 하나인 “윤리적 태도에 관한 소고” 는 바로 이런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 객관적>이라는 ‘작품’을 만들게 된 ‘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입니다. “대본도 있는 퍼포먼스, 제가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들의 연습에 의해 진행되는 퍼포먼스, 무대가 아닌 평범한 곳에서 벌어지는 퍼포먼스,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수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퍼포먼스, 결과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종결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열린 결말’의 퍼포먼스.” 얼핏 들으면, 전시장 안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보다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일 수 없습니다. 친절하면서도 지적인, ‘자기지시적’ 설명입니다. 그러나, 감히 추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설명’이 지시하는 ‘작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것은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의 전과 때문에 그의 진실을 무조건 거짓으로 치부하려는 ‘작가주의적’ 해석만은 아닙니다. 이 설명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궁극적인 접점 없이 순환적인 언어의 굴레에 갇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표와 기의를 합치할 수 없는 ‘자기지시’의 운명적 딜레마와 관계가 있습니다. 언어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격으로서 소통합니다. “윤리적 태도에 관한 소고“는 이를 말한 것입니다. 결국 김홍석 작품의 중요성은 -니콜라 부리오(Nicolas Baurriaud, 1965-)처럼- ‘진정한’ 사회적 관계의 창출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그 의문스런 ‘진정성’을 질문한 것에 있습니다.4 티노 세갈(Tino Sehgal, 1976-)처럼 ‘실재’적인 것을 연극적으로 구성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재’적인 것에 작동하는 ‘연극적’ 구조를 드러냄에 있습니다. 특히 ‘미술’을 포함하는 실재적인 소통들. <사람 객관적>의 또 다른 배우는 더 친절하고 절절한 설명을 곁들입니다. “물을 미술화하려는 의지”로써, 이 배우는 “아주 평범하지만 사랑과 아픔을 아는 사람”을 만나 ‘눈물 작품’을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의도를 충분히 설명한 후, 이제 ‘작품’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더니 정말로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이는 배우를 위해 ‘대본’에 ‘지문’으로 표시되어 있는 준비한 사건입니다. 배우의 눈물은 김홍석의 언어를 대행하는 대체물에 불과합니다. ‘사랑과 아픔을 아는 사람’ 따위란, (토끼 봉제 의상 속에 들어가 있는 탈북자 배우가 그러하듯) 언어로만 지시되는, 아니 언어로써 ‘생성’되는 유령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조건을 갖춘 관객이 나타나서 ‘진정한’ 정서적 동기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는 이미 전제된 역할을 대행하는 복제일 뿐입니다. 언어의 봉합은 오직 ‘연극’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아니, 언어와 주체의 봉합을 실행하는 인술 행위를 우리는 ‘연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말은 결국 ‘실체’를 호명하는 직설이 아니라 유령을 호출하는 주술입니다. (여기에는 ‘유령’이 전제하는 ‘죽음’까지 함의됩니다. 작가의 죽음. 작품의 죽음. 관객의 죽음…) 미술은 유령들의 연극적 모임입니다. ‘작품’을 통한 감각적 교류는 결국 ‘연극’입니다. 미학적 진보나 정치적 변혁의 가능성이 활화산처럼 충만하게 응집된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연극’입니다. 이 말은 물론 직설이자 역설입니다. 다른 모든 작품 설명들이 그러하듯, 이 말 역시 진실이자 거짓입니다. 혹은, 이 말을 하나의 타협적인 ‘해피 엔딩’으로 각색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 객관적>의 또 다른 배우가 제안하는 한 단서에 따라서 말입니다. 즉, “미술가는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개의치 않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의의 의자’는 돌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설사 우리가 꿈꾸는 모든 ‘실재’적 가능성들이 의미 없는 덩어리로 남게 된다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많은 격려의 박수를 보냅시다.